이사하기로 작정하고 두 달전부터 집을 복방에 내놓았지만, 집이 너저분한 탓인지 아직도 계약을 하자는 사람이 없다. 어제는 계약만료일은 다가오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하도 답답해(흐흐, 내 맘에 쏙 드는 집들이 쏙쏙들이 나가는 상황인지라) 집정리도 할겸 제일 먼저 책장정리를 하는데, 바닥에 내깔려둔 책이며 쌓여있는 책들을 책장 제일 윗칸 그러니깐 천정에 가까이 쌓다가 책장의 책들 사이에 끼여있는, 인쇄해 놓고 까막게 잊고 있던 예전 자료 뭉치들을 발견했다. 발견하는 순간, 기쁨의 감탄사, 어머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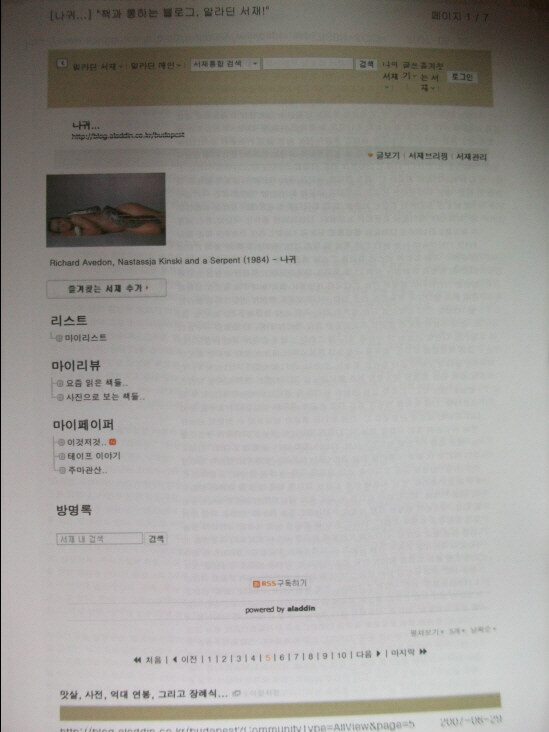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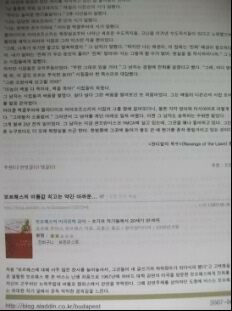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안다. 예전에 알라딘에서 활동했던 나귀님을, 예나 지금이나 내가 이 양반의 글을 무지 좋아한다. 그래서 이 양반이 쓴 리뷰와 주마'관'산 페이퍼를 샅샅히 다 읽고 글이 너무 좋아 컴으로 저장하기도 하고 인쇄해 놓기도 했던 것이다. 컴으로 저장한 글은 저런 표지 없이 글만 저장해서 다소 심심했는데, 어제 알라딘 서재 개편하기 전의 블로그 표지 인쇄물을 발견한 것이었다. 인쇄자료들을 보니 꽤 두툼하다.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나귀님은 2004년부터 알라딘에 글을 올렸지만, 내가 나귀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마 2005년 알스버그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의 리뷰였을 것이다. 그 땐 아이들이 어려 그림책만 구입하던 시기였고 그림책의 리뷰을 많이 읽던 시절이었다. 여하튼....그림책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리뷰였는데, 제주도 처갓집에서 먹고 싶은 무화과를 얻어먹지 못했던 일화를 어찌나 유머스럽게 썼던지 그 긴 글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을 정도였다. 나중에 하루키가 알스버그 좋아해 일본어판 알스버그는 제다 하루키가 번역했다는 일화도 빼놓지 않고 소개한, 그 리뷰를 읽으면서,어어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애 키우느냐고 글에 대한 인상만 있었지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
나귀님은 2004년부터 알라딘에 글을 올렸지만, 내가 나귀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아마 2005년 알스버그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무화과>의 리뷰였을 것이다. 그 땐 아이들이 어려 그림책만 구입하던 시기였고 그림책의 리뷰을 많이 읽던 시절이었다. 여하튼....그림책 검색하다가 우연히 본 리뷰였는데, 제주도 처갓집에서 먹고 싶은 무화과를 얻어먹지 못했던 일화를 어찌나 유머스럽게 썼던지 그 긴 글을 읽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을 정도였다. 나중에 하루키가 알스버그 좋아해 일본어판 알스버그는 제다 하루키가 번역했다는 일화도 빼놓지 않고 소개한, 그 리뷰를 읽으면서,어어 이 사람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은 했었다. 하지만 그 때만 해도 애 키우느냐고 글에 대한 인상만 있었지 그렇게 열성적이지 않았다.
 그에 대한, 이 사람의 글을 전부 다 읽어봐야지 했던 결정타는 바로 이 작품의 리뷰였다. 리뷰의 내용은 전날 술 진탕 먹고 안경까지 잃어버리고 들어와 아내한테 타박 받으며, 저 그림책의 곰과 교묘하게 연결시켜 자신은 곰이 아니고 개였다는, 리뷰였는데 자신의 처지를 저 그림책과 연결한 글솜씨는 가히 조미료 감칠맛 그 이상이었다. 아마 내가 리뷰 읽고 포복절도한 리뷰은 저 리뷰가 유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유머스럽게 썼다. 이 무렵에는 알라딘 마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귀라는 이름을 클릭하면 그의 서재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쯤은 알게 된 시절이라, 그의 그림책 리뷰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나 페이퍼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대한, 이 사람의 글을 전부 다 읽어봐야지 했던 결정타는 바로 이 작품의 리뷰였다. 리뷰의 내용은 전날 술 진탕 먹고 안경까지 잃어버리고 들어와 아내한테 타박 받으며, 저 그림책의 곰과 교묘하게 연결시켜 자신은 곰이 아니고 개였다는, 리뷰였는데 자신의 처지를 저 그림책과 연결한 글솜씨는 가히 조미료 감칠맛 그 이상이었다. 아마 내가 리뷰 읽고 포복절도한 리뷰은 저 리뷰가 유일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만큼 유머스럽게 썼다. 이 무렵에는 알라딘 마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 나귀라는 이름을 클릭하면 그의 서재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쯤은 알게 된 시절이라, 그의 그림책 리뷰뿐만 아니라 다른 리뷰나 페이퍼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한마디로 그를 평가하라고 하면 개도 곰도 아닌 그를 괴물이라고 말하고 싶다. 독서가이면서 수집가인 그는 박학다식의 경지를 넘은 사람 같아 보인다. 아마 그의 글들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난 책을 읽었다,는 것에 처음 부끄러움을 느꼈다. 말 그대로 난 글만 읽었을 뿐이다. 책 속의 책, 한 권의 책이 다른 책과 연결될 수 있는 채널에 대해 그때까지 관심도 없었고 사실 책을 다루는 방식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다. 그가 책을 읽는 방식은 책 속에서 언급한 책은 물론이거니와 주까지도 허투로 버리는 법이 없어 보인다. 한 권의 책 속에 연결된 모든 채널을 섭렵한 후 자기화하는 것처럼 보였다. 많이 읽은 것, 그리고 한권의 책에 둘러싼 모든 채널을 뒤져 그 안에 있는 지식 혹은 정보 수집의 집요함은 혀를 내두를 만하다. 그래서 그가 나보다 나이가 한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왠걸, 아마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맞다면 그는 아직도 30대다. 그 나이에 우주적인 방대함이란. 와우! 게다가 그는 독서가로서의 교만함이 없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글은 누구나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다. 그가 쓴 리뷰나 페이퍼중에서 나는 어려운 용어(하이데거에 대한 글을 써도 담론이나 뭐 그런 철학용어 쓰지 않는다)를 쓴 것을 거의 읽어 보지 못했는데, 그가 잘 알지 못해서 그런 어려운 용어를 쓰지 않는 것이 아니고 용어자체를 다 풀어서 자신의 것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의 서술력은 아무리 어려운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도 쉽게 풀어썼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 서술은 전체적인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쓰기 힘든 글들이었고 집요한 책파기가 아니면 절대 그런 글이 나올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여하튼 내가 알라딘을 하면서 가장 즐거운 때가 나귀님이 활동하던 때였다. 아마 매일 시간이 날 때마다 체크했을 것이다. 그 때의 기분을 말하라면, 기다림의 흥분과 기대 딱 그 느낌이었다. 그의 새로운 글이 올라왔을 때 첫 문장에서 느낄 수 있는 짜릿짜릿한 흥분은, 아마 마약주사를 맞았을 때 약물이 몸 속에 쫘악 퍼지는 그런 흥분과 느낌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다. 며칠동안 글이 올라오지 않았을때의 그 금단현상이란. 언제나 그의 글을 읽을 때면 즐겁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영원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아마 하루키의 글을 읽을 때의 그런 느낌, 나는 하루키의 글을 읽을 때의 그 기분이 좋아서, 한적한 오후 4시의 느낌이랄까, 하루키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의 문장을 읽은 재미로 읽는 것이지 사실 이야기의 완결성이 완벽하든 거지같든지간에 상관없다. 그런데 나귀의 글이 그랬다. 문장을 읽은 재미가 은근 아주 솔솔했다. 은근슬쩍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뿜어내는 그 진지함이란.

 서재문을 아예 폐쇄한 나귀님의 저 인쇄물을 찾아내면서, 더 이상 그의 리뷰나 주마'관'산 페이퍼를 읽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요즘은 블로거들의 서평책들이 대세가 아닌가. 다른 서평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는 책에 대해 말할 때 애정 그 이상의 유혹적인 글을 쓴다. 아마 책괴물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주 미친년스럽게도 그가 언급한 책들은 거의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유혹에 약했고 그가 누구인지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글빨은 놀라울 정도였으니깐. 여타의 책속의 책이랄 수 있는 서평집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나귀의 서평집 혹은 에세이집이 나오지 않았나,하고 기웃거리게 된다. 언제쯤 그의 서평집을 혹은 에세이를 주문해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자체가 너무 큰 욕심이고 망상이려나. 이제 그가 커밍아웃해서 자신의 독서 이력을 노출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과연 스쳐지나가는 바람빠진 헛된 바램인가.
서재문을 아예 폐쇄한 나귀님의 저 인쇄물을 찾아내면서, 더 이상 그의 리뷰나 주마'관'산 페이퍼를 읽을 수 없다는 안타까움이 들었다. 요즘은 블로거들의 서평책들이 대세가 아닌가. 다른 서평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는 책에 대해 말할 때 애정 그 이상의 유혹적인 글을 쓴다. 아마 책괴물이였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는 아주 미친년스럽게도 그가 언급한 책들은 거의 사거나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다. 유혹에 약했고 그가 누구인지 미치도록 궁금하게 만들 정도로 그의 글빨은 놀라울 정도였으니깐. 여타의 책속의 책이랄 수 있는 서평집들이 나올 때마다 매번 나귀의 서평집 혹은 에세이집이 나오지 않았나,하고 기웃거리게 된다. 언제쯤 그의 서평집을 혹은 에세이를 주문해 받아볼 수 있을까. 그런 기대 자체가 너무 큰 욕심이고 망상이려나. 이제 그가 커밍아웃해서 자신의 독서 이력을 노출시켜도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과연 스쳐지나가는 바람빠진 헛된 바램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