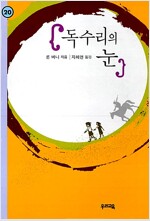
서가 책 정리하기 1탄: 독수리의 눈
아이들이 다 크고 이제는 영영 읽지 않을 어린이 청소년 책들을 서가에서 정리하자니 책들에게 미안해서 내가 읽을 요량으로 몇 권을 추렸다. 아이들 책들 중에 일부는 지나치게 단순한 면이 있기도 해서 열심히 읽는 편은 아니었는데 읽지 않고 무조건 정리해버렸으면 아까웠을 뻔했다.
호주 문학은 우리나라에 거의 소개되지 않은 것 같다. 주로 영미, 스페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과 중국 문학만 알고 있다. 호주로 어학 연수도 가고 여행도 가고 이민도 꽤 가기 때문에 한국인들에게 호주는 낯선 나라가 아닌데도 그쪽의 문화며 문학이며 역사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독수리의 눈>은 호주의 어두운 역사를 이야기하는 소설이다.
시기는 아마도 백인이 호주에 정착하기 시작하던 무렵인 것 같다. 작은 원주민 공동체가 백인들에게 무참히 살해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시작된다. 겨우 살아남은 아이 두 명, 구답과 유달이 주인공이다. 아이들은 야생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전한다. 그러다가 다른 부족과 다행히 합류하게 되는데, 그들 역시 백인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총을 가진 백인들의 힘은 원시적인 창으로 대적하기에는 무리였다. 그 부족도 결국 백인들에게 몰살당하고 구답과 유달은 또다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백인을 피해 더 메마른 지역으로 숨어든다. 아이들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렀지만 기적적으로 샘을 찾아내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원주민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것으로 소설은 마무리된다.
두 아이와 그 원주민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작가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 우리는 안다. 역자의 말에 따르면, 50개 부족 100만 명 정도였던 호주의 원주민이 현재는 호주 전체 인구의 1.5%에 불과한 29만 명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호주의 역사를 찾아보니 아메리카 대륙의 백인 점령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호주의 원주민들도 아메리카인디언들이 겪은 불행한 역사를 고스란히 겪었던 모양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1992년 마보 판결을 통해서 유럽인들의 토지 점유가 원주민들의 후순위로 결정됐고, 호주의 원주민들이 땅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는 한 토지 소유권은 원주민들에게 있다고 공표됐다는 점이다. 이 판결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현 호주 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부당한 역사를 뒤늦게나마 바로잡았다는 점에서는 참 다행이다 싶다.
이 소설은 고발 문학으로서는 분명 가치가 있지만 여러가지로 아쉬운 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은 호주 원주민들의 진면모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료를 찾아보니, 이들은 종교적 전통을 지켰고 훌륭한 예술품들을 남겼으며 발전된 교육 제도가 있었고 세대에서 세대로 지혜를 전수하는 사회였다. 하지만 소설 속 원주민들은 상당히 '원시적'이다. 이들의 무기는 석기시대마냥 돌칼과 창이고, 야생동물들을 사냥해서 생존을 해결하는 일이 전부인 듯 보이며, 백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양을 우리와 나눠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주문이다. 그저 무방비의 선량한 원주민이 포악하고 선진적 문명의 이기를 누리는 백인들에게 희생당했다는 사실만 부각되고 원주민들의 삶과 사회와 정신 세계는 서술되지 않는다. 자연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 정도가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언급되지만, 내 것과 네 것을 놓고 싸우는 유아들에게 '장난감은 같이 갖고 노는 거야'라고 타이르는 식의 단순한 말이 현대를 사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될 수 있을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인간의 소유 의식은 본능이라고 할만큼 근원적이고 그 역사도 길어서 백인과 원주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어느 쪽의 옳고 그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사실의 증언을 넘어 더 깊은 사유를 작품 속에서 읽을 수 없어서 독자로서 아쉬웠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역사를 얘기하다보니 이야기가 단순해져버렸다고 하는 것은 아이들을 너무 무시하는 것일 테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필연적으로 염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뉴스가 사건 사고만 보도하듯 역사책에 기록된 일들도 부당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은 종말로 미친 듯 달려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의의 힘이 어두운 역사의 흐름을 같은 힘으로 밀어내고 있기에 아직도 세상은 그럭저럭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닐까. 다만, 이미 저질러진 학살 앞에서 마음은 어쩔 수 없이 처연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