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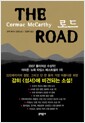
-
로드
코맥 매카시 지음, 정영목 옮김 / 문학동네 / 2008년 6월
평점 :



회사 동료에게 선물 받아 책꽂이에 꼽아 놓고는 오랫동안 읽지 않았었다.
책 표지에 있는 온갖 미사여구의 광고 문구가 거슬리기도 했지만, 음울한 잿빛의 표지가 왠지 불길한 느낌이 들어서였다. 저 책을 읽으면 음울한 잿빛 표지처럼 우울함이 전염되어 한동안 책의 여운에서 헤어 나오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애써 외면했었는데, 책꽂이에서 다른 책을 골라 꺼낼 때마다 따옴표 없는 책속 대화처럼 자신을 읽어보라고 내 귀에 소곤거리는 책의 속삭임에 결국 책을 집어 들었고, 다 읽고 난 후 이 서평을 쓰면서 내가 여실히 느끼는 것은 불길한 예감은 결국 맞았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는 며칠 동안 꿈에서 책처럼 회색 재가 덮힌 벌판을 헤매고 다녔고 , 때늦은 3월 춘설로 가득한 아름다웠을 산과 들, 거리의 풍경이 책 속의 황량한 잿빛 풍경과 오버랩 되어 오히려 칙칙하고 어두운 회색빛으로 느껴지는 착시현상까지 느껴졌다. 책을 읽고 종종 감상에 빠져 여운이 오래가는 나에게 코맥 매카시의 “로드(The Road)"는 그래서 위험한 책이다.
역자는 자신이 독자에게 불친절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짐작컨대 원작 자체의 불친절함은 역자의 노력에도 어쩔 수 없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도대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서 종말과 같은 상황에 처해졌는지, 배경 장소는 어디인지 등 소설의 배경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은 전혀 없고, 등장인물도 이름도 없이 그저 아버지인 “남자”와 아들인 “소년”으로 불리우며, 따옴표 없는 대사들은 책 읽는데 영 불편하게 만들며, 전체 줄거리도 전 지구 적 종말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살아남은 아버지와 아들이 겨울 추위를 피해 남쪽으로 여행하며 겪는 이야기 단 몇 줄로 간단히 표현할 정도이며, 에피소드들도 특별히 소개할 만 게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 그럼에도 책을 읽는 동안 며칠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하고 우울한 상념이 꿈에까지 등장하게 할 정도로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책에 가득한 생기 없는 죽음의 공간에 대한 생생한 묘사, 그곳에서 하루하루 죽어가는 삶들에 대한 감정이입 때문이었을 것이다.
생기라고는 전혀 느낄 수 없는 죽어버린 나무들과 풀들, 푸르름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온통 회색 재로 덮혀 버린 숲과 벌판, 하늘과 바다, 끊임없이 내리는 차가운 회색 눈과 빗줄기. 불에 타버리고 비에 젖어 부서져 내리는 텅 빈 도시의 건물들과 집, 그 곳에서 미이라가 되어 뒹굴고 있는 시체들 등등 온통 잿빛 어둠만 가득한 배경 묘사는 마치 내가 그 곳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머리 속에서 영상으로 재생된다. 배고픔에 시달리는 장면에서는 괜히 같이 허기가 느껴지고, 음식을 찾기 위해 빈 집과 건물을 수색하는 장면에서는 꼭 음식이 발견되기를 응원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음식을 발견하여 과일 통조림을 먹는 장면에서는 그 달콤함이 입안을 맴돌게 하고, 다른 책이었다면 끔찍했을 길에 나뒹구는 시체들이나 인육을 먹는 장면들도 마치 그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느껴지는 등 책 읽는 내내 마치 내가 책 속 주인공인 것과 같은 감정이입이 제대로 되어 버린 느낌이었다. 따옴표가 없어 불편했던 대사들도 책을 읽어가면서는 마치 바로 옆에서 내 귓가에 속삭이는 것처럼 계속 맴돌면서 오히려 따옴표로 대사를 구분했었다면 오히려 이런 기분을 느끼지 못했겠구나 싶을 정도로 책에 몰입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훌륭한 장치로 느껴지게 만든다. 과연 저들에게 희망이 있을까 저런 삶이었다면 벌써 포기하고 말았을 텐데 하는 생각에, 그렇지만 부디 죽지 말고 살아서 그들이 원하던 남쪽에 도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안타까움과 애처로운 바람이 결국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다. 결국 그들의 여정은 제목 “로드(The Road)"처럼 길에서 시작해서 길에서 끝나 버리고, “320 페이지의 절망, 그리고 단 한 줄의 가장 아름다운 희망” 라는 광고 문구처럼 희망을 암시하면서 책은 끝을 맺는다.
우울한 상념은 며칠 내에 없어지겠지만 책에 대한 인상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 같다. 봄 볕에 자취를 감추게 될, 벌판의 겨울 회색 빛 눈들의 흔적들을 보면서, 한적한 도로 갓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통조림들과 쇼핑용 카트를 보면서, 농촌 마을 어귀에 버려져 있는 다 쓰러져 가는 황량한 빈 집을 보면서, 내 손에서 떠나 책꽂이에 다시 꼽힌 책은 더 이상 자신을 읽어달라고 속삭이지 않겠지만 다른 책을 고르면서 이 책의 표지를 보면서 책 속 장면 장면 들을 다시금 떠올리게 될 것 같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로드”도 보려면 꽤나 망설일 것 같다. 책으로도 며칠을 상념에 빠졌었는데 머리 속 상상이 아닌 구체적 시각으로 접하게 된다면 그 상념이 더욱 깊어질 것 같은, 그렇지만 결국은 보게 될 것 만 같은 두려움에 오랫동안 책처럼 외면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