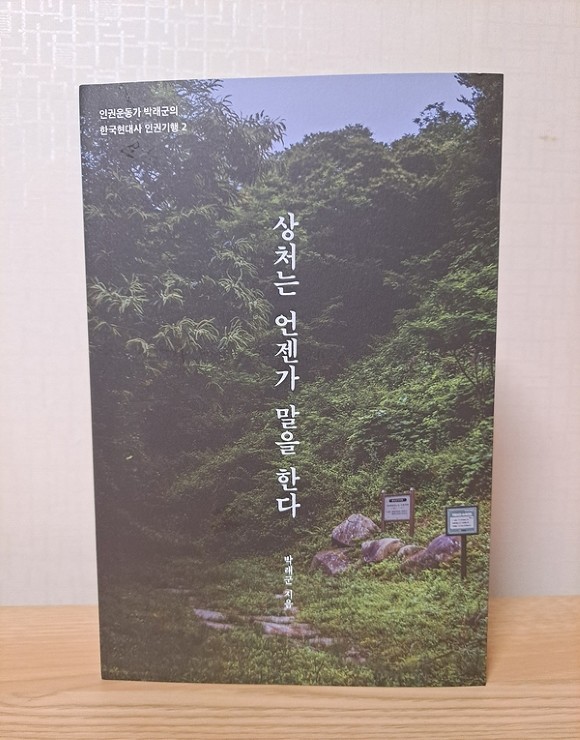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상처를 잘 치유하면 덧나지 않는다. 하지만 겉만 대충 치료하는 상처는 덧날 수 밖에 없다.
제때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덧난 상처는 더 심한 상처를 불러 일으킨다. 그래서 어른들은 처음 치료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역사 역시 마찬가지다. 상처 없는 역사는 없다. 우리의 역사는 대부분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왔다. 다른 누군가를 짓밟아야 했다. 2차 세계 대전 후 피해자인 유대인에게 공식 사과를 한 독일의 경우 2차 피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았다. 나치의 만행은 큰 상처지만 그들의 상처는 독일의 사과로 마무리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끝없는 부인과 만행은 상처를 덧내다 못해 많은 죽음을 불러일으킨다. 상처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는 바로 앞의 사연처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아픔의 역사를 찾아가는 인권기행문이다. 인권운동가이자 4.16 재단 상임이사인 박래군 운동가는 이 책을 통해 치료받지 못한 아픔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설명해준다.
저자가 한국 현대사에서 아픈 상처들로 지목한 곳은 어디일까?
저자가 꼽는 한국의 첫 인권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동학농민혁명부터 천주교 박해 순교 성지, 사회복지원, 미국 기지촌, 광주 대단지 사건, 용산참사 사건 및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소선 운동가의 흔적을 찾아 떠난다.
조선 말, 압정에 시달리다 못해 모든 인간들이 평등함을 외치며 신분제 철폐를 외치기까지 했던 동학농민혁명하면 당연히 전봉준을 떠올리게 된다. 작은 체구에 부라린 눈. 전봉준 장군의 생가를 가고 그가 호령하던 장소를 찾아간다. 일본에 의해 처참하게 막을 내린 꿈, 모두 잘 살아보고자 했지만 혁명 실패 후 전봉준의 딸이다라는 것을 숨기고 살아가야만 했던 자녀들. 이 처참한 현실을 보며 저자는 말한다.
그때나 지금이나 혁명가의 자식들은
남들이 누리던 평범한 일상도 포기해야 했다.
나머지 자녀들은 또 얼마나 기막힌 삶을 살았을까?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25p
모든 이들이 평등하기 꿈꿨던 동학농민혁명. 과연 지금 그의 꿈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자는 우리가 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함께 생각하기를 권한다.
천주교 순교 성지, 미국 기지촌 등 아픈 현대사 현장들도 있지만 내게 가장 인상깊게 다가온 부분은 바로 고층 아파트 건설로 밀려난 가난한 사람들의 아픔의 현장이다. 1968년 경기도 광주군 강제 이후하게 한 광주대단지 사건. 강제 이주는 분열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성남시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킨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낙인 아래 2차 피해를 받아야만 했다. 낙인은 제2의 피해를 만들어낸다.
5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남 사람들은 낙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폭도들의 도시, 성남이란 거지요.
분당이나 판교 사람들은 성남 시민이라 하지 않아요. 분당 사람, 판교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들은 못사는 성남 사람들과 애써서 구분하려고 합니다.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207p
이들의 상처는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며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처는 2010년 용산 참사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여기 사람이 있다'고 외쳤지만 망루 위에 올라간 철거민들을 강제 진압하며 생명을 앗아간 사람들. 그 안에서 과정은 모조리 묵살당한 채 기득권자의 입맛에 맞게 진행된 재판. 자신의 주거 공간이 빼앗기는데 어떤 보호장치도 없이, 무조건 내쫓는 모습. 사람이 아니라 단지 돈으로만 도구로만 보이는 모습 속에 사람들은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그럼에도 재개발에 열을 올리는 서울의 모습을 보며 저자는 광주대단지 사건과 용산참사를 겪으면서도 변함 없는 모습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
주거는 인권이다.
용산참사는 주거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집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
용산참사가 뉴타운 바람 가운데 일어난 비극이라는 점을 우리 사회는 완전히 잊고 있는 것 같다.
다시 여기저기서 '개발'에 불이 지펴지고 있으니 말이다.
용산참사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으리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을까.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 222p
저자의 여행을 따라가다보면 한 가지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과연 우리의 현재는 이 역사의 현장에서 나아지고 있는가. 동학농민현장에서 나아지고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모양으로 갑과 을에 시달리고 있다. 천주교 박해에서 나아졌는가? 그럴 수 없다. 기독교는 여전히 배타적이며 또한 우리 사회는 이슬람에 대한 편견으로 그들을 거부하고 있다. 미국 기지촌, 여성 노동운동가인 이소선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성노동자, 또는 노동자들의 위치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하다.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상처는 덧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저자는 말한다. 상처는 언젠가 말을 한다고. 우리는 상처들을 피하려고만 한다. 하지만 상처를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고 끝까지 치료하고 대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만 상처가 멈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