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딸에 대하여 ㅣ 오늘의 젊은 작가 17
김혜진 지음 / 민음사 / 2017년 9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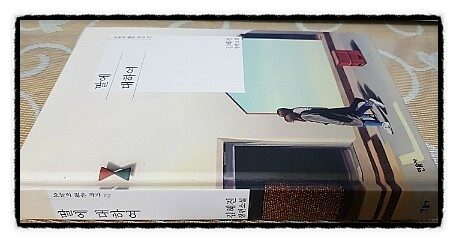
누구나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나 사실들이 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 하는 그런 상황이나 사실.
그럴 때 우린 어디선가 많이 들은 꽤 괜찮은 설득력을 가진 말이라고 생각하는 '틀림'과 '다름'에 대해 이야기 한다.
틀린 게 아니야, 그저 다를 뿐이지!
나와 크게 부딪칠 일 없는 상황이나 사실일 수록 이해하는 척 한다.
그렇지만 그 틀리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를뿐인 상황이나 사실, 거기다 그런 사람까지 내 주변에 있다면 당장 불편해진다.
다른 건 인정해 줄테니 내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 주었음 좋겠어- 마음 속에 금을 긋고 수시로 내 영역이 무사한지 지린내 풍기는 눈빛으로 경계를 하게 된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싶지만 나도 마찬가지다.
학습된 사회성으로 인해 선입견과 편견의 굴레에서 평생 벗어나지 못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이 가끔 무서워진다.
내 생각이 분명 틀렸는데 다를 뿐이라고 합리화 시키며 다수의 편이 아닌 소수를 향해 말로 마음으로 눈빛으로 린치를 가하며 다름에 대해선 눈꼽만큼도 이해를 하고 싶지도, 할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틀린 내 생각.
갑갑하고 딱딱한 번데기의 갑옷을 벗고 나면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나비가 될 수 있음에도 틀에 갇힌 생각을 깨트리기가 애벌레만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때마다 부끄러워진다.
자연의 법칙이라 규정해 놓은 틀에서 비껴나 있을 때 세상이 주는 가학성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 몇이나 될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봐야 소용이 없다. 이목을 끌다가 입장만 더 난처하게 할 뿐이다.
한 쪽 다리가 짧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바로 걸을 수 없는데 모두 너는 왜 버젓이 두 다리가 있으면서 절뚝이며 걷느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남의 시선때문에 절뚝이며 걷는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위로와 용기를 주고 싶어진다.
그러나, 이것 또한 얼마나 무례하고 오만한 생각인지.
위로와 용기라니?
태어난대로 자연스레 걷고 있는데 자기와 다른 걸음걸이라고 네 걸음에 용기를 가져라, 절뚝이며 걸어 속상하겠구나..하는 그런 말이 가당키나 하는가 말이다. 생긴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나 막지 말라고 할 것이다. 아무리 선의라도 그 생각이 내 중심적일 때 상대방은 불편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걸 자주 잊어버린다.
짐작했겠지만 [딸에 대하여]는 성소수자, 레즈비언, 동성애자로 불리는 딸을 둔 엄마의 독백이다.
남편이 물려 준 재산이라곤 낡은 집 한 채가 전부인데 분가한 딸은 집을 저당잡아 대출한 돈이 필요하고 요양 보호사를 하며 근근이 생활하는 나는 집을 담보로 딸에게 돈을 마련해 주는 게 싫다.
월세와 생활비를 받는 조건으로 들어와 살게 되는 딸은 레인이라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구와 함께 들어오고 딸은 그린으로 불린다. 요양원에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사회를 위해 공헌하며 살았으나 핏줄이라고는 없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젠'을 돌보며 전국을 떠돌아 다니는 보따리 강사인 동성애자 '딸'을 바라보는 교차되는 시선이 절절하다.
끝까지 딸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딸과 친구의 관계가 소꿉장난 같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끝낼 수 있는 관계라고 믿고 싶어한다. 딸이 가진 비정상적(?) 정체성에 대해 이해를 할 수 없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신을 탓한다. 딸이 떳떳하고 평범한 삶을 선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둘을 이해하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지만 기적이 오기전에는 이해한다고 말할 수 없다고 못 박는다.
"성 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 여기 이 말들이 바로 나라고. 이게 그냥 나야,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나를 부른다고. 그래서 가족이고 일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게 내 잘못이야?"
가시가 되고 못이 되는 딸의 말을 들으면서도 딸을 이해하는 것은 떳떳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딸의 삶을 놓아버리는 것으로 여긴다. 서로가 다다를 수 없는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다다를 수 없는 나라의 말로 하고 있다.
안타깝지만 이해할 수 있다.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은 똑같으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성 소수자가 되어버린 낯선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독백은 울림이 깊었다.
이게 성 수수자를 인정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정책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시선에서 읽으니 더 절절하게 다가왔다. 내 일이 아닐때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막상 내 가족의 일이고 보면 청천벽력같은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화도 나고 허둥대고 누구라도 탓하고 싶어지는 마음.
딸을 이해하기 전에 엄마의 입장을 더 이해한다고 말하고 싶다.
이해해 보겠다는 말보다 거짓말이니 이해한다는 말은 하지 않겠다는 엄마.
안다, 안다.
그런 엄마를 알고 있어 더 가슴 아프게 읽힌 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