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이라 도서관에 갈까 했는데 갈 수가 없었다. 우선 아이들 학교가 오늘 늦게 시작하는 날이라 아침 열시가 훌쩍 넘어서야 호빵과 번개가 각각 학교에 갔고, 기름 떨어진 내 차에 직장 근처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어 오도록 꼼지에게 부탁해서 몰고 나갈 차도 없기 때문이다. 걸어 가기엔 불가능한 거리이고 다른 교통편은 없는 이 지역 (미국 대부분이 그렇지만...).
이런 건 떠올릴 때마다 그렇지만 기막히게 비인간적이다. 크다고 부러워 하지만 너무 큰나라. 1인당 운신할 땅이 넓다고 부러워 하지만 너무 넓고 뜨문 뜨문 살아 대중교통편이 제대로 갖춰질 수 없는 나라. 그것 보다는 더 많은 자동차를 팔기 위해 있던 전차도 다 사들여 폐기시킨 포드처럼 개인 (또는 소수) 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복지는 쉽게 버리는 나라.
어쨌든 도서관 가는 건 포기하고 집에서 독서와 일을 해보기로 한다. 번역일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머리에선 난리인데 마음은 최근 잡은 에드워드 새드 (Edward W. Said) 에 붙들려 있다. 그의 목소리가 가득 담긴 <Power, Politics, And Culture> 을 조금이라도 더 읽자고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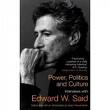 서문은 예전에 읽어 두었지만 다시 책을 잡은 후 아직도 Beginnings 에 머물러 있다. 사실 가우리 비스바나탄 (Gauri Viswanathan) 의 첫 질문에 대한 새드의 대답은 장장 열 세쪽에 다다른다. 반쪽 정도 되는 질문에 열 세쪽 달하는 대답이라. 그 대답이 또한 사변적인 얘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헤롤드 블룸 (Harold Bloom) 시학(시비평)의 철학적 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예일파 (Yale school) 비평가들, 아방가르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등 여러 학파와 학자들 (하이데거, 데리다 등등) 을 나열하며 광범위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거다. 데리다야 로쟈의 책을 통해 이제 겨우 그 발가락 하나 만지는 정도이고 도대체 새드가 맞섰던 세계 문학비평계에 대해 대책없을 만큼 이해가 부족한 나로서는 만만치 않은 읽기였다.
서문은 예전에 읽어 두었지만 다시 책을 잡은 후 아직도 Beginnings 에 머물러 있다. 사실 가우리 비스바나탄 (Gauri Viswanathan) 의 첫 질문에 대한 새드의 대답은 장장 열 세쪽에 다다른다. 반쪽 정도 되는 질문에 열 세쪽 달하는 대답이라. 그 대답이 또한 사변적인 얘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헤롤드 블룸 (Harold Bloom) 시학(시비평)의 철학적 근거와 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예일파 (Yale school) 비평가들, 아방가르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등등 여러 학파와 학자들 (하이데거, 데리다 등등) 을 나열하며 광범위한 이야기를 풀어 놓는 거다. 데리다야 로쟈의 책을 통해 이제 겨우 그 발가락 하나 만지는 정도이고 도대체 새드가 맞섰던 세계 문학비평계에 대해 대책없을 만큼 이해가 부족한 나로서는 만만치 않은 읽기였다.
질문의 핵심은 헤롤드 블룸의 비평에 대해 새드가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던 일에 대해서다. 이 첫 질문과 대답을 통해 보자면 헤롤드 블룸이라는 학계나 독자들로부터 극단적 찬반을 불러 일으키는 문학비평가다. 질문자로선 제국주의 오만함과 왜곡을 엄청난 양의 문헌을 통해 밝히고 문학비평가로서 세계 정치사 최선방에서 (특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며 적극적인 행동도 주저하지 않았던 새드가 정치, 사회, 역사적 맥락은 배제한 채 시와 시인들의 미학에 집중해 온 블룸의 시비평에 후한 점수를 준다는 것에 잘 수긍이 가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에 대한 새드의 대답은 문학비평계의 여러 갈래에 대한 설명과 비판으로 시작해 중간쯤 (그러니까 몇쪽을 훌쩍 넘긴 후) 블룸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한다. 블룸에 대한 긍정적 공감은 이런 것이었다.
"For me Bloom's criticism, when I first encountered it in its mature theoretical form as a critic was and still is extraordinarily invigorating.
My whole interest in beginnings and origins suddenly acquired
a new dimension for me, and many confirmations.
I found Blooom's reworking of the old influence topos powerful and elegant in the way
that Berg's Violin Concerto reworks that Bach chorale
and makes it disturbingly elegant and powerful.
Most of all, however, I was impressed with the way Bloom showed
that creation was a form of dealing with the past, redoing it in an original or beginning way,
so to speak, and since I was a devoted student of Vico the discovery of themes
like knowing is making, and the heroism of early poets,
in Bloom was quite an experience." (p.10)
난 여기서 새드가 블룸의 시비평 작업을 베르그의 작업을 예로 드는 게 무엇보다 인상 깊었다. 그가 블룸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갑자기 확 알아버릴 것 같은 느낌이었달까. 베르그가 바하 코랄을 너무도 우아하면서도 강렬하게 재탄생 시켰던 것 같았다는 그의 말을 통해서 말이다. 새드는 블룸이 '창조란 과거를 다루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걸 상기시켜 주었다고 한다. 창조란 '원전과 출발지에 기반하여 뭔가를 다시 하는 것.' 그리고 블룸을 통한 새드의 이런 깨달음은 당시 '아는 것이 바로 만드는 것 (아는만큼 만들 수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지 않을까)'과 초기 시들에 대한 영웅주의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자신에게 상쾌하고 의욕적인 (vigorating) 경험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새드가 블룸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찬성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는 우리가 기대하는 '새드의 비판'을 져버리지 않는다.
"All he[Bloom] says is that poets are primarily concerned with poetry,
which is their element and their life as poets." (p.10)
"Bloom nowhere takes account of the debt poetry owes to culture or history." (p.11)
"In short, Bloom's theory of poetic transmission conceals, I think,
a radically mythologized conception of the individual determinants of culture, and a total disregard for culture's anonymous and institutional supports,
which simply go on and on beyond individual efforts or life spans.
Insted of seeing culture as finally a more regular, and regularizing business than not,
Bloom holds to a notion that delegates tradition (and culture, by implication) to individual figures; I am saying that poetry makes poets,
whereas Bloom believes that poets make poetry." (p.12)
새드의 주장을 간단히 말하자면, 블룸은 시란 오로지 시인과 시인들의 관계를 통해 창조되는 것이라고 말했고 새드는 역시나 시인들 그 자체보다는 시인들을 둘러싼 (또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의 물리적 세계라고 말할 수 있겠다) 정치적, 사회적, 역사적 통합채인 '문화'가 시 창조 (또는 문학의 창조, 또는 문헌적 창조) 근본적인 바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위의 마지막 문장을 낳는 거다.
"I am saying that poetry makes poets, whereas Bloom believes that poets make poetry."
저는 '시(그 자체로 문화이기도 한)'가 시인들을 만드는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블룸은 시인들이 시를 만드는 거라고 믿는 거구요.
시란 (또는 문학, 또는 그 어떤 문헌)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시인이 시를 쓰면 그 시는 시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간다. 그때 시는 한 개인으로서 시인의 시 하나가 아니다. 시는 그 자체로 수많은 문화적 함축을 담은 생명체인 거다.
이 첫 질문에 대한 답 끝에 새드는 왜 자신이 정치, 사회, 역사, 그리고 문화의 문제에 집착하는 가에 대해 들려 준다.
"I will confess to no utopian notions about the end of the struggles I've just talked about, but I guess that what moves me mostly is anger at injustice, an intolerance of oppression, and some fairly unoriginal ideas about freedom and knowledge." (p.16)
위의 말은, 그의 집착과 연구의 이상향 (또는 종착점) 은 없고 영원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들린다. 그리고 자신이 그걸 계속할 수 있는 힘과 이유는 불의에 대한 분노이며 억압에 대한 참을 수 없음이며 자유와 지식에 대한 근거도 없고 말도 안되는 생각들이라는 거다.
문화의 포괄성과 중대성에 대해 천착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것들 (분노, 참을 수 없음) 이 자기 사상의 밑천이라고 뜨거운 가슴으로 말하는 그를 어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게 혼자서라도 이 책을 끝가지 읽어보리라 매일 다짐하는 이유라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