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 지난 겨울을 정리해버리고
얼른 2008년의 흐름에 몸을 실어야겠습니다.

독서 리스트 정리하기 쉬우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읽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혹...
ㅡ_ㅡ++
아닙니다!!!
>_<
헤럴드 블룸 클래식/ E.M 포스터/ 폴 오스터/ 로알드 달/ 네
버랜드 클래식/ 무민 가족/ 크라바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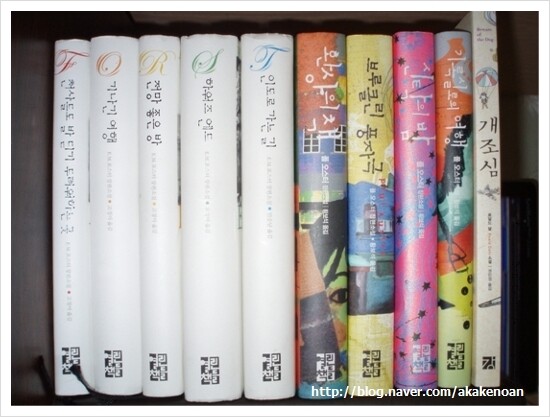
[E.M 포스터 전집(총 7권)] 가운데 다섯 권을 읽었습니다.
다시 읽은 책도 있고,
여전히 걸리는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3월엔 나머지 두 권인 [모리스]와 [콜로노스의 숲]을 읽고,
영화화된 네 편의 영화도 다시 볼 생각입니다.
([천사들도 발 딛기 두려워하는 곳]은 도저히 구할 수가 없네요.)
다 읽어버리기가 너무도 아까운 이 기분-
베스트는
[하워즈 엔드]입니다.
[폴 오스터]의 소설은 전부 읽었습니다.
에세이와 시집은 아직 완독을 못했고,
급하게 읽을 생각은 없습니다.
네 권 모두 흥미로웠고,
폴 오스터의 전작들을 초월하거나 전부 감싸앉는 구조를 띄고 있어
이 네 권의 책은 묘하게 연작의 분위기가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폴 오스터의 모든 소설에 걸쳐 인용되는 월터 롤리 경에 이어,
나사니엘 호손에 대한 오마주가 지속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호손의 책을 다시 읽어볼 생각으로 주문해두었습니다.
베스트는...
오히려 폴 오스터의 전작들입니다.
([고독의 발명]과 [오기 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와
[우연의 음악]을 꼽겠습니다)
로알드 달의 [개조심]
국내에는 처녀작이 이제사 출간되었네요.
강 출판사에서 나온 전작,
빌려주었던 세 권의 단편집을 언니네에서 찾아왔어요.
다시 읽으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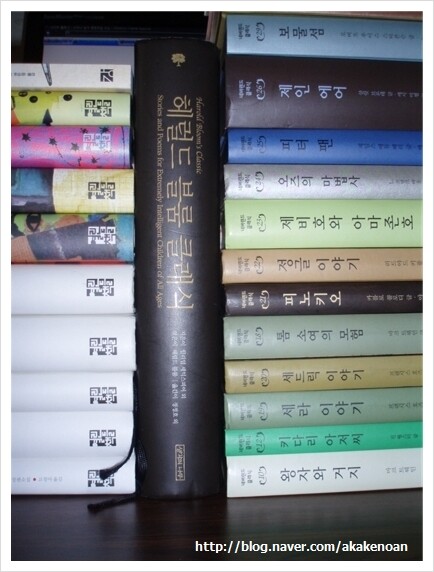
[헤럴드 블룸 클래식]
솔직히 분권으로 나온 시리즈는
태반이 겹치기가 일쑤라 눈길은 갈 뿐 집어들지 않으려고 했던 찰나,
단숨에 스윽 읽힙니다.
일부 작가들에 편중되어 있는 선집의 구성에 신경이 쓰이긴 했지만,
루이스 캐럴과 러드야드 키플링 등등...
새 번역으로 풍성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시편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버랜드 클래식]이야 워낙 좋아했던 시리즈라,
35권인 [작은 아씨들]이 나온 것을 계기로
그간 밀쳐두었거나,
다른 완역판으로 읽었던 시리즈를 몽땅 읽었습니다.
이 가운데 제게 생소했던 첫 대면인 책은
[제비호와 아마존호]
[북풍의 등에서]였습니다.
베스트는 단연 [제인 에어]입니다.
민음사 판보다 훨씬 매끄럽고 깊습니다.
이해불능인 화려하고 극과 상반되는 삽화가 상당히 거슬립니다만.
재미있는 것은
[작은 아씨들]서부터 책갈피줄이 생겼다는 것...
35권을 내면서 깨달았던 걸까요???
뒷북이십니다.
그래도 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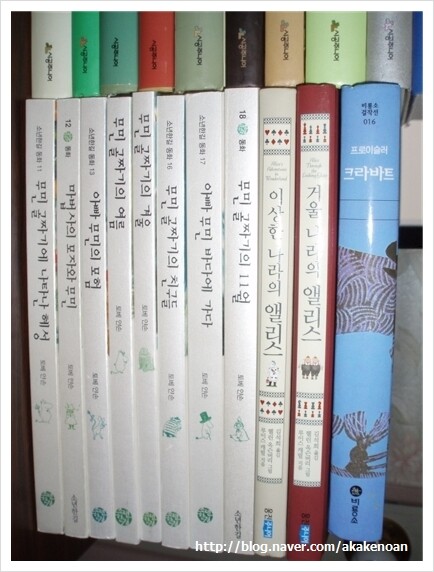
[무민 가족]을 처음으로 읽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이런, 이런-
무리 속에서도 고독할 수 있고,
비밀스러운 자기다움을 충실히 배려받는 무민 월드,
이제라도 만나서 다행입니다.
열심히 전파 중이에요.
김석희 씨 번역으로 [앨리스]가 다시 나왔습니다.
번역도 번역이지만,
헬린 옥슨버리의 삽화가 존 테니얼과 대결하는 것이 볼만한 곳일까요?
[앨리스]는 주석이 빼곡히 달린 판부터 팝업북까지...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생기를 더해가고 있는 듯합니다.
열린책들 버전으로 합본을 주문해놓았습니다.
최용준 씨 번역이 상당히 기대되는걸요.
오트프리트 크라이슬러를 좋아하긴 했지만
[크라바트]에 이르러 폭발했습니다.
헤세의 [유리알 유희]를 읽었을 때의 충격과 맞먹습니다.
베스트!

총 37권...
이곳저곳에서 읽었던 다수의 책들...
플러스 15권 안팎으로 잡으면 될 것도 같지만,
여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문차일드,
1월, 2월엔 좋아하는 책만 잔뜩 읽어버렸습니다.
변칙적이긴 했지만
제가 얻은 위안은 이루말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