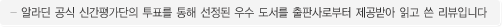[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죽음이란 무엇인가]을 읽고 리뷰 작성 후 본 페이퍼에 먼 댓글(트랙백)을 보내주세요.
-

-
죽음이란 무엇인가 - 예일대 17년 연속 최고의 명강의 ㅣ 삶을 위한 인문학 시리즈 1
셸리 케이건 지음, 박세연 옮김 / 엘도라도 / 2012년 11월
평점 :

구판절판

인간에게 죽음은 질문을 허락지 않는 개념들 가운데 하나다. 생사의 문제를 늘 곁에 끼고 살면서도 일단 죽음은 슬프고 두렵고 나쁜 것이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죽음을 그렇게 받아들였다. 딱히 누군가에게 학습한 기억은 없지만, 머릿속에 죽음이라는 관념을 몇 가지 명제로 채워 넣고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식이다. 죽음에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예일대 철학 교수 셸리 케이건은 여기에 과감히 딴죽을 건다. 그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또한 믿고 있는 죽음에 관한 상념들을 모조리 꺼내든다.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가? 죽음은 어떻게 나쁜 것인가? 한편으로 진부한 질문들. 이 책은 누구나 줄기차게 생각하면서도 좀처럼 깊게 들어가지 않는 죽음이라는 미지수에 천천히 물음표를 다는 과정이다. 그 사유의 궤적을 반쯤 따라 밟았을 때 우리는 그가 기존의 관념으로부터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
저자는 인간이라는 존재를 고차원적인 기능(Person 기능)을 수행하는 육체로 바라보는 물리주의자의 편에 서 있으며, 육체적 죽음 뒤에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능성을 인정하기엔 그 근거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내가 죽으면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절대 나쁠 수가 없다. 내 입장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데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여기서 이렇게 간단히 이야기를 매듭짓고 끝내는 것은 아니다. 영혼이라는 개념을 중시하는 이원론과 그밖의 관점에서 최대한 죽음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죽음이 나쁘다면 그에 따라 어떠한 논리가 생겨나는지 확인하면서, 죽음을 사유하는 기존의 개념들로부터 모든 가능성을 꼼꼼하게 짚는다. 그리하여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첨예한 의견들을 일일이 자신의 방식대로 논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렇게 자신만의 관점을 충분히 설명한 다음 그는 피할 수 없는 죽음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진다. 죽음에 관한 사유가 도처에 널린 만큼 그다지 새로운 수준은 아니지만, 저자가 사고하는 흐름을 따라 내리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보는 것은 그 자체로 제법 의미 있는 일이다. 강의 내용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터라 단락마다 같은 말이 조금씩 중첩되는데, 그것이 사고의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써 집요하게 이어진다. 이때 저자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지 통째로 드러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이따금 논리적 비약이 보이기도 한다. 이를테면 인간이 홀로 죽는다는 사실을 반박할 때 ‘홀로’가 의미하는 바를 너무 유치하게 다룬다거나 우리가 언제 죽는지 알고 있다면 결코 두려움을 느낄 수 없다고 얘기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의 폭을 부러 좁힌다거나. 이렇듯 몇몇 대목에서는 번역의 영향을 감안해도 약간 껄끄러운 구석이 있다.
그것은 이 책이 영혼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을 박는 방법과도 관련이 있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근거를 제시할 의무는 없다고 전제한다. 지적인 의무를 발뺌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대상이 없다는 사실을 밝힐 이유는 없다는 얘기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신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라고 무리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허무한 결론을 얻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저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 성싶다. 하긴 셸리 케이건의 궁극적인 목표는 답을 내는 것이 아니다. 그는 심리적, 종교적 해석을 제쳐놓고 오로지 이성과 논리로 죽음에 관한 모든 것을 파헤치면서 우리에게 나름대로 생각해볼 것을 부추긴다. 나도 거기에 편승해서 세 시간 가량 기나긴 논리를 좇았더니 책장을 덮고도 물음표가 뱅뱅 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