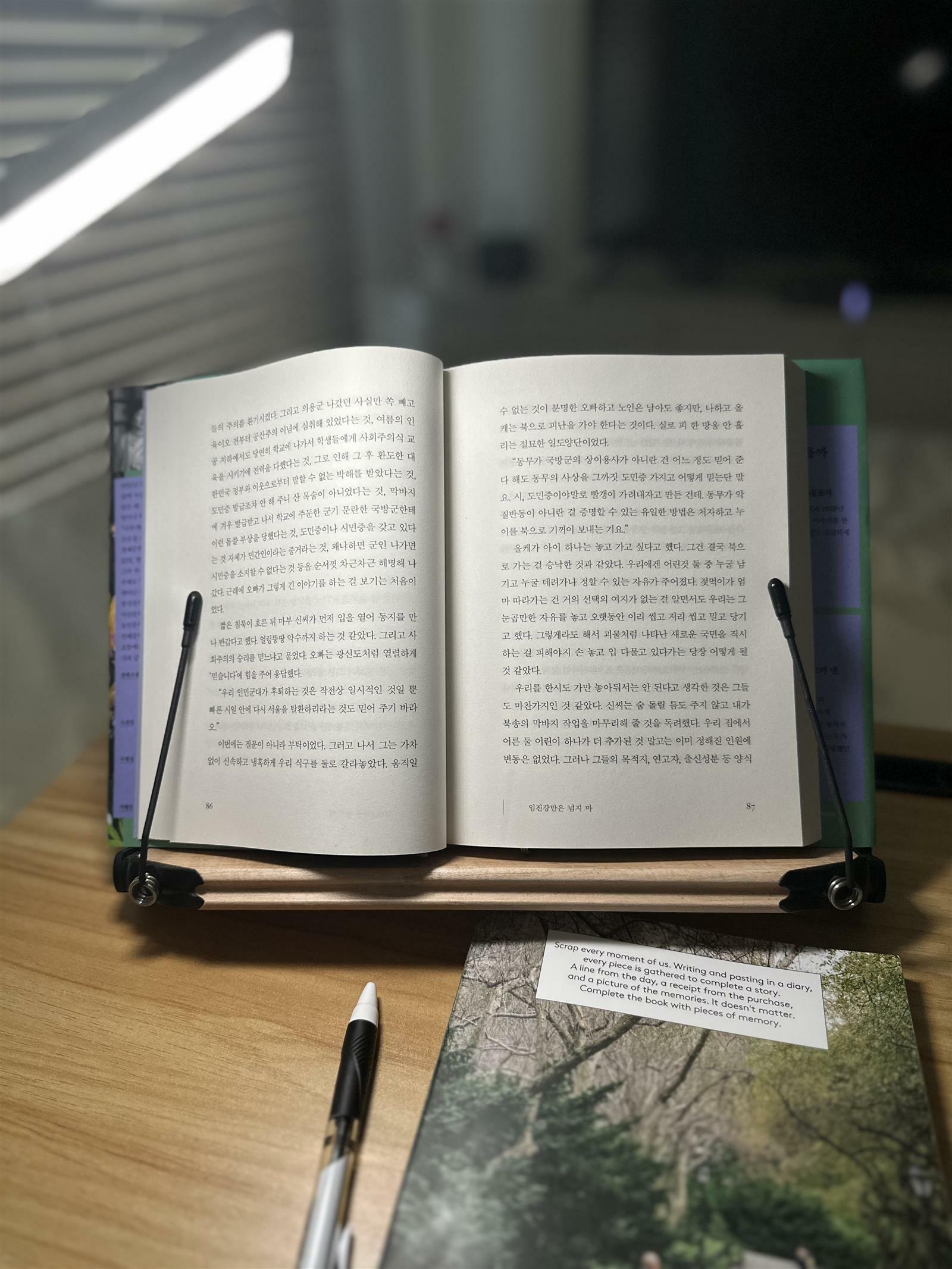-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 성년의 나날들, 박완서 타계 10주기 헌정 개정판 ㅣ 소설로 그린 자화상 (개정판) 2
박완서 지음 / 웅진지식하우스 / 2021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기억’해야 할 ‘기록’을 담고 있다.
짊어져야 할 무거운 삶의 짐을 지탱해 줄 바닥짐 하나 없이 소녀티를 막 벗은 스무살 처녀. 가족들과 얼기설기 엮인 실타래처럼 불안한 마음을 식량 삼아 감내해야 할 것이 많았던 비현실적인 진짜 이야기.
(P.56) 오로지 배고픈 것만 진실이고 그 밖의 모든 것은 모조리 엄살이요. 가짜라고 여겨질 정도로 나는 악에 받쳐 있었다.
(P. 61) 지난 여름의 전쟁이 박살내고 지나간 자리가 별 없는 밤 하늘을 배경으로 태고의 폐허같은 괴기하고 비현실적인 선을 시커멓게 드러내고 있었다.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 올케와 함께 남의 집 담벼락을 넘어 세간살이를 들쑤시며 먹을 것을 찾는 ‘나’는 밀가루 건더기 듬성듬성한 멀건 수제비국 부족하게 나눠 먹으면서 머릿속으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당장에 식구들 배곯지 않는 ‘내일’이 간절하다. 지긋지긋한 사상이며 이념이며 다 무슨 소용인가.
한 고비, 또 한 고비.
단 하루도 맘 편히 지낼 수가 없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 하는 세상 속에서 앞날의 대한 불안감은 줄어들지를 않고 서로 색깔이 다르고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총구를 겨누고, 줄을 그어 버렸으니 우린 맥없이 굴복할 수 밖에 없었다.
(P. 91) 북으로 난 국도 위로 퍼부어대는 폭격과 기총소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이는 거라면 쥐새끼 한 마리도 놓치지 않을 기세였다.
(P. 98) 가장 바람직한건 우리가 자는 사이에 소리없이 전선이 우리 위를 지나가서 밤 사이에 바뀐 세상을 맞을 수 있는 거였다. 우리는 어디서 밤잠을 자든 낮잠을 자든 이런 소망이 자는 사이에 이루어지길 빌면서 잠들곤 했다.
각자의 근심과 한숨을 삼키면서 내남없이 서로 내뿜는 형체없는 그림자같은 불행의 냄새로 가득 한 곳에서도, 인생은 덧없음이 아니라는 희망을 준 사람들의 온정이 전쟁과 분단이 훑고 간 상처를 잠시 잊게도 하고, 또 더욱 경멸하게도 만들었다.
(P. 184) 세상만 자반뒤집기를 안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든 적응하고 먹고 살게 돼 있었다.
뭐랄까, 희망 끝자락에 ‘딱’ 붙어서, 이제는 조금씩 그녀와 가족들에게도 살아가는 힘 얻을 일이라도 생기려나 하는 ‘꽃망울’을 본 느낌이랄까.
향토방위대에서 만나 함께 했던 언니에게 취업자리를 부탁해서 얻게 된 미군 피엑스 파자마부를 다니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첫 월급 봉투 당당히 내 놓았을 때 그 벅찬 감정이란...
(P. 226) 나는 아주 오랜만에 내 안에서 삶의 의욕이 쾌적하게 기지개를 켜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아도 난 이제 스물한살이었다. 미치게 젊은 나이였다.
가늠도 할 수 없는 삶의 모서리 만큼 일지언정 6.25 전쟁이 쏟아붓고 간 그 이후의 삶이 궁금했다.
살아 남는 것이 중요했고, 먹고 사는 것이 급급했으므로 , 오빠의 ‘죽음’에서조차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없었던 그 한 서린 날들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냈을까?’하는 참혹함과 동시에 경외심을 느낄 수 밖에 없었다.
생전 처음 가 본 ‘스낵바’ 이야기에는 나도 같이 콜라와 팝콘을 어석어석 씹고 싶은 신기함 가득 한 즐거움을 함께 느꼈다.
거친 말도 시원시원하게 쏟아내며 이야기 보따리 잔뜩 이고 온 어느 입담 좋은 어르신 같았던 박완서 작가님의 1951년 1.4 후퇴부터 1953년 결혼까지의 시기를 담은 이 책에서, 나로썬 상상할 수 없는 거친 그때의 삶도 ‘살아낸’ 힘은 결국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 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세상은 그녀에게 아프라고 던지는 돌덩이와 함께 ‘냉소’와 ‘환멸’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당찬 모습으로 꿋꿋하게 삶을 살아가는 강인함을 보여주었다.
(P. 7) 내가 살아 낸 세월은 물론 흔하디 흔한 개인사에 속할 터이나 펼쳐 보면 무지막지하게 직조되어 들어온 시대의 씨줄 때문에 내가 원하는 무늬를 짤 수가 없었다. 그 부분은 개인사인 동시에 동시대를 산 누구나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의 잘사는 세상의 기초가 묻힌 부분이기도 하여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펼쳐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