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대한 생각과의 만남 - 사유의 스승이 된 철학자들의 이야기
로제 폴 드르와 지음, 박언주 옮김 / 시공사 / 2013년 8월
평점 :



인문학을 다루는 출판사치고 '철학 입문서'에 관심을 가져보지 않은 회사는 없을 것이다. 철학 입문은 그야말로 모든 인문 분야의 숙원이요 과제며, 정석이자 로망이다.
이유가 뭘까?
맛을 한 번 보고나면 결국 와구와구 게걸스럽게 탐하고 마는 철학 구매자들의 왕성한 소비욕은 비지니스맨이라면 도저히 놓칠 수 없는 기회일 것이다. 철학 입문서는쟁반 위에 잘라 놓은 시식 과일. 일단 한 번 맛만 보라니까. 그러고 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 있을테니까!
한편 의무의 문제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아무리 발광해도 철학은 팔리지 않아. 니체는 신을 죽였고 대중은 철학을 죽였지. 의미심장한 얘기, 아무리 늘어놔봐도 따분한 말장난처럼 들릴 뿐이야. 그러니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얼음 위에서 속수무책인 북극곰이 되버린거다. 철학을 출판하는 사람들과 환경 보호 NGO들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상실감을 공유하고 있는 게 틀림없다.
이유야 뭐가 되면 어때. 비지니스 맨의 마음으로 책을 냈든, 아니면 철학에 대한 절절한 애정에서 출판을 했든, 어쨌든 이런 책들이 명맥을 유지한다는 건 철학을 사랑하는 흔치 않은 소시민으로선 여간 감사한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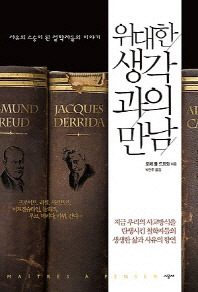
이 책은 '처음 시작하는 철학'의 속편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그 책을 본 적은 없으나 아마도 고전 철학들을 다뤘을 것으로 짐작한다. 왜냐하면 '위대한 생각과의 만남'이 현대 철학자 스무 명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영광스런 왕관을 받은 스무 명의 철학자들은 현대 철학사에 독보적 위상을 남긴 사람들과 여기에 더하여 작가의 선호도를 반영해 선정됐다. 면면을 보면 앙리 베르그송과 지그문트 프로이트를 시작으로 후설, 마르틴 하이데거, 비트겐 슈타인을 거쳐 사르트르, 카뮈에 이르렀다 푸코, 들뢰즈, 데리다로 마무리 된다.
이 책이 좋은 점은 '위대한 생각'을 창조해낸 사람을 굳이 철학자로만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트를 두 번째로 다룰 뿐만 아니라 인도의 정치인 마하트마 간디, 자신을 철학자로 부르길 거부했던 유대인 여성 정치 이론가 한나 아렌트, 역시 철학자임을 거부한 알베르 카뮈, 인류문화학자 레비 스트로스를 이 위대한 명단에 올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여기에 윌러드 밴 오먼 콰인, 메를로퐁티, 알튀세르 같은, 실제로 위대하지만 대중에게는 그닥 위대하지는 않은 철학자들도 이름을 올린다. 위대한 생각엔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만 있는 게 아니라는 작가의 사자후라고나 할까. 위대한 생각이란 본디 편견과 차별의 바위를 깨부수며 거침없이 흐를 때 진정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법이다.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인 현대 철학에 질린 사람이라면 이 반가운 면면에 새로운 흥분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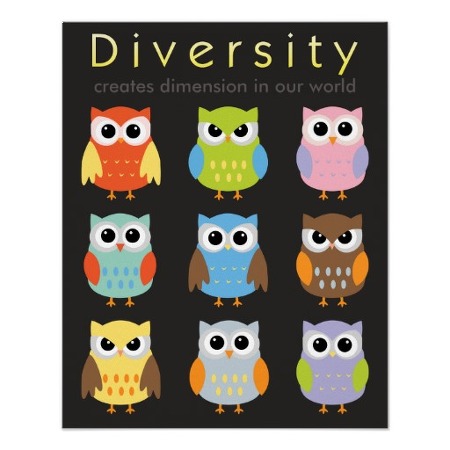
책 내용은 쉽고 가볍다. 한 명당 15페이지 내외를 할당해 내용이 지나치게 심화되는 것을 막고 한 명 한 명 빨리빨리 알아가는 재미를 선사한다. 물론 이 쉽고 빠름이 철학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세상에는 분명 일정량의 고통을 통해서만 흡수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아무리 세태가 변했고 그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철학은 결코 한 입에 꿀떡 삼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한 권의 책으로도 말하기 부족한 내용을 15페이지로 줄여야 한다면 거기에는 분명 삭제될 수 없어 아우성치는 사상의 비명들이 존재할 것이다.
더욱이 이런 책을 쓰다 보면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다. 어디서 어떻게 살았고 누구와 논쟁했고 누구와 사랑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렇게 5페이지를 빼고 나면 태산과도 같은 그들의 철학을 불과 10페이지에담아야 하는 불가능한 미션만이 남는다.
책 제목이 위대한 '생각'과의 만남이듯이 오롯이 그 생각에만 집중했다면 어땠을까? 순수한 사상의 덩어리만을 꾹꾹 눌러 담은 뒤 형틀을 돌려 생각의 정수, 그 마지막 한 방울을 짜내고 짜냈다면, 불가해 보이는 15페이지에도 충분히, 양질의 엣센스가 담기지 않았을까? 읽는 동안 나는 그런 부질없는 생각을 해봤다.
이 책은 원래 '간략하게 보는 현대 철학사'라는 제목으로 출간될 수도 있었다고 한다. 작가가 밝히고 있듯 그 목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정확하면서도 접근 가능한 출발점을 제공해주는 지극히 단순한'(p. 7) 것이다. 이는 입문서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목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은 그 목표를 아주 충실히 달성하고 있기 까지 하다. 그야말로 '언'과 '행'이 일치하는 셈. 그러니 나의 불만은 본격적인 현대 철학은 이해하지 못하는 주제에 가벼운 입문서에는 갈증을 느끼는, 참으로 어설픈 독자의 어정쩡한 불만이라고 봐도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