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수대 위의 까치 - 진중권의 독창적인 그림읽기
진중권 지음 / 휴머니스트 / 2009년 10월
평점 :



그림은 보는게 아니라 읽는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읽기'에 익숙하지 않은 현대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림이 처음부터 읽기의 대상이었던 것은 아니다. 한때는 미술도, 그저 장식품에 지나지 않았다. 당시 화가들의 지위는 'Ego'와 'Creative'의 화신인양 거드름을 피우는 오늘날의 Artist와는 달랐다. 그들은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렸고 자신을 후원하는 귀족이나 왕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라도 쫓겨날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불과했다. 이런 직업이라도 갖고 싶은 사람은 공방에 들어가 도제 수업을 받아야 했는데, 그곳에서 가르치는건 예술이 아니라 물감을 섞고 소실점을 찾는법 즉, '기술'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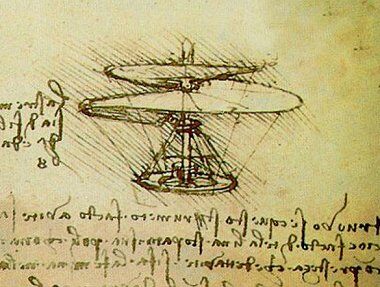
상황을 어렵게 만든건 비평가들이다. 비평가들은 역사 속에 파묻혀 있던 그림들을 꺼내 그것들이 드러내는 일관된 형식을 발견해 냈다. 그들은 이것에 사조라는 이름을 붙여 줄을 세우고 다시금 역사로 돌아가 그것을 탄생시킨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찾아내는데, 바로 그 순간 이 세상에 '미술사'라는 새로운 형식이 태어나게 된다.
인간이 무언가로부터 비평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먼저 그것을 대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대상화란 곧 내가 아닌 무엇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미술사가 아직은 역사의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을 때 그것은 역사와 하나였고 따라서 역사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그림은 해석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미술사가 역사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그림은 인간에게 대상이 되었고 보라, 우리는 마침내 그림을 보지 않고 읽게 되었다.
이쯤에서 한가지 고백을 해야겠다. 미안하지만 지금까지 한 얘기는 진중권이 아니라, 모두 내가 하는 얘기다. 하는 김에 한 마디만 더하자.
미술이 비평의 대상이 되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하는 동물. 인간의 생각엔 언제나 편견과 주관이 존재한다. 간단한 사실 하나를 두고도 얼마나 많은 관점이 존재하는가? 게다가 시대의 변화는 인간이 사고하는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기까지 한다. 불과 수 십년 전까지만 해도 진실로 여겨지던 것들이 오늘날에 이르러 그 지위를 박탈당해 거리로 내동댕이 쳐지는 일은 얼마나 흔한가.
그리하여 어제의 명화는 오늘의 쓰레기가 되고 오늘의 쓰레기는 미래의 명작이 된다. 축적된 시간에 비례하여 쓰레기와 명작의 자리바꿈은 빈번해진다. 그리고 이것은 뿌옇게 아침을 가리는 안개처럼, 단 하나의 진실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여정에 얄궂은 훼방꾼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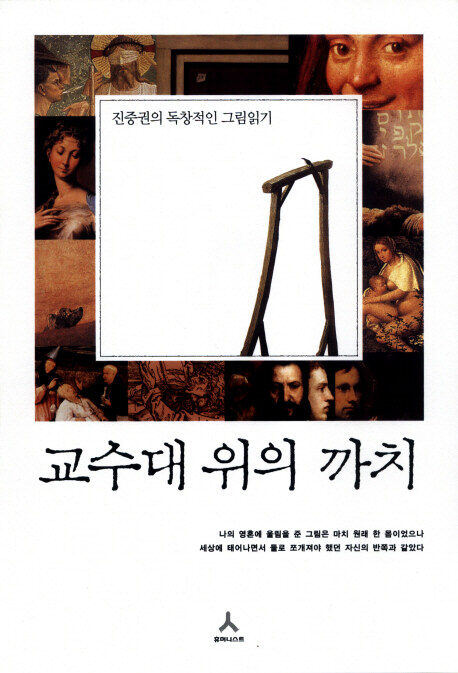
진중권의 그림 읽기는 이 짙은 안개 속에서 벌이는 고의적 길잃기다. 그의 작품 해석은 '정합적으로 완결된 체계'를 갖추지 않고 일부러 표류한다. 새로운 해석이 널리 알려진 해석을 덮치고 이전의 관점은 새로운 관점에 습격당한다.
이 책은 서두에 자신의 목적을 이렇게 밝힌다.
"미술에 관한 어떤 책들은 마치 작품 속에 누구나 읽어내야 할 무슨 보편적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전제한다. (중략) 대중을 예술적 문맹으로 간주하고 그들에게 작품을 읽어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독자로 하여금 작품을 스스로 읽도록 자극하는 것이리라."
다시한번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 아직도 안개가 햇빛을 가리고 있다고 믿는가? 미안하지만 해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당신이 유일한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햇님은 그저 이 세상을 이해하는 여러가지 방법중 하나였을 뿐이다.
그림 읽기가 괴로운 노동이 아니라 신나는 놀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한히 허용되는 자유, 끊임없이 생산되는 해석의 다양성에 있다. 그러니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따지는건 바보같은 똑똑이들의 소관으로 맡겨두자. 그들이 있지도 않은 진실을 찾아 햇빛에 눈이 멀때, 캄캄한 안개 속에서 열심히 춤추는 것만이 이 놀이를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