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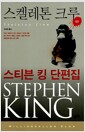
-
스티븐 킹 단편집 - 스켈레톤 크루 - 상 ㅣ 밀리언셀러 클럽 42
스티븐 킹 지음, 조영학 옮김 / 황금가지 / 2006년 5월
평점 :



스티븐 킹이 유명하다고 해서 처음으로 책을 사봤다. 필사를 할 생각 이었다. 나에게 글쓰기와 생계의 길은 다르지 않아, 하나로 포개져 있으므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의 책을 베껴 문장의 힘을 키우고 나아가 생활의 방편을 마련해 볼까 해서였다.
서문을 읽었다. 기가 막히더라. 손에서 책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읽던 책을 관두고 이것부터 집어 들어야 하나? 하고 생각했지만 꾹 참았다. 맛있는 음식은 제일 나중에 먹어야 희열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소설을 읽고는 실망했다.
스티븐 킹 단편집 '스켈레톤 크루 - 상'은 489 페이지의 두꺼운 책이다. 다작으로 유명한 작가이기 때문일까? 단편집 치고는 다소 묵직한 감이 있다. 그러나 책의 재미는 두께에 반비례한다는 명제를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으로 떠올리고 이 책으로 증명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한참을 읽어도 남은 페이지 수가 줄지 않아 자주 뒤 쪽을 들쑤셨다. 왜 이야기가 끝나지 않지? 책을 읽는 동안 솟아오르는 질문과 싸우느라 문장을 파헤치고 재미를 분석할 여력이 없었다. 장바구니에서 '하'권을 삭제했다.
이 책엔 9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데 '안개'처럼 200 페이지가 넘는 대작도 있고 '카인의 부활', '호랑이가 있다'처럼 아주 짧은 소품도 있다. 특이하게는 '편집증에 관한 노래'같은 긴 시도 있지만 사실 다 고만고만한 중편들이다.
우선 '안개'에 대해 말하자면, 작품이 너무 길다. 특히 도입부는 대하 역사 소설을 뺨칠 정도로 길다. 정체 불명의 안개가 마을을 뒤덮어 사람들을 잡아 먹는다는 내용인데 이 안개가 아주 기어온다. 마을을 뒤덮기 까지 수십 시간이 걸리는 듯 하다. 당연히 안개가 조장하는 불길한 서스펜스가 아주 천천히 전해진다. 주인공 일행이 대형 마트에 고립되고 난 뒤부터는 다행히 긴장이 돌아오지만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이 또 엉성하다.

<B급 영화로 만들기 딱 좋은 스티븐 킹의 소설들>
'토드 부인의 지름길'이나 '뗏목'같은 경우는 소재에 있어서는 참신한 맛이 있지만 긴장과 서스펜스, 염통이 쫄깃해지는 박력과는 거리가 멀다.
'원숭이'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볼 법한 진부한 소재를 택하고 있고 '카인의 부활'도 컬럼바인이나 버지아텍 총기 난사 사건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오늘날에는 쇼킹한 맛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나머지 소설도 마찬가지, 느슨한 플롯의 연속으로 지루함이 범람하고 졸음이 몰아친다.
머리 끝까지 빨려 들 것 같은 정체불명의 흡입력. 독자의 판단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환각제. 킹의 소설에선 이런걸 기대하는게 아닐까? 그러나 브라이언 싱어의 '유주얼 서스펙트'나 M.나이트 샤말란의 '식스 센스'같은 치밀함이 이 소설엔 없었다.
킹의 창작론 '유혹하는 글쓰기'를 읽어 보니 그 해답이 나온다. 이 소설가는 플롯을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소설은 언제나 상황에서 출발하는데 특정한 상황 속에 개성있는 캐릭터들을 몰아 넣고 스스로 행동하기를 기다렸다가 그것을 받아 적는 것이 쓰기의 전부라고 한다. 스티븐 킹은 애초에 완벽한 사기를 설계해 놓고 독자를 감쪽같이 속여 넘기는 구라꾼이 아니라 입심 좋은 허풍쟁이였던 것이다.

<출처: Flickr.com, geoftheref>
소설에 대한 판단은 직접 읽어보고 내려야할 일이지만 꼭 집어 추천하자면 글쎄, 그럴만한 작품은 없다. 혹자는 일 방문자 8명의 블로그를 운영하는 남자가 3억부의 사나이를 평가하는 것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혀를 찰지도 모른다. 그러나 독자의 마음이 그런건 어쩔 수 없다. 아무리 냉철한 논리라도 아무리 높은 이름값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건' 도무지 '어쩔 수 없는 것이' 바로 대중의 본질이다.
그러나 이 지구 위에 어쩔 수 없어 하는 또다른 인간들이 3억권이 넘는 소설을 샀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웬지모를 안심이 된다. 나 같은 사람만 있었다면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훌륭한 소설가 한 명이 어두운 다락방 위에서 쥐와 거미를 위해 글을 써야 했을 테니까 말이다.
혹평만 쏟아냈으니 다른 얘기를 몇 개 더 해야겠다. 킹은 성공한 소설가지만 에세이를 썼더라도 크게 성공했을 사람이다. '유혹하는 글쓰기'나 그의 서문을 읽어 보면 이 사람이 글쓰기에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알 수 있다.
킹은 기본적으로 센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유머 감각도 풍부할 거고 아마 말도 엄청 잘할 거다. 그건 대화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소설가는 아이디어가 기발하다. 독특한 소재와 그로테스크한 상황이 끝도 없이 뿜어져 나온다.
그런데 이 소재와 상황들은 명왕성의 당근이나 마그마 속의 우동처럼 인위적인 독특함이 아니다. 그의 공포는 우리 삶의 아주 익숙한 것으로부터 나온다. 낡은 인형, 매일 아침 보는 안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 날락하는 화장실. 그것들이 순간 낯선 것으로 변하며 그 안에서 공포가 뿜어져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설을 읽다 보면 어느덧 나의 집이 그리고 나의 장난감이 스믈스믈 본모습을 드러내며 그 섬뜩한 입김을 무방비의 살갗위로 뿜어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
사실 대중 소설의 시비는 판매 부수가 내려주는 것이다. 대중 작가가 되고 싶다면 문학성과 주제와 플롯에 앞서 '대중을 거스르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스티븐 킹이 노벨 문학상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의 소설은 길이 길이 인세를 벌어 들여 출판사와 후손들과 어딘가에서 꿈을 키우고 있을 어린 소설가를 살 찌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 남자,
역시 만만히 볼 사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