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미안
시간은 알을 깨고 나온다
가스레인지 모서리에 계란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잠을 깨 밖으로 나왔다
시간은 자신이 낳은 알을 쪼고 있었다
琢탁琢탁
계란이 가장 맛있는 프라이로 되는 시간은 2분이며
세상을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이분법이지
헷세가 탁자 위에 계란을 돌리며 말했다
돌던 계란을 잡았다가 놓았을 때
그대로 탁, 멈추면 삶은 알
멈추는 듯 다시 돌기 시작하면 날 것이다
젊은 괴테가 슬펐던 것은 관성 때문이었어
헤, 헷, 헷세가 말을 더듬었던 것도 같은데
관성이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그 삶이 삶겨지지 않은 까닭이므로
젊은 시인이 슬픈 것은
관성 때문이 아니라
네가 가진 계란은 죽었니 살았니 묻는 이분법
어느날부턴가 누군가 묻지 않아도
그 물음이 얼마나 편한 것인지 나는 알고 있었다 (P.16 )
쌍칼이라 불러다오
쌍칼,
그의 결투는 잔혹하다
어지간히 무거운 상대라도
높이 들어올리면
전혀 맥을 추지 못한다
지게차의 작업은 그렇게 냉정하다
일말의 동요도 없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상대의 중심 깊숙이
두 개의 칼날을 밀어넣는다
아무 표정 없이 들어올린다
그의 무게중심을 흩뜨리지 않는다
그를 자신보다 높이 추켜올린다
쌍칼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완벽한 전술이다
그를 오래 보고 있으면
결투의 원리를 알 것 같다 (P.22 )
화석표본
어젯밤엔 주정(酒精)과 막역하여
기억을 주점 카운터에 두고 돌아왔나보다
아침에 따귀를 맞은 듯 번쩍 일어나
허겁지겁 챙겨 입고 뛰쳐나온다
한참을 달려 전철에 올라 외투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
넌 누구인가
배내옷마냥 냅킨에 곱게 싸인 노가리 한 마리였다
너는 누구냐
어제 마지막 주점은 거기
서해였구나
바다에서 슬쩍 주머니에 넣어온 어족을 손에 쥔 채
너도 살 만큼 살았구나
어린 나이에 주점이나 드나들다 겉늙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더니
주둥이는 살아
날카로운 이빨로 어제 기억을 씹어먹는다
전철에서, 어류의 화석을 씹는다
박물관처럼 굳어가는 나이를 씹는다 (P.26 )
영구차
골목에서 만났다 그의 얼굴
생전에 살았던 집을 들렀다 나오시는 길인지
검은 리본 리무진 한 대
좁은 길에서 내 뒤를 채근하며 따라붙길래
먼저 가신 사람 또 먼저 지나가라고
담벼락에 등을 붙이고 서
길을 내주었다
차가 나를 스쳐지나가는 단 1초
안이 보이지 않는 차창, 안에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청춘이
나를 빤히 치어다보고
먼저,
간다 (P.43 )
목요 문화산책
혜화면옥에서 칼국수를 먹고 나오니 목요일이었다
5월인데 길에서 우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나는 오래 걸어도 된다
마음이 야트막한 사람들이 사는 동리를 지날 때
골목은 깊고 어두워 어린 짐승들이
그 안에서 몸을 기대기에 합당해 보였다
고궁은 몸에 빗장을 걸어 저녁을 가둔다
어서 5월이 가기를 바라는지
가지 않기를 바라는지 알 수 없어서
대학병원 앞 약국을 지나는 사람의 수를 세어보았다
가로등 불빛으로 앞모습에 제 이면(裏面)을 인화하는
버즘나무 잎새들을 올려다보았다
손가락으로 내 이름을 적었다가
나중에 누군가와 함께 여기 와서 들킬지 몰라
얼른 손바닥으로 문질러 지웠다
묘비명은 몸안에 돌을 세우고 손가락으로 쓰는 문장
그래서 잘 써지지 않고 지워지지 않았다
담벼락을 따라 걷다보니
금요일이었다
누군가 길에서 운다 해도 알은척하지 않은 채
지나도 되는
밤이었다 (P.94 )
-윤성학 詩集, <쌍칼이라 불러다오>-에서

詩集의 제목인, '쌍칼이라 불러다오'를 보고는
우선 '장군의 아들'이나 '야인시대'에서 종로2가 야시장
왕초인 '쌍칼'을 맡은 배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런데 시를 읽다 보니 그 '쌍칼'이 아닌, 지게차에 대한
詩임을 알고는 절로 '아,'소리가 나왔다. 왜냐하면 한 10년
전쯤, 어떤 일로 심야의 대형유통센터에서 푸쉬풀장치가 부착된
지게차가 파레트에 올려진 그 무거운 물건들을 아주 높이높이
가뜬하고 정연하게 올리는 광경을 넋이 나가게 감탄하며 바라 본
그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지게차의 작업을 이처럼 절묘하게
詩로 재탄생하게 할 수 있다니..'어지간히 무거운 상대라도/
높이 들어 올리면/ 전혀 맥을 추지 못한다.../ 그를 높이 추켜
올린다/. '그를 오래 보고 있으면/ 결투의 원리를 알 것 같다/.
윤성학은 자주 도시의 비의, 인공물의 상징체계로 하나의 윤리학
을 만드는 시인이다. 그러나 차갑지 않게 심금을 때린다.
'배내옷마냥 냅킨에 곱게 싸인 노가리 한 마리' 는 심심치 않게
나의 주머니에서도 나왔던 '화석표본'인지라, 시인처럼 서해를 만나지도 못했고 나이를 씹지도
못했던 나는 몹시 캥긴다.
원로 문학평론가이신 <잘 표현 된 불행>,의 황현산님의 해설 역시, 그 따로 자주 들여다 볼 문장이
라 기쁘기 그지 없다.
이번 토요일에는 아마 대학로에서 밤을 보내게 될 듯하니, 우리도 오랫만에 '혜화면옥'에
가서 수육을 안주 삼아 술 한 잔 해야겠다.
우리에게도 언젠가, '누군가 길에서 운다 해도 알은척하지 않은 채/ 지나간' 그러나 늑골 한쪽
엔 그 밤이 야트막하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윤성학 시인의 <쌍칼이라 불러다오>를 읽는 오늘은, 참으로 좋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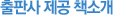
“해를 등지고 저의 그림자를 경작하는 자의 뒷모습은 환하면서 외롭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앞섶은 그리하여 어두운데”
윤성학 두번째 시집 『쌍칼이라 불러다오』윤성학은 도시의 경작생이다. 그의 경작은 평범하지만
그림자의 경작은 그의 창안이며 우리 시대의 업적이다.
―황현산 해설 「도시의 토템」에서
도시인의 비애로 만들어낸 생활 윤리200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 약육강식의 사회에서 버둥대는 현대인의 애환을 시로 표현해온 윤성학 시인. 그의 두번째 시집 『쌍칼이라 불러다오』가 출간되었다. 2006년 첫 시집 『당랑권 전성시대』를 펴낸 지 7년 만이다. 시인이라는 이름보다 직장인의 이름이 더 오래된 그. 두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건 어떤 거냐 물으니 ‘짜파구리’와 같단다. 전혀 다른 두 이름이 만나 새롭고 특별한 맛이 난다는 뜻.(윤성학 시인은 농심 홍보실에 근무한다.) 생의 부조리와 생활의 균열, 매일을 꼬박꼬박 살아내는 직장인의 비애를 소재 삼아 때로는 관조로, 때로는 익살로 끌어가는 그의 시와 똑 맞아떨어지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