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 지음, 마이클 매커디 판화, 김경온 옮김 / 두레 / 2005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이 세계가 노래하는 소리를 들려주는 소설”을 쓰고자 했다는‘장 지오노’의 인간의 상처를 치유하는 행동주의 정신이 고결하게 배어있는 영혼의 글이라 해야 할까?
지극히 짧은 소설이지만 내 마음에 전해오는 메시지들, 감동은 어떠한 장황한 대서사시 이상이다.
소설은 세계 대전(1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0년에 화자(話者)의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지역의 황량한 고산지대여행 중 만나게 된 양을 치는 남자와의 인연에서 시작된다.
매일 도토리 100개를 누구의 땅인지 관심조차 없이 아주 정성스럽게 심는 남자, 그래서 3년간 10만개를 심었고, 2만 그루의 싹이 나오고, 그 중 1만 그루가 생존하여 성장할 것이라는 애기를 전해 듣는다. 이후 전쟁 참전 후 잊고 있었던 도토리를 심던 남자를 기억하곤 10년 만에 찾았을 때 물조차 말라버렸던 황무지는 폭이 10킬로미터가 넘는 떡갈나무 삼림으로 변해있음을 발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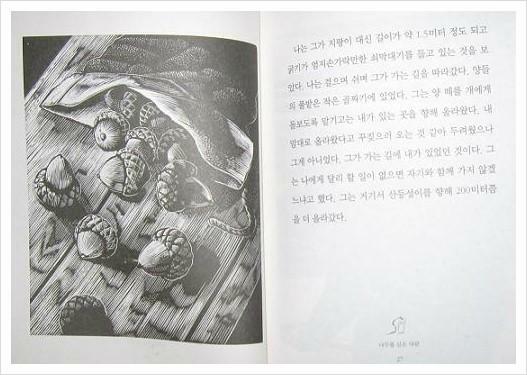
“아무런 기술적 장비도 없이, 오직 한 사람의 영혼과 손에서 나온” 실천이 만들어 낸 자연의 멋진 변화. 자신과 관계된 일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만을 마음에 두고 미래를 상상해보던 청년에게는 처음 보는 경이였을 것이다. 메마르고 너무도 황량해서 한정되고 제한 된 자원을 가지고 되풀이되는 경쟁에 좌절하고 무너져 버리던 고산지대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메마른 영혼 속에 푸른 잎을 피워 낼 내일의 도토리”를, 그 어떠한 경쟁적 속도도 숭배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며 일하는‘엘제아르 부피’란 남자에게는 이미 고매한 인격이란 수식도 어설프기만 하다. 아름다운 혼을 가진 사람, 철저한 고독 속에 홀로 일한 남자, 확실한 자신만의 열정, 선을 행하기 위해서 인내해야했던 무수한 절망과의 싸움이 짐작되어 절로 그 정신의 고결함에 겸허해 진다.
노인이 되었음에도 나무를 심는 평생의 일을 묵묵히 수행하던 1935년, 정부는 6~7미터의 나무로 빽빽한 삼리지대가 된 그곳을 ‘천연 숲’이라 부르며 시찰에 나선다. 천연의 숲이라니! 한 남자의 고결한 정신과 노동의 산물임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왜곡된 정신세계가 수치스러워지는 대목이다. 두 차례의 세계 대전이라는 인간들의 가공할 탐욕이 부딪히는 동안에도 노인은‘자연에 대립하는 인간’이 아니라‘자연 속의 인간’으로 더욱 깊숙이 들어간다. 아마 산의 웅장함과 고요함이 선사하는 우주와의 일체감에서 정말의 건강과 번영의 빛을 만나고 있지 않았을까?
한정된 자원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하다못해 앉는 자리의 위치를 놓고서도 경쟁하고, “선한 일을 놓고, 악한 일을 놓고, 그리고 선과 악이 뒤섞인 것들을 놓고 서로 다투”는, 정신이 실종된 오늘의 우리들에게 참다운 행복을 생각하는 시간을 준다.
우린 스스로들“‘인간이 인간에게 늑대(Home homini lupus)’ 인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 자연을 통제하려는 오만을 여전히 고수하고, 물질이 뿜어내는 광기로부터 소외될까하여 줄달음치는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제로게임일 수밖에 없는 잔혹한 경쟁은 이젠 멈추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비와 눈이 숲 속으로 스며들어 옛날에 말라 버렸던 샘들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자연의 생명력처럼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태양 아래 서 있을 때”임을 우리의 육체와 정신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이 책의 정신과 미덕은 작품의 첫 페이지에 밝힌 작가의 글처럼 ‘고결한 인격의 만남’이 주는 감동, 잃어버린 우리들의 인간성 회복에 대한 거대한 영감들, 게다가 강렬하고 풍성한 시적 서정성의 완벽한 하모니가 전해주는 정신의 숭고한 무엇, 그것의 지향인 인간의 희망과 행복의 부활을 꿈꾸게 하는 것일 터이다. 감동이 꽤 오래 마음에 남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