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거의 모든 죽음의 역사
멜라니 킹 지음, 이민정 옮김 / 사람의무늬 / 2011년 8월
평점 :

절판

인류의 “근원적인 공포와 집착의 대상”인 삶의 소멸로서의 죽음이란 부조리는 그 알 수 없는 세계, 무지로 인한 호기심으로 기이한 행동과 생각을 만들어 낸다. 또한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 경계, 대체 언제 인간은 완전히 죽은 것인가에 대한 정의조차 애매하기 그지없어, 시대의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철학적 문화적 사고에 따라, 나아가 발전된 기술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의되고 있으니 인간의 상상력으로 정의할 것이 아닌지도 모른다.
어쨌든 1768년 브리태니커백과사전은“영혼과 육신의 분리”라고 죽음에 대한 거친 정의를 남겼다가, 2007년 판에서는 “모든 생물이 종국에 경험하게 되는 생명이 완전히 중단되는 현상”이라고 조금은 신중한 정의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 역시 모호하기 짝이 없긴 마찬가지다. ‘생명이 완전히 중단되는 현상’이란 이 말은 사실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심박과 호흡의 완전 중단? 인공호흡법과 생명유지기술로 인해 이 정의도 “반사행동과 인지, 고통이나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라는 새로운 사망의 척도에 갈아치워졌다. 그럼 이를 통제하는 뇌간의 손상이나 괴멸로 진단되면 죽은 것인가? 여전히 PVS(식물인간)진단을 이끌어 낼만한 임상 실험 방법이 없는 오늘의 의료계나 뇌사판정의 오류를 보더라도 이 역시 죽음에 대한 완전한 판단이 되지 못한다.
하물며 1세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대의학 이전의 세상에서 이 죽음에 대한 진단은 산 자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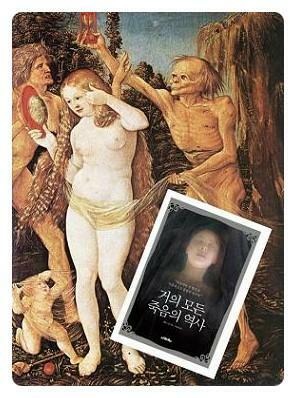 죽은 자에 대한 구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그래서였던지 죽었다고 판단하여 매장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끔찍한 사례가 빈번했던 모양이다. 단단하게 못질된 관속에서 몸부림쳤던 흔적들,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한 부패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체대기소가 만들어지고, 절명의 판단을 위한 엽기적인 진단법이 시도되거나, 깨어나면 흔들어댈 종을 연결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의 관들과 묘지들이 제작, 설치되었다니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우습기조차 하다.
죽은 자에 대한 구별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 그래서였던지 죽었다고 판단하여 매장한 사람들이 깨어나는 끔찍한 사례가 빈번했던 모양이다. 단단하게 못질된 관속에서 몸부림쳤던 흔적들, 이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완전한 부패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사체대기소가 만들어지고, 절명의 판단을 위한 엽기적인 진단법이 시도되거나, 깨어나면 흔들어댈 종을 연결하는 등 기발한 아이디어의 관들과 묘지들이 제작, 설치되었다니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우습기조차 하다.
그러나 이 희극 같은 사망의 진단과 매장의 모습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집착이나 죽음의 두려움을 읽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매장된 사체의 도난이나 훼손과 같은 산 자들의 탐욕까지 더해지면 망자와 가족들로서는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죽음이란 이 알 수 없는 공포에 대한 호기심은 역설적이게도 산 자들의 더없이 훌륭한 생존 수단이자 삶의 수호자로 활용되기에 이른다. 공포와 혐오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필요와 욕망실현의 대상이라는 모순성을 아울러 갖는다. 의대 해부학 재료로 사체가 밀매되고, 조형예술작품으로 둔갑하기도 하며, 부위별로 약재로 판매되는가하면, 영적 효험이나 미신적 상징물로 보존되고 거래되기도 한다. 죽음의 훼손과 경외라는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인식과 행동에는 기막힌 공리주의적, 과학적 합리주의 윤리관이 스며있다. 게다가 교활한 인간의 탐욕까지도. 이처럼 인간이‘죽음’을 바라보는 시선은 실로 얄궂다.
이러한 탐욕에는 권력의 과시와 명예의 보존과 같은 비물질적 욕망은 물론 삶의 연장과 부의 축적과 같은 물질적 갈망까지 삶의 전 영역에 이른다. 죽음조차 산 자의 이기심에 활용되는 것인데, 망자는 죽어서도 자신의 육신을 편히 쉬지 못하는 것이다.
‘대지에서 나온 이 대지로 돌아간다.’는 말은 오늘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아니 고대사회부터 이미 인간은 이 말이 공허한 말인지 알았을 것이다. 고대 이집트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중국사회의 시체 방부기술은 죽어서도 부패하지 않고 영원하겠다는 믿음의 미라를 만들어 냈으니 말이다.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유지를 수단으로 레닌의 사체를 방부처리하여 전시함으로써 소비에트 시민의 체제불만의 시선을 돌리려 한 것이나, 마오쩌둥, 김일성의 방부처리 보존은 이러한 대표적 사례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고대의 미라는 파헤쳐져 각종 질병에 효험이 있다는 약재로 둔갑하여 갈리고 빻아져 호사가들의 위장 속으로 들어갔으니 영원을 기대했던 미라들은 죽어서도 그리 편한 여정은 못하고 있으니, 영혼을 연장시켜 죽음을 죽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인간들에 대한 연민이 앞선다. 여기에 자신의 유골이나 사체의 재를 이용하여 다이몬드로 가공하여 보존하거나 회화의 재료로 그림에 남아있도록 하는 행위들이 산업화되어 죽음을 상품화하는 시대에 이르렀으니 가히 죽음에 대한 인간의 의식은 더 이상 고전적인 인식으로는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
내용인즉 추모(追慕)라는 그럴듯한 진지함이 있어 보이지만, 영원성에 대한 집착이외에 무엇이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죽음이란 부조리에 대한 공포는 오만한 과학을 등에 업고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외쳐대기까지 한다. “얼마간의 자금과 적절한 장치, 질소 용액만 있으면 피해갈 수 있다?” 영생주의자들은 냉동보존을 하고 냉동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유리상태의 보존기술을 말하는가하면, 뇌만 보존시키는 신경보존술과 인간의 생물학적 조건을 초월하는‘포스트 휴먼’이란 기계와 인간이 복합되고 조합된 인간을 통한 영생을 기도하기까지 한다. 결국 죽음에 대한 삶의 단절을 회피하기 위한 탐욕스런 집착이 인간을 질기게 잡아끌고 있다는 말이 된다. 존재자로 체감하는 현재성을 상실한 인간이 과연 인간일까? 현재성의 미학을 상실한 괴물이 아닐까? “삶의 연장이란 곧 고통의 연장이자 죽음의 배가를 의미한다.”고 누군가 말했다. 삶이란 죽음으로 인해 가치와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닐까?
존엄사(안락사)와 사망진단에 대한 의학적, 윤리적 재성찰을 통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강조, 인류사회의 매장문화와 장례의식이 지니는 영적의미는 물론 은폐된 속세 욕망들의 실체들, 미라 제작술과 방부처리 및 표본화 기술에 내재한 풍부한 역사적, 종교적 의미와 사례들,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서의 연옥을 말하기 시작한 기독교의 사후세계를 이용한 사기술책, 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죽음의 재발견 등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죽음에 깃든 인간의 역사를 이 책은 경쾌한 언어로 풀어내고 있다.
매양 일상에서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죽음을 잊어서도 안 된다. 죽음은 우리의 삶을 겸허하고 소중한 것으로 만들어 준다. 죽음의 역사를 훑어보는 여정으로부터 조금은 넓고 포용력 있는 시선을 갖게 해주는 저술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