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에
에델 릴리언 보이니치 지음, 서대경 옮김 / 아모르문디 / 2006년 4월
평점 :



“왜 그러시오? 아직도 피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오? 권력의 주구들아,
너희 차례를 기다려라. 너희도 곧 먹게 될 터이니!” -401쪽에서
이 작품을 읽기에 앞서 쇼스타코비치의 바이올린 협주곡으로 연주되는 ‘등에(The Gadfly’)를 몇 차례 반복하여 들었다. 고독한 격정이 억제된 누군가의 삶의 풍파가 느껴진다. ‘에델 릴리언 보이니치’의 이 소설(1897년 발표)이 1955년 영화화되자 영상 삽입곡으로 작곡되었던 것 같다. 음악을 듣고 소설을 읽는다면 작중 인물들의 내면에 다가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 선율의 비장미로 이미 감응하는데 적합하게 예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에델 릴리언 보이니치(Ethel Lilian Voynich), 1864~1960】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등 외세의 억압과 통제에 대한 거센 저항이 시작되던 민족주의에 눈뜬 19세기 이탈리아다. 그러나 이것이 소설의 전경(前景)이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저항과 혁명의 정신이 이야기의 토대로서 저변을 흐르며, 여인에 대한 사랑, 부정(父情)에 대한 그리움, 성(聖)과 속(俗)의 갈림길에 선 신부의 고뇌를 통한 신을 향한 사랑의 문제 등이 서로 얽혀들며 내면에 깊은 상처를 안은 한 영혼이 뿜어내는 우정과 헌신성, 사랑이 진한 서정성과 감동을 일으키는 열정적이고 일견 낭만적이기까지 한 작품인 까닭이다.
때문에 소설은 혁명이데올로기나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비판의식을 들이대는 그런 상투성의 작품이 아니다. 옮긴이의 설명처럼 오히려 “혁명의 관념성이나 종교 이데올로기의 위선성을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실존적 삶의 궤적”으로서 한 인간의 내면적 열정의 흐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어머니의 죽음에 시름하던 청년 아서는 오스트리아를 축출하고 자유 이탈리아를 건설하겠다는 비밀 저항 운동 단체인 ‘청년 이탈리아그룹’에 관심을 갖게 된다. 가계(家系)내 성장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차별과 억압, 부조리는 자연스레 젊은 영혼의 마음을 장악하는 대상이 된 것 같다.
그에게는 아버지와 다름없는 보호와 가르침을 아끼지 않는 피사의 신학교 교장인 신부 몬타넬리가 있다. 아서의 비밀 조직 가입활동을 우려하지만 교황청의 명령을 받아 새로운 교구로 이동하게 되고, 피사에는 새로운 신부가 부임한다. 아서는 소꿉친구였던 젬마를 그룹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녀의 조직에서의 역할과 활동에 더욱 호감이 깊어진다. 그녀가 아서의 조직 경쟁자인 볼라와 가깝게 지내고 함께하는 동지임에 아서는 질투를 느낀다. 몬타넬리 신부가 떠남에 따라 신임 신부에게 아서는 젬마와 볼라의 관계로 인한 혼란스러움과 시기심을 고해(告解)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청년이탈리아그룹 내에서의 사정을 발설하게 된다.
그는 영문을 모른 채 체포되어 구속되고, 조직원과 활동내용을 토설하라는 지속되는 고문을 받지만 끝내 입을 다문다. 그럼에도 어느 날 석방되고, 그가 그룹원들을 토설하여 풀려 난 것으로 오해된다. 그로부터 고해를 받은 신부의 배신에 의한 조작임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젬마는 볼라와 동료들의 체포와 구속을 아서의 책임으로 오인하고 뺨을 올려 부치며 배반자로 낙인을 찍고 돌아선다. 아서는 돌아가기 싫은 이복형제들이 있는 집으로 귀가하지만 그의 아버지가 몬타넬리임을 듣게 되고, 성스러움과 고귀함으로 흉측함을 은폐한 존재로서 단정해버린다. 그는 자신의 온 영혼을 차지했던 가톨릭과 사제집단, 신에 대한 신앙을 폐기한다.
연인으로부터 거절되고, 신뢰했던 사제에 대한 배신감으로 실의에 잠긴 아서는 자살로 가장하고 아르헨티나로 향하는 선박에 승선한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의 무일푼 청년을 기다리는 것은 온갖 압박과 폭력의 무한정한 노출이며, 노예보다 못한 지옥 생활로 점철된다. 부러진 팔과 얼굴을 수직으로 찢어놓은 상처, 뒤틀린 신체와 절름거리는 다리로 그는 13년 만에 귀환한다. 귀환은 저항조직을 비롯한 대중에 널리 알려진 풍자가로서 오스트리아에 붙어 권력횡포를 자행하는 예수회파에 대항하는 연합전선 구축에 효과적인 대항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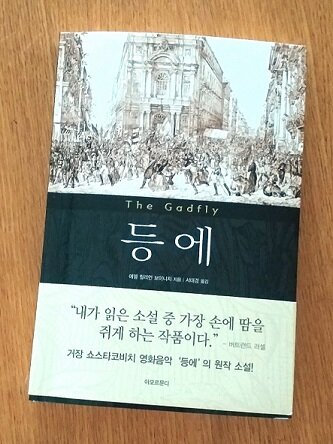
예수회파의 음모를 폭로하고, 민중을 일으키는 수단으로서 팸플릿의 글을 쓸 유일한 대안으로 호명된 것이다. 그의 이름은 일명 ‘쇠파리 등에’, 펠리체 리바레즈가 되어 이탈리아 통일전선 조직의 비밀 협력자가 되어 피렌체로 귀환한다. 그가 쓰는 조롱과 풍자의 글에 대한 내부의 옹호와 비판이 갈등하지만, 대중적 지지로 폭넓게 수렴된다. 조직에는 미망인이 된 볼라 부인, 즉 젬마가 있다. 볼라 부인은 리바레즈를 아서로 인식하지 못한다. 거북하고 불쾌한 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추진하는 사고와 행동에 대해 긍정적 이해를 갖게 되고, 두 사람은 작은 이념적 갈등이 있지만 대의에 대한 공통의 목표를 위해 정치적 동행을 하게 된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없는 아서인 리바레즈, 오해로 빚어진 어린 날의 우정에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어 자살하게 했다는 죄의식을 품고 있는 볼라 부인으로 불리는 젬마의 리바레즈에 대한 의혹과 내면적 갈등이 끊어질 듯한 실(絲)처럼 연결되며, 봉기를 위한 연대가 이어진다. 이처럼 아서와 젬마의 고귀한 사랑으로의 이행과 더불어, 추기경이 되어 민중으로부터 유일하게 청렴한 성인으로 추앙받는 몬타넬리에 대한 아서의 증오와 연민, 그리움과 사랑의 치열한 갈등이 속과 성의 갈림길에서의 선택과 병행하며 종교와 혁명의 가치의 통합을 통한 참됨에 대한 격렬한 사유가 흐른다.
그런데 이 소설의 위대함은 조롱과 독설, 부정을 통해 역설적으로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의 숭고함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지는 점이랄 수 있다. 소설은 비극으로 맺지만 결코 비극이 아닌, 오랜 생의 격전 끝에 맞이하는 안식처럼 평온이 독자의 정신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이 감상글의 모두에 인용한 추기경 몬타넬리의 민중을 향한 음성은 다분히 중의적이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을 신의 선택을 통해 내어 놓아야 했던 성인(聖人)의 피의 울부짖음이다. “그 피를 들이켜라, 기독교인들아...., 그 피를 들이켜라, 너희 모든 사람들아! 그 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더냐? 너희를 위해 붉은 핏물이 풀밭에 흐르고 있지 아니 하냐, (中略) 식인종들아..., 찢겨진 살을 씹어 삼키려므나.(394쪽)“
민중을 위해 아버지로서 자식을 희생제물로 내어준, 추기경 몬타넬리의 통한의 외침이다. 그는 자신의 파멸로 어리석은 민중, 압제 권력에 살과 피를 내어 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었으리라. 그럼에도 그는 그럼으로써 신을 배신하지 않는 길을 선택했다. 소설의 마지막을 이루는 3부 「아버지와 아들」 7,8 챕터의 아서와 몬타넬리의 대화와 아서를 잃은 몬타넬리의 민중을 향한, 그리고 신을 향한 목소리는 핏 멍울이 되어 독자의 가슴에 맺힌다. 아마 소설을 관류하는 주제는 “고뇌와 투쟁을 통해 드러나는 영혼의 광채” 그것일 게다. 그 고독하고 격정으로 충만했던 한 인간의 삶에 감응하며, 나는 여전히 작은 빛조차 꿈꾸지 않았던 열정 없음의 그 수치심에 몸을 떤다. 때문인지 철지난 로맨티시즘에 자꾸 감정이 이끌리는 시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