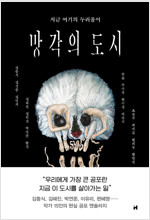올해의 독서를 정리하지 못했다. 이제 마음에 어떤 작은 흔들림을 주었던 책이 무엇이었나를 생각해 본다. 국내 문학(소설과 시, 에세이)은 여러 이유에서 소홀히 했다. 부분적으로 새로운 작가들의 몇몇 작품을 읽긴 했으나, 어떤 의무감에 가까운, 작은 기여의 차원이라는 소박한 심정의 독서였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그렇다고 무수히 발간되는 모든 책을 망라할 사진 기억술을 지닌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취향 또한 편협해서 비평과 철학을 비롯한 역사분야와 해외 문학의 범주를 벗어나지도 못했다. 특히 올 한해는 알베르 카뮈의 글 읽기에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내게 새로운 이해를 안긴 역사 및 문화 비평과 세계를 진술하는 방식의 다양성에 관한 저작들이 비교적 인상 깊게 남아있는 정도이다.

문학 분야부터 정리한다면, 단 하나의 작품만이 마음에 남아있다. 인간 실존의 본질적 문제를 들여다보게 해준 헝가리 작가, ‘서보 머그더’의 『도어』이다. 역사를 말하지 않으면서 역사적 실존을 탐색하게 하고, 그 가운데 인간 존재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게 한 작가의 발견이었다고 해야겠다.
그리고 국내 문학분야는 이미 등단시점부터 읽어 온 김사과 작가에 대한 짝사랑이 지속될 뿐이다. 그리고 안윤 작가와 올 한해 새롭게 알게 된 한정현 작가와 성해나 작가의 작품 정도가 여전히 기억에 살아있다. 두 날카로운 시선의 작가와 유머 넘치는 즐거움 속에서 진지한 사유가 피어오르도록 쓰는 두 작가는 아무래도 내가 좋아하는 취향인 까닭일 것이다.

그리고 분야의 분류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문예비평에 가까운, 그럼에도 문화사에 가까운 ‘한스 블루멘베르크’의 『난파선과 구경꾼』은 인류가 지혜를 전달해 온 오래된 방법으로서 은유를 재발견을 하도록 해주었다. 진열된 앎이 아니라 표면과 달리 짐짓 진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비-개념의 이 특별한 언어 도구와 이를 수단으로 한 인간 역사의 통찰은 세계를 인식하는 시선을 확장해주었다고 하겠다.

이와 아울러 ‘로버트 단턴’의 사회문화 현상의 저변에 자리잡은 개인들에 잠재하고 있는 집단적 의식과 무의식, 즉 광범위하게 시대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을 탐색하는 망탈리테의 역사인 미시사를 알게 해준 『고양이 대학살』은 정말 아름답기까지 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과학분야라면 단연 ‘움베르또 마뚜라나’와 ‘프란시스코 바렐라’로 대표되는 인간 유기체의 의식과 정신 작용에 대한 생물학적 접근을 통한 자기 고유의 구조적 역동성과 자기생성과 적응에 대한 것이다. 이젠 고전적 과학 저술이 된 『앎의 의지』와 『자기 생성과 인지』 두 저술은 아마도 다윈의 책보다 내게 더 많은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렇다 할 독서라고 내세울 것도 없어 보인다.

아마 2024년의 독서도 이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내겐 극히 예외적 사태일 것만 같다. 카뮈와 카프카를 비롯한 고전이 된 작품들의 몇몇 작가는 여전히 내 머리 속을 맴돌고 있으며, 마뚜라나와 바렐라, 그리고 블루멘베르크도 거듭 읽는 저술이 될 것 같다. 보르헤스가 이미 말했듯 이 세상에 새로운 이야기는 더 이상은 없을 것이다. 다만 내 앎이 부족 할 뿐이지 그 무엇이 새로울까? 2024년은 읽었던 책들의 내용이 보다 깊숙이 내게 체화되는 독서를 이어갈 계획이다. 아마 거듭 읽기가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