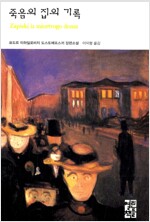죽음의 집의 기록을 다 보고 다음 타킷으로 집어 든게 제5도살장이다. 구매한지 한창됐던 차에 왜 샀던지도 까먹었던 책인데 제목만 보고 죽음의 집들의 기록과 비슷한 분위기일 거라 생각했고, 표지의 소개글을 보는 순간 그렇게 여겼던 내가 부끄러워질 지경이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취향과 더 접근하는 책은 제5도살장이 되겠다. 깃털처럼 가볍게 날아다니는 구절들이 비수처럼 푝푝- 들어와 박힌다고 할까. 대신 죽음의 집의 기록은 묵직한 납덩이 처럼 폐를 짓눌러 숨 쉬기 조차 힘들게 만든다.
사실 난 러시아의 문화도 모르겠고 제2차세계대전때의 유럽 상황도 모르겠다. 하여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어떤 ˝뜻˝을 얻게 되었느냐 묻는다면 ‘아, 그땐 정치범들이 많이 잡혔구나, 다른 나라와 접경지대의 사람들도 한 곳에 잡혀 들어가는구나‘ 정도가 되겠다. 진실로 그것은 다만 한 인간의 어느 한동안의 기록일뿐, 그 것을 애써 분석하고 풀어가려면 진정 누군가의 삶을 해석하고 풀이하는 격이 된다. 진중하고 약간은 침울한 늙은 교수의 잘 짜여진 기록과 심경을 읽는 기분이었다. 그에 비해 제5도살장은 요란하고 쾌활하지만 예리하고 직설을 서슴치 않는 교수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다. 한 쪽은 범죄자로 감옥에 갖힌 동안의 이야기고(죽음의 집의 기록) 한 쪽은 2차대전에서 전쟁 포로로 잡히고 심지어 폭격까지 당하고 그 속에서 살아 남는 이야기(제5도살장)지만...전 자가 현실적이며 진지하고 후 자가 판타지에 블랙코미디 범벅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난 후자를 선호한다.
죽음의 집의 기록에서 그나마 선명하게 다가온 것은 작가가 감옥...아니, 처벌제도에 대한 환멸감이었다.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으며 합리적이지 않은 처벌제도, 감옥, 형벌, 간수...그것들에 대한 혐오가 크게 와 닿았다. 그럼에도 적응의 동물이라는 인간이 그 곳에 서서히 물들고 정을 붙이고 나름의 법칙과 처신방식을 터득하는것. 터득하고 그 속에 잘 융합되었을때 느끼는 자아혐오와 자아만족감이라는 모순되는 감정의 탄생. 그것과의 투쟁, 받아 들임, 그리고 작별할때의 아쉬움과 또 그와 반대 되는 밝은 기대감. 이 모든 제도가 어떻게 사람을 구렁텅이로 던져버리고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다시 건져 올려서 오물을 털어주지도 않은채 왔던 곳으로 밀어 넣는지를 보여준다. 말하자면 ˝악인˝들에게 ˝불행˝을 안겨 줌으로서 결과적으로는 그저 ˝불행을 극복˝하게 하는 과정을 주는것뿐이라는 것이다. 그래, 이건 옛날이라 그렇다 쳐도, 문제는 요즘도 그다지 변한건 없다는 거다. ˝공허한 십자가˝에서 쓴것만 봐도 마찬가지다. 처벌제도의 개혁,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가? 피해자가 만족하고 사회가 인정할만한 그런것 말이다.
쓰다보니 길어졌다. 이걸 원한게 아닌데...
이제 제5도살장에 대해 써보자. 코미디의 요소가 좀 더 들어간 쿠엔틴 타란티노의 영화를 보는 기분이라거나...전쟁을 배경으로 한 ˝세븐 싸이코패스˝를 보는 기분? 외계인도 출몰하고 게다가 시간에서 풀려났다는 대목에서부터 실소가 터져나오는데 그런 설정을 기가 막히게 잘 써먹는다. 그리고 멀뚱하고 바보같은 얼굴을 한 빌리의 성격과 너무 잘 들어맞아서 소설을 읽는 동안 빌리의 얼굴을 보고 있는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한다. 그리고 ˝죽는다˝는 얘기를 할때마다 뒤에 ˝뭐 다 그런거지˝라는 말을 붙이는데, 도대체가 진지해질수가 없었다. 왜 이 작품이 독자와 평론가 모두에게 호평을 받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었다. 추가로 빌리가 시간을 여행하는 능력을 외계인한테서 배웠다는 말은 믿을 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에서 흘려준 단서가 너무 많고(거의 작 중 소설 작가가 쓴 책에서 나왔던 내용이라는 언급), 빌리의 두개골 부상의 후유증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무릇 뇌상태가 메롱메롱한 주인공이 보고 듣고 겪는건 의심해야 한다는 법칙아닌 법칙)
음...여기까지 두 작품에 대한 횡설수설이 되겠다.
추신: 제5도살장의 작가 커트 보니것은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하게 된다고 한다...이런 소름돋는 작가와 빌리의 싱크로율이라니...뭐 다 그런거지. 지지배배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