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올리브 키터리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 지음, 권상미 옮김 / 문학동네 / 2010년 5월
평점 :




미국 동북부에 있는 메인 주의 자동차 번호판에는 “Vacationland"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예전에 부시 대통령 부자가 임기 중에 여름휴가를 보내던 케네벙크포트도 메인 주에 있을 정도로 휴가지로는 그만이다. 남쪽의 떠들썩한 플로리다 바닷가와는 달리 조용한 대서양 연안의 정취를 느낄 수가 있다고나 할까. 바로 이 메인 주 출신의 작가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에게 2009년 퓰리처상의 영예를 안겨 준 <올리브 키터리지>는 메인 주 크로스비라는 작은 마을을 그 배경으로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정말 차를 타고 20여 분을 가야 집이 한 채씩 나올 만큼 인적이 드문 메인 주에(물론 포틀랜드나 뱅고어 같은 대도시가 아닌 시골 마을의 이야기다) 크로스비라는 작은 마을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가 있을까.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쓴 모두 13개의 서로 연관된 단편을 읽고 있자니, 마치 던킨 도넛에서 커피를 마시며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크로스비 주민의 가십을 듣고 있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만큼 이야기의 전개가 편안하다는 방증일 게다.
소설의 주인공인 올리브 키터리지는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입이 걸고 까칠한 성격의 소유자다. 아무런 유서나 쪽지도 없이 생을 마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녀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그대로 말하는 직설적인 성격이다. 그녀와는 반대로, 올리브의 남편 헨리는 약국을 경영하면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공동체 생활에 헌신하는 모범적인 시민의 본보기로 등장한다. 서로 상극에 서 있는, 캐릭터들의 묘한 조화라고나 할까. 이렇게 상이한 성격 차이는 갈등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이 혼잡한 세상을 대하는 우리네 생김새만큼이나 다른 다양성에 대한 상징으로 읽힌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 빙 크로스비를 연상시키는 작은 마을 크로스비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다. 우선, 헨리의 약국에서 일하는 성실한 데니즈는 어이없는 총기 오발 사고로 사랑하는 남편을 잃는다. 무대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 보드카를 입에 달고 사는 작은 바의 피아노 연주자 앤지는 숨은 애인 맬컴에게 결별 선언을 했다가 욕만 실컷 얻어먹는다. 헨리와 올리브의 외동아들이자 족부의학 전문의인 크리스토퍼는 우연히 마을에 들린 닥터 수잔과 “샷건 웨딩”을 떠올릴 정도로 급하게 결혼식을 치른다. 부부 관계를 거부하는 마누라 대신 다른 파트너를 찾는 남성이 있질 않나, 작은 마을 크로스비의 내부는 현란한 요지경 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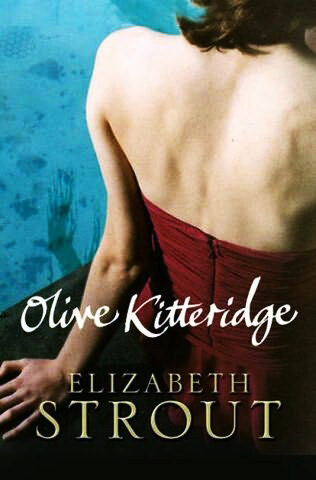
일면 서로 다른 듯해 보이는 각각의 이야기들은 상호 텍스트 작용을 통해, 서로 이어진 막다른 골목에서 ‘감정적 배신’이라는 공통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자신 남편의 장례식에서 그의 부정을 알게 되고, 배가 아파 들린 화장실에서 인질로 잡혀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던 와중에 아들 크리스토퍼가 가족을 떠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녀 때문이라는 헨리의 힐난에 올리브는 충격을 먹는다. 성급한 결혼과 결별을 경험한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낀 올리브는 자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에 놓인 이웃 라킨네 들러 조금은 치사해 보이는 위안을 찾지만, 모욕만 당하고 돌아선다. 올리브는 자신에게서 아들 크리스토퍼를 뺏어간 며느리 닥터 수잔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속옷을 훔치고 그녀의 스웨터에 매직으로 낙서한다. 설상가상으로 남편 헨리는 중풍으로 요양원 신세를 지게 된다.
<올리브 키터리지>에는 버거운 세상살이에 지친 소시민의 대리만족이 오롯이 숨어 있다. 그녀의 발언은 거침이 없다. 보통 사람 같으면, 머릿속에 담아만 두고 내뱉지 않았을 말도 그녀는 아무 거리낌 없이 툭툭 던진다. 막말도 서슴지 않지만, 자신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는 그녀를 누가 나무라겠는가! 바로 이 지점에서, 그녀가 전직 수학교사라는 사실이 그녀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논리적 사고와 수학 공식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는 삶의 무대에 유효하지 않다. 아니 누가 배가 아파서 잠시 들른 병원에서 마약을 찾아온 강도들에게 인질이 되리라고 예상이나 했겠나.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는 자신의 처녀작인 <에이미와 이자벨>(1998)을 쓰는데 6~7년이 걸렸다고 한다. 데뷔작에서 그녀가 그렸던 싱글맘과 그녀의 딸이 빚는 삶의 갈등은 <올리브 키터리지>에서 더 많은 등장인물과 확대한 구조 속에서 비등점을 향해 내달린다. 이해와 사랑만으로 타인을 감싸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네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 않다. 왜곡과 비틀림의 일상화에 삶의 무게는 더없이 버겁게 느껴진다.
한편, 비밀이 존재하지 않는 작은 커뮤니티에 대한 작가의 따스하면서도 동시에 냉소적인 작가의 양가적 시선이 느껴졌다. 사생활 보호를 위한 병원의 기밀 유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떠도는 소문은 확대 재생산되어 간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 원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면서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마음의 소유자를 위한 변론이라고나 할까.
<올리브 키터리지>의 다른 제목인 <메인 바닷가에서>를 보고 찻잔 속의 담은 잔잔한 이야기를 기대했다면, 예상외의 허리케인을 만날지도 모르겠다. 인생의 진중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이 책을 통해 우리의 삶은 예측불허의 변화무쌍한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