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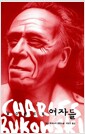
-
여자들
찰스 부코스키 지음, 박현주 옮김 / 열린책들 / 2012년 2월
평점 :

절판

50대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헨리치나스키는 작가의 분신으로 나온다.
작가의 이력을 살펴보자면 우체국 직원으로 일한 전력, 노동자로 일한 전력답게 이 소설은 작가의 자신을 나타내주는 헨리란 남성을 통해서 그려본 여성에 대한 생각을 드러낸 책이다.
시 낭독회나 강연회에서 자신의 글을 좋아하거나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통해서 만나길 희망하는 여성들이라면 모두 만나는 헨리는 여성의 다리를 보면 흥분을 감출 수 없는 남성으로 나온다.
책에서도 나오는 모든 부분들이 사람과 사람간의 감정 교류라든가 이성간의 어떤 사랑의 감정이 아닌 날 것 그대로 오로지 말 그대로 섹스로 시작해서 섹스로 끝난다.
술과 마약, 경마에 찌들은 헨리는 이와 함께 자신에게 오는 여자 막지않고 가는 여자 붙잡지도 않으며 연령대도 자신과 비슷한 나이가 아닌 20대에서 심지어는 10대 후반까지 관계를 맺으며 표현의 수위방식도 날 것 그대로 보인다.
남녀간의 성 행위의 묘사는 읽으면서도 붉어지게 만들고, 책 소개처럼 말 그대로 포르노그래피 일색이다.
처음 리디아 밴스를 만날 때도 시 낭독회인 것처럼 세 명의 여성들을 만나도 차례대로 관계를 가지고 또 그러다가 서로 헤어지고, 여성들 또한 그런 면에서 아주 성이란 면에 대해선 자유로운 생각을 가진 여성들이 등장하지만 그런 여성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솔직한 말투와 행동은 읽는동안 헨리의 이런 솔직한 면 때문에 여자들이 그야말로 소설가로서 시인으로서 흠모를 하다가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만든다.
모든 만나는 여성들마다 자유분방하다 못해 대놓고 욕설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만나 섹스를 하다가 사라란 여성을 만나면서 헨리는 기존의 다른 여성들이 보여줬던 행동과는 다른가치관을 가진 점을 발견하고 그녀와 만남을 갖지만 그러면서도 또 다른 여성을 만나고 사라에게 솔직하게 말하기도 하면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는 인물이다.
그러다가 로셸이란 여성이 걸어온 전화를 끊어버림으로서 기존의 자신이 가진 여자들에 대한 취향을 버림으로서 비로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사라만을 생각하는 헨리로 거듭나는 과정이 이 책의 주요 골자이다.
그렇다고 일관되게 자신의 감성을 타 소설처럼 감성의 기류에 힘 입어 이렇게 반성하고 저렇게 구구절절 표현하기 보단 한마디로 화끈한 남성이다.
어느 날 문득 일어나 보니 이런 생각이든 헨리다.
....... 이제는 내 삶을 바로 잡아야 해.
한 남자가 많은 여자를 필요로 할 때는 그 여자들이 다 쓸모가 없을 때뿐이다.
이 여자 저 여자랑 붙어먹으면서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남자는 정체성을 잃게된다.
사라는 내가 이제까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여자였다. 그건 이제 내게 달렸다. ....
어떻게 보면 이성간이 처음 서로간을 볼 때 느끼는 감정을 이리재고 저리재보고 결정 한 후에 만남을 지속하기보단 이 소설속의 작가 분신인 헨리는 일단 자신을 좋아하는 여자들은 무조건 만나고 섹스를 하고 헤어지고 경마장에 같이 가보고, 배팅도 해보고 마약도 같이 하고, 그러다가 진정으로 만난 사라란 여인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어서 이제는 눈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지 않겠단 생각을 가진 철든 헨리로 거듭나는 이야기라고도 할 수있겠으나, 다른 면에서 보자면 아주 솔직하다 못해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런 소설도 나올 수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한 소설이었다.
아마도 번역하시는 분(많은 책에서 이미 이름이 익숙한 분이지마)도 한국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날 것 그대로의 작가의 느낌을 전달하는가에 따른 많은 생각이 교차했을 성 싶다.
그 만큼 적나라한 표현수위와 자신의 자유분방함속에 점차 나도 모르게 빨려들어가 그의 행보에 같이 동행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의 소설이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한 책이기도하다.
읽으면서 위안을 삼자면 헨리의 정신차기기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라란 여인(실제론 두 번째 부인의 모델이란다. )을 만나면서 로셸이란 여인의 전화를 거부한 것으로 헨리의 방황하기는 종지부를 찍었단 점에서 숱한 여자들을 만나면서 한 남성이 겪은 이야기를 여지없이 생생한 묘사로 독자들을 이끈 작품이라고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