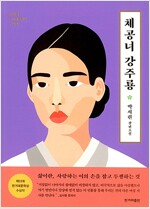이번 주는 좀 바빴다.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숙제도 해야했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 친정에 다녀오면서 아버지가 텃밭 농사로 지은 이런저런 수확물들을 얻어왔다. 그 가운데 말린 토란대가 있었다. 토란대 볶음을 해 보기는 했다. 일상에서 해 먹은 건 아니고 제사 때 이미 준비 된 재료를 볶기만 했다. 말린 토란대를 삶는 거부터 모든 과정을 다 해 보진 않았다. 그래도 뭐, 해 보기로 했다. 아, 결코 만만한 게 아니었다.
말린 토란대는 물에 불리면서 특유의 아린 맛을 빼야한다. 인터넷을 뒤졌다. 삼십분 불린 이부터 세시간 불린 이까지 다양했다. 그 글을 쓴 이들은 모두 한번 먹을 양만큼 구입해서 한 거라 양이 적었다. 나는 과감하게 아예 하루를 불리기로 했다. 큰 대야에 토란대를 담고 물을 부었다. 물을 갈아주면서 하루를 꼬박 불렸다. 고무 장갑을 끼고 치대가면서 빨고 쌀뜨물에 넣어 삶기 시작했다. 주걱으로 저어가면서 삶는데 솥이 작았나보다. 토란대가 자꾸 부풀어오른다.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 비슷한 솥 하나를 더 해서 두 솥에 나누어서 삶기 시작했다. 인터넷에는 10분 삶았다는 이도 있었지만 삼십분을 삶았다. 먹어보니 질기진 않은데 목구멍으로 넘어 갈 때 살짝 아린 맛이 남았다. 삶은 토란대를 건져내어 찬물에 여러 번 헹구고 다시 하루를 담가 두었다.
사흘째 되는 날, 드디어 건져내어 물기를 꼭 짜고 4센티 길이로 썰고 금방 먹을만큼만 덜어내고 봉지봉지 담아서 냉동실에 넣었다. 드디어 토란대 나물 볶음을 한다. 우선, 들기름을 둘러 볶다가 물을 붓고 뚜껑을 덮고 잠시 끓인다. 이 때 다시마 육수를 넣기도 한다지만 나는 새우살을 넣을거라 그냥 물을 부었다. 보글보글 익어 갈 때 새우살을 넣고 국간장과 액젓으로 간을 맞춘 다음 불을 끄고 잠시 두었다. 들깨와 잘 어울리는데 들깨가루가 없어서 생략.
다 쓰고 다시 읽어보니 장황하다. 나로서는 이게 어쩌다 한 번 겪는 일이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이런 일들이 일상이었다. 결혼 초에 시댁에 가면 마당에 굴이 가득 쌓여있었다. 며느리들이 둘러 앉아서 굴을 깠다. 금방 깐 굴은 싱싱하고 맛 있었다. 밭에서 시금치를 캐다가 다듬어서 나물을 하고, 여름에는 상추를 뜯어다가 밥상을 차렸다. 도시에서 자란 나에게는 신기하고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번에 토란대 삶고 불리고 볶으면서 어머니들, 그 윗대 윗대의 어머니들을 생각했다. 부엌을 벗어나지 못 하는 가운데 책 한 줄 읽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겠지. 어느 작가는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는데. 지금 핵가족 살림도 각종 기계의 도움을 받아도 힘든데 절차복잡한 살림을 살면서 지적 성취를 이룬다는 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었을까?
귀한 기록을 남긴 선배들도 감사하고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못 한 숱한 어머니들께도 감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