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네치카·스페이드의 여왕 ㅣ 문학동네 세계문학전집 234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지음, 박종소 옮김 / 문학동네 / 2023년 9월
평점 :




중·단편에 이토록 밀도 있고 강렬한 여성 서사를 녹여낼 수 있다니!
부단히 밀고 나아가 자신만의 서사를 쌓아가는 개개인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작품!
지난하고 비애를 느끼는 삶으로부터 달아나고 싶을 때, 책은 아주 훌륭한 도피처가 되기도 한다. 혁명과 전쟁, 정치적 억압과 숙청으로 혼란이 가중될수록, 소네치카는 현실을 피해 도스도옙스키, 이반 투르게네프와 니콜라이 레스코프와 같은 러시아 문학 작가들이 제공하는 환상의 영역 속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다. 암담하고 끔찍했던 피란 생활에서 그녀를 구원한 것도 도서관 지하실이었다. 남편이 될 로베르트 빅토로비치를 만난 것도 바로 그곳이었다. 1930년대 초 프랑스로 망명을 떠났다 고국으로 돌아온 예술가 로베르트 빅토로비치는 이미 마흔일곱이 넘은 나이였지만 소네치카는 그의 청혼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후 소네치카의 삶은 더 이상 책을 가까이 하기 어려울 만큼 가족을 건사하는 억척스러운 가장의 역할로 전환된다. 게다가 극 초반, ‘그(빅토로비치)는 언제나 자신의 자유에 대한 족쇄를 느끼는 즉시, 선조들의 신앙도, 부모의 바람도, 스승의 사랑도 모두 강하고 단호하게 배신했고 학문을 배신했으며 친구 관계를 끊어버렸다.’라던 문장이 예고하듯, 빅토로비치는 딸 타냐의 친구인 폴란드 소녀 야샤와 사랑에 빠지고 그녀를 뮤즈로 삼기까지 한다.
소네치카는 행복했던 십칠 년간의 결혼생활이 모두 끝났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슬픔에 잠겨 솔기가 다 풀어져 못 쓰게 된 옷처럼 허물어진 자신의 인생과 갑자기 찾아온 고독에 대해 생각하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희곡 『발렌슈타인』을 손에 집는다. 꽤 오랜만에 그녀는 문학으로 되돌아가 또 한번 순순히 자신을 내맡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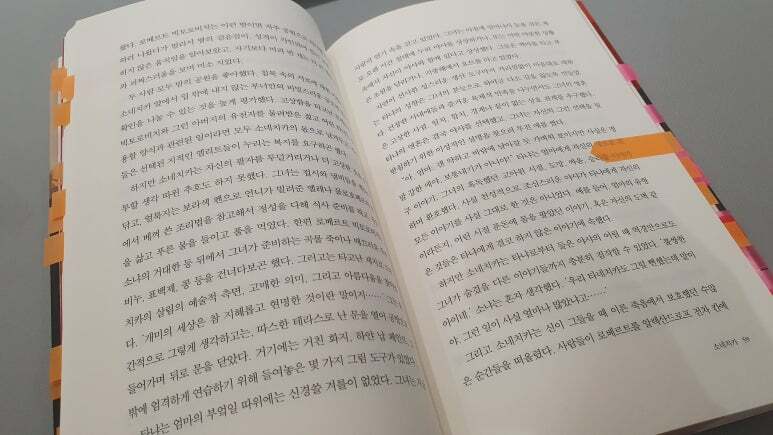
이 무렵에서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문학이 소네치카의 현실감각을 앗아간 것은 아닐까. 그녀에게 있어 문학은 그저 도피처에 불과한 걸까. 하지만 문학이 자아를 잊을 정도로 환상의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다 못해 그 경계 바깥의 모든 것들의 의미와 내용을 지워버린다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어쩌면 유년시절의 문학이 현실 감각을 잊게 해주는 데만 머물렀다면, 이 무렵의 문학은 소네치카로 하여금 현실을 감내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게 아닐까. ‘나는 문학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을 지탱해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우리 조상들은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할 때 문학으로 눈을 돌렸다’던 류드밀라 울리츠카야의 말처럼, 훗날 소네치카가 비난 대신 야샤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선택을 한 것도(이 역시 소네치카는 야샤의 굴곡진 삶을 문학처럼 받아들인 게 아닐까 싶다), 거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덤덤하게 삶을 연속시킬 수 있었던 것도, 종종 우리가 현실에 매달려있느라 보지 못하곤 하는 인내와 용서의 위대함 그리고 삶 그 자체의 숭고함을 문학에서 이미 보았던 게 아닐까 감히 짐작해본다.
노쇠한 로베르트 빅토르비치와 태생적으로 허약한 소네치카가 피란 생활의 곤궁한 벌판, 가난, 억압, 전쟁 첫해 겨울의 숨겨진 공포를 겨우 덮어주는 격렬한 구호 속에서 그루지야 스반족의 첨탑처럼 폐쇄적이고 고립된, 그러나 조각난 과거를 빠짐없이 이어주는 새로운 삶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눈이 먼 나방의 움직임처럼 종잡을 수 없고 번개 같은 속도의 유쾌한 전환이 일어나는 로베르트 빅토로비치의 삶은 유대 문헌에서 수학으로,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정의한 바에 따르면 결국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자 무의미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직업인 물감 칠하기로 옮겨갔고, 소네치카의 삶은 책 속에서 낯선 사람들이 지어낸 허구의 매혹적인 공상에서 양분을 얻었다. / 「소네치카」 중에서 22p
“우리가 이기고 전쟁이 끝나면 즐거운 삶이 시작되겠지?”
그러자 남편은 건조하고 따끔하게 말했다.
“그런 꿈을 왜 꿔? 우리는 이미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 그리고 이기고 지는 문제에 관해서라면 말이지…… 사람 잡아먹는 놈들 중 어떤 놈이 이기든 우리는 그냥 항상 지기로 하자.” 그는 이상한 표현으로 어둡게 말을 끝냈다. “내가 스승님한테서 배운 건 말이야, 녹색이건 파란색이건, 파르물라리우스건 스쿠타리우스건 그 어느 편도 들지 말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걱정스레 소냐가 물었다.
“내 이야기가 아니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야기야. 녹색, 파란색은 로마시대 경마장 파벌의 상징색이고. 난 어떤 말이 제일 먼저 들어오느냐에는 관심 없어. 그건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찌됐건 사람은, 그 개인의 생은 끝나기 마련이거든. 소냐, 이제 자.” / 「소네치카」 중에서 24p
이처럼 「소네치카」가 전쟁과 혁명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작은 개개인들이 처한 운명과 고난, 압제, 부조리, 삶의 배신 등을 담담하게 써내려간 작품으로 ‘수용’과 ‘이해’의 그림을 그려냈다면, 「스페이드의 여왕」은 ‘인식’과 ‘변화’를 담아낸 것으로 보인다. 가족 내에서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한 90세 노파 무르와 그녀의 괴팍함을 감내해야했던 가족이 마침내 무르에게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향성을 찾아나가려고 하는 모습에서 러시아의 현재와 오늘, 미래를 엿본다. 거대한 역사의 파고 앞에서 한 사람인 나는 비록 미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단히 밀고 나아가 자신만의 서사를 쌓아가는 개개인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준다.
사십여 년 전 안나 표도르브나는 어머니를 의자로 내리치고 싶었던 적이 있었다. 삼십여 년 전에는 머리끄덩이를 잡고 싶었다. 지금은 마음속으로 혐오와 구역질을 느끼며 자화자찬의 모놀로그를 흘려들었고, 기대했던 아침시간이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에 우울해했다. / 「스페이드의 여왕」 중에서 110p
“그게 다 무슨 바보 같은 짓이에요…….” 카탸가 너그러운 투로 속삭이며 어머니의 관자놀이께를 쓰다듬었다.
“아니, 이게 삶이란다.” 안나 표도르브나가 한숨을 쉬었다.
그러나 대화 이후에 불쾌한 앙금이 남았는데, 카탸가 자신에게 잘못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 「스페이드의 여왕」 중에서 118p
‘아니요, 사랑하는 엄마, 이번에는 아니에요.’ 안나 표도르브나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일생 동안 처음으로 ‘아니요’라는 단어를 소리내어 발음하진 않았지만, 이 단어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연약한 싹처럼 껍질을 뚫고 나왔다. 그녀는 단지 이 일에 관해 사전에 아무 이야기도 없이 어머니를 가족의 반항이라는 진실 앞에 세우고자 했다. 아이들이 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이 투명한 벌레가 어떤 소란을 일으킬지는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었다. / 「스페이드의 여왕」 중에서 141p



노벨문학상 후보에 꾸준히 거론되는 작가라서 호기심에 읽었는데 의외로 보물을 발견한 기분이다. 중·단편에 이토록 밀도 있고 강렬한 여성 서사를 녹여낼 수 있다니, 작지만 참 단단한 작품을 만난 것 같다. 가독성이 높아 쉽게 읽을 수 있는 데다 분량도 짧으니 러시아 문학이 어렵다고 느끼거나 오랜만에 세계문학에 관심이 가는 분들에게 특히 이 책을 추천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