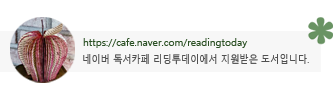비곗덩어리
기 드 모파상 | 임미경 옮김 | 열린책들
세계문학/p.127
책의 겉표지보다 사람의 외모보다 상품의 겉모습보다 더 중요한 건 내용이고 내면이며 내실이라고 생각하고 말하며 다짐도 한다. 하지만 막상 눈이 먼저 가게 되는 건 속이 아닌 ‘겉’이다. 이처럼 제목은 흥미로웠지만 왠지 손이 가지 않았던 '비곗덩어리'였다.
처음 이 책을 읽고 든 생각은 '나이보다 일찍 살이 오른 몸매로 '비곗덩어리'로 불렸던 화류계 여인 엘리자베트 루세 양 보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녀의 희생을 강요하고 당연시 여긴 그들이 더 '비곗덩어리'가 아니었을까?'였다. 그러다 문득 '비곗덩어리'를 떠올린 나는 나 또한 그것을 만지지 않기 위해 멀리할 거라는 생각이 스쳐지나 가면서 처음 떠올렸던 질문이 이젠 '과연 난 어디에 속하고 있을까?'로 바뀌게 되었다.
희생을 강요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오며 아주 작은 위선부터 내가 모르고 행했을 위선들까지 어쩌면 우리 모두가 그에 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하고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전쟁터에서 직접 인간의 위선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저자가 3편의 이야기로 들려주는 이야기.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프로이센군에게 점령당하며 전쟁에 패한 조국 프랑스를 버리고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서 국경을 넘으려고 상인 부부, 귀족 부부, 세력가이자 퇴역 장교 부부 그리고 두 수녀와 혁명가 코르뉘데라, 비곗덩어리로 불리는 엘리자베트 루세양이 일행이되어 떠난다. 마차 안에서조차 존재하는 다양한 계급은 마치 작은 사회를 보는 듯하다.
눈 내리는 길로 인해 식당가를 찾지 못한 그들은 비곗덩어리만이 준비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간신히 토트에 도착한다. 하지만 그곳에 머물고 있던 프로이센 장교의 루세 양과 자고 싶다는 욕망으로 인해 발이 묶인다. 처음엔 어떻게 그런 제의를 할 수 있냐고 자신이 모욕을 받은 듯 화를 내던 그들이 지체되는 시간이 길어지자 루세 양에게 화살을 돌리며 급기야 설득하기 시작한다.
아무 남자하고나 자는 게 저 여자의 직업인데, 누구는 받고 다른 누구는 마다하는 건 대체 무슨 이유랍니까? p.64
그녀를 설득시키기 위해 유티드와 홀로페르네스가 인용되었고 클레오파트라 등 자신의 육체를 지배 수단으로 무기 삼았던 여자들이 언급되었으며 천연두에 걸린 수백 명의 병사를 간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길을 나선 수녀들 또한 나서기 시작한다. 프로이센 장교의 욕심으로 인해 이렇게 발이 묶여있는 동안에도 상당수의 프랑스 병사가 죽어 나갈 거라고 말하던 수녀와 그녀를 어린 아가씨라 부르며 온화한 태도로 공략하던 백작.
그렇게 그들의 공략에 넘어간 루세 양 그리고 길을 떠나게 된 일행.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그럴 줄은 전혀 몰랐지.ㅠㅠ)

아무도 이 여자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 여자를 생각하지도 않았다. 비곗덩어리는 행세만 번듯한 저 파렴치한들에게 자신이 철저히 멸시당하고 있음을 느꼈다. 저들은 자신을 희생물로 이용했고, 그런 다음에는 더럽혀져서 쓸모 없어진 물건처럼 멀찍이 내쳐 버렸다. p.81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틀리다더니, 바로 떠나는 당일 절박한 고비에서 구조를 받았던 그들을 구해준 그녀의 존재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듯 그녀를 경멸하고 멀리한다. 혹여나 불순한 것이 몸에 닿을까 봐 그녀의 몸을 피하고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일행들. 급히 나온다고 아무것도 챙겨오지 못한 그녀에게 어떠한 나눔도 없이 다시 길을 나서는 마차 안에서 자기들끼리 먹기 바쁘다.
추악하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 정말 인간의 이기주의의 끝은 어디까지 일까? 과연 인간의 이기주의의 끝이 있긴 한 걸까?
지금도 여전히 코르뉘데가 부르던 ‘라 마르세예즈’ 노랫소리 사이에 울고 있는 그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1870년 20세 나이로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에 참전한 작가의 경험이 모티프가 되었던 소설 ‘두 친구’를 통해서는 전쟁에 대한 혐오감과 전쟁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 그리고 잔인성을, 기막힌 반전으로 마지막 뒤통수를 강하게 쳤던 ‘목걸이’를 통해선 삶의 아이러니를 느낄 수 있었다.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그걸 어찌 알랴? 누가 알 수 있을까? 참으로 얄궂은, 종잡을 수 없는 게 바로 삶인 것을! 그 얼마나 사소한 일이 우리의 삶을 파멸과 구원으로 갈라 놓곤 하는지! p.117
인간의 뒤틀린 욕망을 저자만의 간결하고 생생한 문장으로 만나볼 수 있었던 세 편의 이야기. 이렇게 또 좋은 저자를 알게 되어 더 좋았던 시간. 그의 다른 작품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