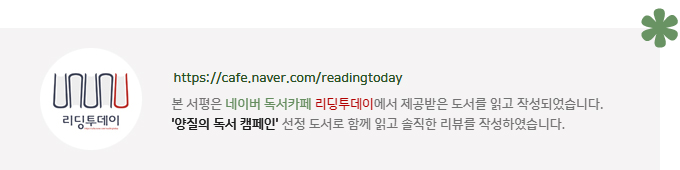-

-
깊이에의 강요 ㅣ 열린책들 파트리크 쥐스킨트 리뉴얼 시리즈
파트리크 쥐스킨트 지음, 김인순 옮김 / 열린책들 / 2020년 4월
평점 :




파트리크 쥐스킨트 리뉴얼 장편소설 다섯 권 중 마지막으로 읽은 <깊이에의 강요>, 분량이 총 83쪽으로 아주 얇은 책이다. ‘얇으니깐 후다닥 읽고 서평 남겨야지~’했던 가벼운 마음은 책을 다 읽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반성 모드로 바뀌면서, ‘역시 파트리크 쥐스킨트 작가답다.’라는 말을 되뇌게 만들었다. 이 얇은 책에 3개의 단편과 하나의 에세이로 정말 짧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하나하나의 이야기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절대 가볍지 않다.
소묘를 뛰어나게 잘 그리는 젊은 여인이 초대 전시회에서 어느 평론가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고 첫눈에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작품이지만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비극으로 끝이 나는 첫 번째 이야기 <깊이에의 강요>
다른 사람의 말과 평과에 자신감을 잃고 자괴감에 빠지면서 그림에 손도 되지 못했던 그녀가 점점 망가져가다 방송탑 아래로 뛰어내려 죽는 일련의 과정이 그녀의 죽음 이후 언제 그랬냐는 듯 그녀의 그림에서 깊이에의 강요를 느낄 수 있다며 전도양양했고 미모도 뛰어났던 화가가 상황을 이겨 낼 힘을 기르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을 바꾼 평론가와 서로 대비되면서 씁쓸함만이 남는다.

퀸을 희생시키고 비숍을 G7에 두다니!
……
자신들은 원하면서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체스를 실제로 그가 두고 있지 않은가.
체스의 고수 장에게 도전장을 내민 젊은 도전자 그리고 그들의 체스 경기를 지켜보는 구경꾼들, 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두 번째 이야기 <승부>.
전혀 자신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망설임 없이 자살하듯 모험적으로 체스를 두는 젊은 도전자의 모습을 보며 평소 자신들이 원하면서도 결코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모습이었다며 구경꾼들은 감탄사를 연발하더니 급기야 이 젊은 도전자가 최고의 체스꾼 장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정작 그 젊은 도전자는 자신이 졌다는 표시로 킹을 쓰러뜨리는 아주 무례하고 상스러운 행동으로 경기를 끝내고 구경꾼들에게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인사도 없이 유유히 사라진다.
분명 이긴 것은 장이었지만 승리를 하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고 스스로를 낮추면서까지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풋내기 앞에서 무릎을 끊으면서 얻은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승리였다며 장은 이것을 마지막으로 체스를 영영 두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다.
차근차근 정석대로 사회의 규칙을 따르며 삶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 전전긍긍했던 사람과 인습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는 도전자, 그리고 장처럼 이룬 것도 없고 그렇다고 젊은 도전자처럼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배짱도 없었던 구경꾼들, 정말 하나의 삶의 축소판을 보는듯했다. 나는 체스 고수인 장일까? 아니면 젊은 도전자 일까? 그것도 아니면 구경꾼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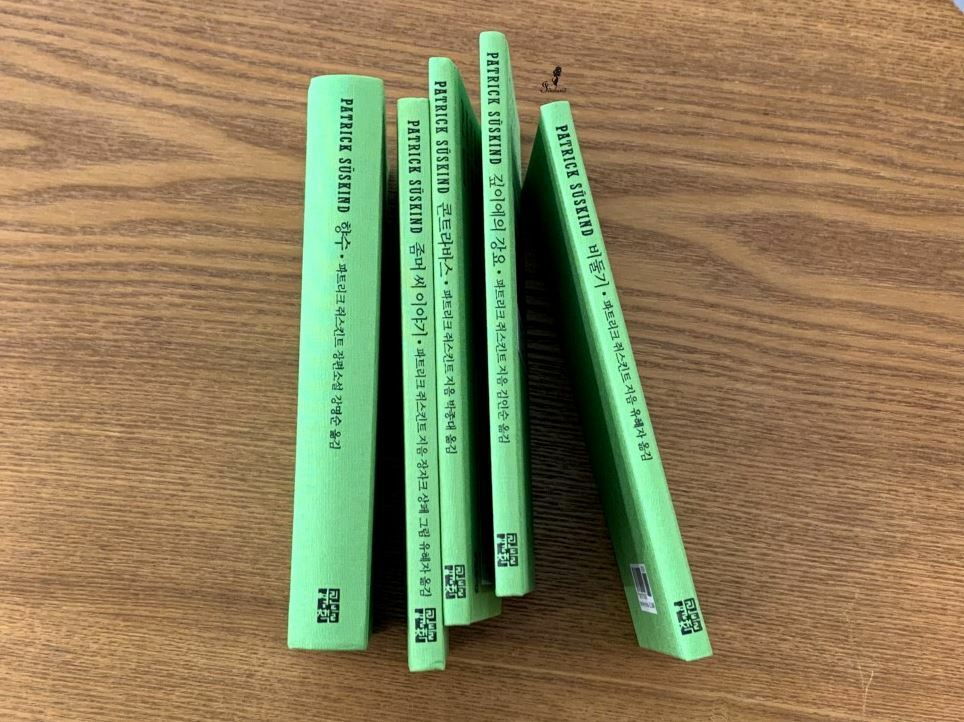
보석 세공업자 뮈사르는 자신의 화단을 갈아엎다가 발견한 조개로 인해 세계와 인간이 점점 조개화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대가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세 번째 이야기 <장인(匠人) 뮈사르의 유언>
유연한 신체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해를 거듭할수록 몸이 화석처럼 굳어가고 무감각해져 육체와 영혼이 메말라가면서 죽음에 이른다는 과정을 조개화시켜 이야기한다. 점점 감정이 메말라가는 인간들의 모습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돌조개와 다름없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변화를 모르고 있다. 비인간화되기를 거부하면서 온몸이 마비되어 가는 순간에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뮈사르는 마비되어가는 손으로 유언을 남긴다.
책을 읽다 자신이 쓴 메모를 발견하고 나서야 자신이 읽었던 책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넌지시 독서가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묻는 마지막 이야기 <문학의 건망증>
조금만 시간이 흘러도 기억의 그림자조차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안다면, 도대체 왜 글을 읽는단 말인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들고 있는 것과 같은 책을 한 번 더 읽는단 말인가? 모든 것이 무(無)로 와해되어 버린다면, 대관절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인가를 한단 말인가? 어쨌든 언젠가는 죽는다면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일까? 나는 아름다운 작은 책자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나 얻어맞은 사람처럼, 실컷 두드려 맞은 사람처럼 슬그머니 서가로 돌아가, 저자가 누구인지 모르고 그런 책이 있다는 것조차 잊힌 해 꽂혀 있는 수없이 많은 다른 책들 사이에 내려놓는다.
읽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책이 분명 있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책 읽기를 그만둘 것인가?! 오히려 이 무서운 건망증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판적인 의식으로 그 위에 군림해서 발췌하고 메모하고 기억력 훈련을 쌓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한다. 독서는 서서히 스며드는 활동으로 지금 당장 눈에 뜨지 않게 서서히 용해되기 때문에 몸으로 느낄 순 없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독서 체험의 깨달음이 우리 삶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줄 큰 파장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다섯 권의 책을 다 읽었다. 아직 읽지 못한 '승부, 사랑, 로시니'도 구비해 읽을 예정이다. 작가에 대해 1도 모른 채 그저 이쁜 표지에 끌려 신청해 읽게 된 책이었지만 정말 작가의 필력에 푹 빠져 재미있게 읽었던 시리즈 장편소설이었다. 같은 것을 봤음에도 그곳에서 다른 상상력을 펼쳐 보이며 독창적이고 특이한 소재로 독자를 매료시키는 작가, 파트리크 쥐스킨트를 알게 되어 정말 즐거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