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
김살로메 지음 / 도서출판 아시아 / 2018년 5월
평점 :




미스 마플이라는 이름이 익숙해 읽게 된 '미스 마플이 울던 새벽'은 추리소설의 소설 속 제인 마플의 이야기와는 달리 평범한 에세이 집이었다. 하지만 이 책의 매력이 평범하다는 것에 매력을 느꼈다. 친숙함에 끌렸던 에세이집은 편안함이 느껴졌다. 뭔가 화려함이 덧붙여 꾸며진 글과는 또다른 매력을 가진 담백한 문체가 읽는 내내 내용이 마치 스며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개인적으로 데이지를 좋아하는데 작가의 이야기에도 데이지꽃 내용이 나온다. "뚜렷한 경계를 지키면서도 소박한 품성을 유지하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꽃 본연의 모습을 살리면서도 담백함을 잃지 않는 꽃. 봄이면 나는 데이지를 만나러 꽃집 나들이를 한다." 나도 데이지를 보며 느꼈던 느낌을 작가도 느낀 점이 신기했다. 그리고 데이지의 이름 유래는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름과 어울리는 전설에 나도몰래 고개가 끄덕여졌다. 에세이를 읽다보면 나도 느꼈던 점을 작가도 느낀 부분에서는 몽글몽글한 기분이 드는데 이 책의 작가도 종종 이와 같은 점을 볼 때 절로 웃음이 입가에 지어지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다. "타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에게 관심이 없다. 그러니 부디 스스로를 긍정하도록. 나를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수록 타자의 시선도 나를 곡해하게 된다." 이 말도 나도 머리로는 느꼈지만 마음으로는 끝맺지 못한 문장이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다. 책의 내용은 그리 많지는 않다. 그리고 중간중간 엔틱한 흑백사진은 묘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낡은 앨범 속 엄마몰래 사진을 꺼내본것처럼 아득한 사진들은 글과 함께 어우러져 제 빛을 발한다.
아직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본적이 없어서 여행에 대한 글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더 관심있게 보게 되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기억에 남는다
여행의 묘미는 '돌아옴'에 있다. 당장이라도 여장을 꾸려 어디론 떠날 수 있는 것은 돌아올 희망이란 반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행에서 '떠남'만을 생각했지 '돌아옴'에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상상이나했을까 나도 그저 여행을 어디로부터의 떠남 , 일상에서의 탈출 정도로만 생각했다.하지만 작가의 글을 읽고 "돌아올 기미 없는 여행은 엄밀히 말하자면 여행이 아니라 도피이거나 추방 아니던가, 돌아옴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은 발랄한 판타지요, 반짝이는 마법이 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도 나중에 여행을 떠난다면 돌아올 때 추억이 될 수 있는, 돌아감을 그리워 할 수 있는 여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에세이집은 아무래도 작가의 생각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기때문에 작가만의 문체의 매력이 잘 드러나 있는데 이 글 역시도 간결하고 담백한 문체가 매력적이다. 글의 내용 중 '문체 미학의 경제성'이라는 부분은 작가의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나 있는데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의 일화를 인용한 부분을 읽어보면 스승이 제자의 "텅 빈 산에 나뭇잎은 떨어지고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라는 이 문장을 "빈 산 잎 지고 비는 부슬부슬"로 줄였다. 이는 설명을 아끼고 다만 보여주라는 스승의 뜻과 이를 인용한 작가의 뜻이 한 마음에 느껴셔 어쩐지 통쾌함을 자아냈다.
문체미학의 경제성안에 온 우주적 글쓰기가 담겨있다는 작가의 말에 깊이 공감함을 느꼈다. 나도 쓸 수야 있다면 문체미학의 경제성안에서 글을 쓰고 싶지만 원래 장문보다는 단문이 어렵고 소설보다는 시가 더 어렵다고 느끼는 나로서는 아직도 까막득한 경지이다.
타자에 대한 이해가 돋보이는 두 나무의 이야기는 비록 인간은 아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이 머리속에 상상되면서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풍기는 두 종류의 나무가 서로의 매력을 더 돋보이게하며 자라나 있는 모습이 상상되었다. 나무를 본적이 없는데 느껴진다고 표현하면 이상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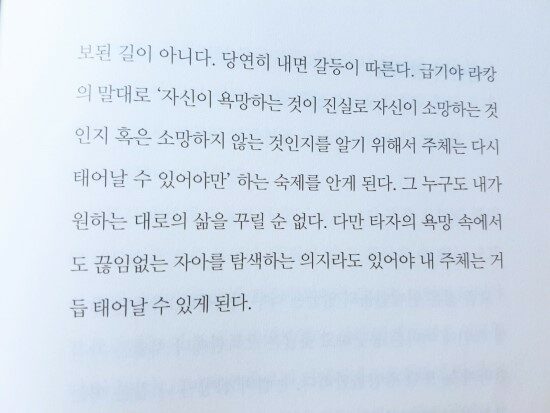
타자와 나와의 조화를 어떻게 이뤄야할지 생각하게하는 리캉의 말이었다. 나를 받아들이고 긍정하여 타아의 욕망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아를 탐색하기도 잃지 말아야한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욕망하는 것이 진실로 자신이 소망하는 것인지 혹은 소망하지 않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주체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야만'이라는 말이 철학적이면서도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었다.
*도서를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솔직하게 서평을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