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되면 꽃이 피는 당연한 일들이, 잠자던 땅이 깨어난다는 사실이, 남다르게 다가오는 건 무슨 이유일까? 자연의 위대함을 다룬 책들이 자꾸 눈에 들어오는 이유도 그 때문일까? 소설을 읽다가 사건의 중심 속 인물의 내면이 아니라, 계절의 풍경을 묘사한 부분에 빠져든다. 이제는 소설이 아닌 에세이가 좋다는 친구의 말이 떠오른다. 봄이 되었고, 친분이 없는 누군가의 트윗에 올라온 꽃소식을 듣는다. 겨울에는 듣지 못했던 새의 소리를 듣는다. 아, 봄이구나!!
아직 아파트 주변의 나무엔 연두의 춤사위는 보이지 않는다.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지 않으니 더욱 알 수 없다. 꽃을 보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랄 뿐이다. 오빠네 집에는 커다란 동백이 피었을지도 모른다, 수줍은 목련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나를 기다릴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런 책들을 뒤적인다. 메리 올리버의 『완벽한 날들』은 이제 봄의 대명사가 된 책이다.

‘3월이다. 파랑새들이 하늘에서 미끄러지듯 날아다닌다. 4월이다. 고래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긴수염고래, 혹등고래, 희귀한 참고래가 해안에 도착한다. 만으로 들어오고, 가끔 항구로 들어오기도 한다. 그들도 우리처럼 장난을 아는지 거대하고 육중한 몸을 뒤채고, 물 위로 뛰어오른다.’ 23쪽
‘우주가 무수히 많은 곳에서 무수히 많은 방식으로 아름다운 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가. 그러면서도 우주는 활기차고 사무적이다.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그 섬세한 풍경들을 보이고 괴록을 과시하고 인식을 하는 건 분명 아니다. 그럼에도 그 억양들은 우리에게 최고의 활력소가 된다.’ 48쪽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은밀하게 움직이는 우주의 놀라운 괴력을 말이다. 그런 거대한 우주와 만나는 삶은 어디에 있을까. 소로의 사색을 담은 『고독의 즐거움』속 구절들이 그러하다. 복잡다단한 삶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삶을 추구하는 모습이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나고 자란 탓에 흙과 땅은 익숙하다. 지금도 논과 밭이 보이는 곳에 살고 있다. 가끔 아침에 창문을 열면 퇴비 냄새를 맡을 수도 있다. 익숙한 냄새지만 아직은 향기롭다고 표현하지는 못하겠다.

‘호수는 인생보다 아름답고, 인간성보다 투명하다. 화이트 호수와 월든 호수는 이 땅의 커다란 수정이며 빛의 호수다. 만약 두 호수가 영원히 얼어붙은 상태고 손에 잡힐 만큼 작았더라면 어느 노예가 보석이라 훔쳤을 테고 그것은 마침내 황제의 관을 장식했을 것이다. 그러나 호수는 액체인데다 너무도 거대하며 시장 가치를 따질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 252쪽
어린 시절 작은 늪을 우리는 포강이라고 불렀다. 우포 같은 늪지가 아닌 그런 형태를 지닌 작은 웅덩이라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시절의 모습과는 다른 형태가 되었다. 그 옆을 지날 때마다 물뱀이 나타날까 재빠르게 뛰었던 기억만 남았다. 모든 것은 변하고, 결국엔 사라지고 만다. 사라지는 것들을 우리는 추억하며 그리워한다.
목성균의 『누비처네』를 읽으면서 내내 그리웠던 건 어린 시절이다. 할머니의 잔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던 나의 마음에 미움이 있었던 시절, 비나 눈이 오면 질퍽거리던 작은 마당, 돼지를 키웠던 우리, 옆집 밭에서 몰래 딸기를 따 먹고 모르쇠로 일관했던 시절이다. 소소한 일상의 조각들을 만날 수 있다. 자연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발견하는 아름다움은 정말 경이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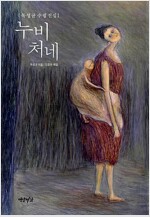
‘신록이 우거지는 초여름, 다랑논을 본 적이 있다.모내기 준비를 끝낸 다랑논은 참 깨끗했다. 가래질을 해서 질흙으로 싸발라 놓은 논둑이 마치 흙손으로 미장을 해 놓은 부뚜막처럼 정성이 느껴졌다. 차마 신발을 신고 논둑길을 건너가기가 죄송할 지경이었다. 골짜기의 물을 허실 없이 가두려고 정성을 다해서 논둑을 싸바른 것이다.
물을 가득 잡아 놓아서 거울같이 맑은 다랑논에 녹음이 우거진 쇠재가 거꾸로 잠겨 있었다. 뻐꾸기, 꾀꼬리, 산비둘기의 노랫소리가 다랑논에 비친 산 그림자에서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송홧가루가 날아와서 논둑 가장자리를 따라 노랗게 퍼져 있었다. 조용히 모내기를 기다리는 다랑논이 마치 날 받은 색시처럼 다 받아들일 듯 안존한 자세여서 내 마음이 조용히 잠기는 것이었다.’ 30, 31쪽
봄이다, 보.옴이라고 말해도 참 예쁘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예쁜 말이지만 봄은 신비한 마술을 부리는 계절이다. 봄을 노래한 시, 꽃을 노래한 시를 찾는 즐거운 날들이다. 나의 계절이 봄이었던 시절, 연인은 내게 이런 시집을 선물했다. 정현종의 『한 꽃송이』. 아, 그 봄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봄에
진달래꽃 불길에
나도
탄다.
그 불길에 나는 아주
재가
된다.
트는 싹에서는
간질 기운이 밀려오고
벚꽃 아래서는 가령
탈진해도 좋다.
숨막히게 피는 꽃들아
너희 폭력 아래서는 가령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
- (한 꽃송이, 38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