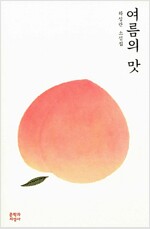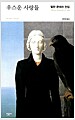어제 점심엔 그릇을 깼다. 밥을 담는 공기였다. 깨질 수 있는 물질이니 깨지는 건 당연하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게 화가 날 뿐이다. 좋아하는 그릇이라 다시 주문하려 하니 판매중지 상품이라고 공지가 뜬다. 구매할 수 없다는 글은 그릇에 대한 집착을 키웠다. 내가 소유할 수 없는 물건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다. 지난 금요일에는 어떤 책에도 비슷한 생각을 품었다. 큰 언니가 주문해 달라는 책이었다. 에쿠니 가오리였다. 몇 권의 책을 읽었지만 그는 아주 좋아하는 작가가 아니다. 언니의 주소로 주문한 책은 『한낮인데 어두운』이었고, 『낙하하는 저녁』은 품절이라 주문하지 못 했다. 두 권에 대한 책이 갑자기 궁금해졌다. 얼마 후면 잊힐 관심이지만 현재는 그렇다.
저녁엔 할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렸다. 목사님을 모시지 않고 가족들끼리 예배를 드렸다. 작은 아버지가 오셨고, 예배를 드리고 저녁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색이 고운 황도를 먹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우리는 가을 비와 추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대신 아버지 형제들의 나이와 내 형제의 나이와 아이와 조카의 나이를 헤아렸다. 우리는 모두 늙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다. 마당에는 할머니와 엄마가 밭에서 따온 콩을 손질하고 있었다. 나는 할아버지 곁에 있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언니와 오빠는 학교에 갔고 동생은 어렸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할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것이다. 물론 그때는 인식하지 못한 일이다. 그 후로 몇 년 동안 벽에 걸려있었던 할아버지의 사진은 사라졌다. 하성란의 소설집 『여름의 맛』을 보자 그날의 한 장면이 함께 떠올랐다. 가족이라는 끊을 수 없는 끈을 생각하면 언제나 줌파 라히리의 『그저 좋은 사람』과 『이름 뒤에 숨은 사랑』, 개정판을 기다리는 『축복받은 집』이 겹쳐진다. 자식의 태어나고, 이름을 지으며 부모가 가졌던 사랑을 말이다.
가을 비가 내리는 날, 밀란 쿤데라의 유일한 단편집 『우스운 사랑들』 과 가을을 닮은 글일 것만 같은 시인들의 연서 『어쩌다 당신이 좋아서』 를 검색한다. 그리고 장필순의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다. 새로 발표한 앨범에 수록된 노래 <그리고 그 가슴 텅 비울 수 있기를>과 드라마 아일랜드에 나왔던 노래 <그대로 있어주면 돼>를 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