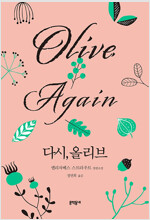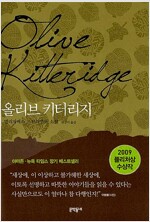목에 스카프를 둘렀다.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는 병원에 가기 싫어서다. 귀 때문에 열심히 병원에 다녔고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여하튼 관리를 하는 건 좋은 일이니까. 어제 아침 일찍 이동할 일정이 있어 새벽에 일어났다. 매월 첫날 새벽 기도를 나가지 않은 후 오랜만에 새벽의 공기를 만났다. 하늘에는 손톱 모양의 하현달이 떠 있었고, 어둠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었다. 아침 일찍 도로에는 차가 많았다.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 혼자 생각했다. 일터로 향하는 출근길의 여정일까. 긴 여행의 시작일까.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일까. 움직이지 않던 시간에 나오니 새삼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하구나 느꼈다. 살아가는 사람들, 삶이 이동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고 할까.
신호등의 색이 바뀌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자동차들, 자동차가 멈추면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도로에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이들의 모습도 보았다. 보도블록에 눈처럼 내린 낙엽들, 가을이 지고 있다는 게 보였다. 아직 장갑을 끼고 거든 이들은 많지 않았지만 조만간 장갑과 모자를 쓴 이들의 모습이 보일 것이다. 우리는 또 어린아이처럼 첫눈을 기다릴 테고. 시절은 잘도 간다.
고백하자면 나는 11월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건 아니다. 다만 좋은 기억이 나쁜 기억으로 변화하는 순간들이 11월에 모여있다. 그러다 몇 년 전 나는 11월에 대한 마음이 참 어리석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에 대한 이유를 찾고 있었던 거다. 분명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 인생 최악의 순간의 하나가 그 순간이었고 그게 11월이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처럼 그 기억(나의 기억력을 저주한다)은 선명하지만 11월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누그러졌다. 다시 좋은 기억을 쌓은 순간도 11월의 어느 날이고. 11월은 그냥 11월이니까. 이렇게 자꾸 나를 달래야 나는 점점 더 괜찮아진다는 걸 안다.
주위는 온통 단풍의 물결이다. 가로수로 심은 은행나무, 아파트를 둘러싼 나무들, 조만간 나뭇잎을 떨구고 추위를 맞을 것이다. 찬 바람을 견디고 단단해질 것이다. 나무처럼 우리도 그럴 것이다. 2020의 가을은, 지난봄과 여름처럼 여전히 잔인하지만. 11월에는 11월을 즐길 수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 11월의 책은 이런 두 권으로도 충분하다.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다시, 올리브』란 제목이 좋다. 다시, 11월. 다시, 가을. 다시, 괜찮다고 다짐하는 날.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의 『올리브 키터리지』를 즐겁게 만났다면 더욱. 한 권의 소설과 한 권의 산문집. 『다정한 매일매일』은 백수린 작가의 첫 산문집이다. 작가정신에서 나온 산문집이라, 살짝 놀랐다. 그냥 반갑다는 말이다. ‘빵과 책을 굽는 마음’이란 부제가 더 좋다. 다시 펼쳐질 11월, 다시 읽는 소설, 다시 들여다본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