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는 장편을 더 많이 읽었다. 그렇다고 지금은 장편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이야긴 아니다.(^^) 이야기가 중간에서 끊어지다만 느낌을 주는 소설집이 그때는 그다지 흥미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데 사람의 취향도 바뀌는 건지 언젠가부터 단편도! 많이 읽게 되었다. 어쩌면 바쁜 생활 탓일 수도 있다. 한번 잡으면 리듬이 끊어지지 않도록 몰입하거나 끝까지 읽어야 하는 장편에 비해 30분에서 한 시간이면 읽고도 남을 단편은 다른 여러 권의 책과 동시에 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 홀릭해서 읽었거나 읽고 있는 소설집, 몇 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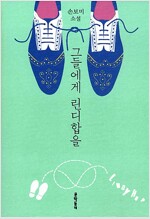
손보미 작가의 소설집이 나온다고 하니 다들 반응이 뜨거웠다. 그녀의 작품을 읽은 것은 문학동네 젊은작가상에 실린 단편 두어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읽었던 단편이 책에도 수록되어 있는 「과학자의 사랑」이다. 읽으면서 굉장히 독특했다고 생각했다. 소설이라기보다는 마치 토요일 오전, TV에 나오는 서프라이즈의 한 코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 낯선 문체, 그것이었다. 그런 까닭에 등단 4년 차인 그녀가 매해 이러저러한 상을 받은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린디합을』엔 모두 9편의 소설이 실려 있다. 매 단편들마다 삶의 파멸(!)을 예감하는 글들이다. 불현듯 삶 속에 들어오는 사건, 사고들. 아이가 죽고(「담요」), 남편은 눈이 먼다(「폭우」), 남편은 한때 연인이었던 대학동기에게 빠지는 듯하고(「여자들의 세상」), 「육인용 식탁」의 부부는 뭔가 불안하다.
다른 작품들도 나름의 독특함을 보여주어 좋았지만 처음과 마지막 단편이 눈을 끌었다. 이 소설집엔 「담요」가 제일 처음, 「애드벌룬」이 맨 마지막에 실렸는데 두 단편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애드벌룬」은 「담요」의 이야기를 다시 쓴 내용이다. 죽었던 아이가 사실은 죽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죽고난 후 삶의 나아진 것일까? 다들 그렇게 말하지 않던가, 그때 만약 그 아이가 살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는 아마도 그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내 연애의 모든 것』을 읽고 다시 만난 이응준 작가의 『밤의 첼로』 다른 것보다 연작이라는 것과 연애 이야기라는 것에 끌렸다. 『내 연애의 모든 것』이 워낙 재미있었기 때문에 연애를 다룬 단편들이라면 역시 흥미로울 거라는 기대. 그 기대는 맞았다. 재미보다는 글을 읽는 맛이 났다. 전작의 장편에서 보았던 발랄함이 아니라 슬픈 사랑임에도. 한편씩 소설을 읽다 보면 같이 가라앉고 있는 나를 본다. 그래서 철저하게 밤에 읽었다.
6편의 단편이 들어 있는 『밤의 첼로』는 한 편, 한 편 다른 내용인 듯하지만 천천히 읽다 보면 서로 스치듯 지나는 우연들을 만날 수 있다. 이걸 알아보는 것이 이 소설집의 백미. 처음엔 나도 잘 몰랐다. 천천히 읽기보다는 읽어내기 바빴으니까. 한데 우연히 발견한 '버드나무 군락지' 라는 단어 땜에 찾아보았더니 그렇다는 것이다. 어쩐지, 연작이라고 했는데 왜 서로 연관성이 없는 걸까? 했다. 그걸 알고 나니 소설들이 더 흥미롭기 시작했다. 혹시 읽을 예정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알고 읽었으면 좋겠다. 슬픈 내용이지만 깨알 같은 재미, 느낄 수 있다.

처음엔 한 편만 읽을 생각이었다. 단편 중에 가장 눈을 끄는 제목으로. 「슬픔에 대하여」를 읽고 나니 온통 밑줄이었고, 도대체 이 슬픔이 어디에서 왔는지 확인하고 싶어 그 자리에서 다 읽고 말았다. 이런 소설, 그동안 못 만났는데 쓰시마 유코의 『묵시』가 오랜만에 나를 몰입하게 만들었다.
신경숙 작가와 서간을 주고받던 때, 신경숙 작가의 제안으로 쓰시마 유코가 자신의 작품에서 직접 엄선한 7편의 작품을 실은 소설집이다. 아니, 소설집이라고는 하지만 쓰시마 유코의 삶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다. 한 편, 한 편 마치 쓰시마 유코의 독백처럼 들렸으니까. 어쩌면 의도적으로 고른 것일지도 모르겠다.
자신이 태어나 한 살도 되기 전 다른 여자와 동반자살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 홀로 된 엄마와 살면서 겪은 오빠의 죽음, 이후 남편 없이 키우던 어린 아들을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떠나보낸 자신의 삶을, 소설 속 주인공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니까.
읽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지만 십 년 이라는 시간이 공존하는 단편들을 보며 그녀가 작가였기에 그 '운명'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했다. 기억에 남는 작가의 말.
“아주 큰 가지가 떨어져나갔는데도 제 삶의 시간은 계속되었습니다. 어째서 중단되지 않는가. 그 물음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이겠지요. 소설을 쓰는 일과 읽는 일 모두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 묻는 행위일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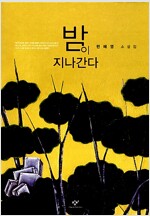
편혜영 작가의 네 번째 소설집이 나왔다. 『밤이 지나간다』언제 읽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샀다. 첫 단편을 읽었다. 어두웠다. 편혜영은 이 맛이지.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소설집은 좀 다르단다. 고독한 현대인의 불안한 삶을 보여주며 결국은 삶의 파멸로 이끌었던 작품들에 희망을 넣었단다. 그래서 어둡지만은 않고 밝은 면도 볼 수 있다고.
모두 8편이 들어 있는 『밤이 지나간다』는 읽어본 작품이 서너 편이다. 하지만 읽기 전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도 읽으면서 짧은 기시감을 느끼겠지. 그러고선 아, 이 작품은 그때 읽었던 거로구나. 기억할 것이다. 출판사 책소개에서 한 단락,
"고독은 삶의 상수고 이 세계는 편혜영이 그려온 것처럼 어둡고 비참하며 부조리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파국을 생의 기초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몸짓은 그저 소중할 수밖에 없다. 편혜영은 이제 그 작은 움직임들을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하는 게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밤이 지나간다』가 품고 있는 파국, 그리고 그 안에서 싹트는 삶의 의지는 깊이 음미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