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빗소리
_윤성택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다는 건 그때 내가

오늘 내리는 이 빗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
우산 없이 걸었던 수많은 장면이
환등기 안처럼 환해지고
그 빗소리에 음(音)이 흐른다
그곳에 있어서 생은 비릿하다
습관에 빗소리를 오버랩시킨다는 것은
빗속 너머 시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로 나를 지나게 하는 것이다 빗소리는
빗방울의 부서짐이라기보다는
흩어지면서 이루는 하나의 공명이다
무언가 채워져 있는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통로
그 안에는 반복되는 리듬이 들어 있다
빗소리가 음유에까지 읽히면, 비는
기온과 풍경에 따라 톤을 달리하면서
제자리를 찾아 시간을 열어간다
떠올리는 사물, 그때의 습기까지 조용히 복원해낸다
생각이 생각 위에 떨어져
마음에 왕관 같은 문양이 이는 것이다
구름의 전원을 사용하여 누군가의 순간을 재생한다
거기에는 조용히 머리를 기대고 있는
창문과, 문득 잠에서 깬 의식이 수록되어 있다
봄비
_함민복

양철지붕이 소리 내어 읽는다
씨앗은 약속
씨앗 같은 약속 참 많았구나
그리운 사람
내리는 봄비
물끄러미 바라보던 개가
가죽 비틀어 빗방울을 턴다
마른 풀잎 이제 마음 놓고 썩게
풀씨들은 단단해졌다
봄비야
택시! 하고 너를 먼저 부른 씨앗 누구냐
꽃 피는 것 보면 알지
그리운 얼굴 먼저 떠오르지

비를 맞는 저녁
_이승희
당신의 살냄새 같은 앵두꽃을 데려가는 바람의 뒤에 서서 나는 비가 오길 기다린다. 한때 그것은 내 몸을 살다 간 구름의 입자들. 불의 이마를 닮은 짐승처럼 바람이 불어 간 방향으로 떠나갈 것들. 빗방울이 맨살에 떨어진다. 스미듯 집의 불빛이 꺼졌다, 앵두꽃이 진 자리마다 물고기들이 꼬리를 감추며 나무 속으로 사라졌다. 허기가 들끓는 지상에서 상처 난 짐승들이 제 눈을 파내려는 듯 자주 울었고, 핏물이 배어나오는 그리움으로 버텼다는 기별. 다시 앵두꽃은 피겠지. 바람이 솜털을 부드럽게 누이며 말했다. 몸속에 새겨넣은 지도 한 장이 낡아가는 저녁 당신은 피 묻은 바닥을 닦아내며 물처럼 그렁거렸지. 항상 구석의 풍경이었던 시간들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며 구석을 지워낼 때 바람의 지워진 문장을 읽어주던 당신. 그 문장 속에서 꽃들의 한생이 다시 시작되고 내 몸이 기억하는 빗방울의 무늬 속으로 걸어가는 저녁이었다.
우산의 반대말
_유희경

고이면 좋겠어
잠든 도시의 가슴팍에
의심이란 거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흔적
이렇게 끝내주는 소리는
천년 전의 것
용서하라 모든 이빨을
비가 내일을 잡아 뜯고
눈썹을 파르르 떨어
써놓은 문자를 내놓는다
쏟아져 내리는, 입말
놀라는 눈과 감기는 물
비가 내리는 만큼
입을 다문 사람
그게 아니더라도
이런 날씨 앞에서는
누구나 넓고 너무 투명하다
떠오른다 침묵하지 않는,
하고 싶은 말 지우고,
젖어간다 모서리부터
비 내리는 밤
_도종환
빗방울은 창에 와 흐득이고
마음은 찬 허공에 흐득이다
바위 벼랑에 숨어서
젖은 몸으로 홀로 앓는 물새마냥
이레가 멀다 하고
잔병으로 눕는 날이 잦아진다
별마저 모조리 씻겨내려가고 없는 밤
천 리 만 길 먼 길에 있다가
한 뼘 가까이 내려오기도 하는 저승을
빗발이 가득 메운다
한낮의 먹구름
_김수복
악견산을 넘어가다
유방산에 닿았네

슬슬 몸속 뼈가 스멀거리기 시작했네
피라미떼가 제 미색에 빠져
개울 물살을 즐기듯이
격정도 뭉게구름이 되어 불어나는 한낮
섬섬옥수로 산정에서 스윽슥,
한평생 살다가
햇살 넘치는 계곡 사이로
소낙비 되어 쏟아졌네
마른 옥수숫대 서걱이는
비탈밭에 내리꽂혔네
폭우
_김시라
곡비(哭婢)처럼 서럽게 우는 비를 버릴 수 없는
조그만 섬처럼
거친 등을 지니고 잔뜩 웅크린 사람들이
용산역에서 하릴없이
계단 밑을 파고드는 시절을 지나고 있다
멀리 따듯한 손을 놓고 온
깍지 낀 손이
갈래갈래 낯선 길처럼 갈라져 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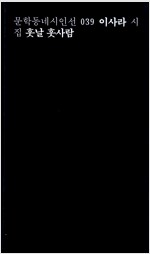
그사이로 철로가 선명하다
하중을 견디는 침목 따라 살아온 이들이 아는 밤들
무수히 비가 쏟아지고
가슴팍으로 물이 고이다가 넘치고
옹이처럼 마디마디가 슬픈 관절이 된다
이 비 개면
무지개 뜨는 행운은 다시 비껴가고
두 눈에 보이는 낡은 것들은 더 낡아가고
두 눈을 벗어나며
날아오른 것들은 더 높게 날아오르겠지
한참을 울던 사람들에게는
등뒤에서 언제나 감당 못할 비가 온다
떠나면 되는 일처럼 그렇게 날들은 가고
한때를 푹 적셔본 사람은
잠결에도 비가 온다
비가 내리니까, 기분이 가라앉는다.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책을 읽는 게 제일 좋겠다. 책 중에서도 시집. 시집 중에서 시가 나오는 풍경들만 골라서. 지금 현재 내 책상에 있는 시집 중에서 골랐다, 집에 가면 더 좋은 시들이 많을 텐데, 안타깝다. 그래도 이 정도의 시를 고른 것은 어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