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석남 시인보다는 언젠가부터 장석남 아저씨(!)라고 부르게 된,
그래서 그가 시인인 줄 몰랐던? 암튼 2010년에 나온 시집, 《뺨에 서쪽을빛내다》 을 시작으로
장석남 아저씨의 시를 읽게 되었으니 이젠 아저씨가 아니라 장석남 시인이라고나 할까;

새 시집이 나왔다.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저 핑크 어쩔거야! 사진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
원래는 아주 옅은 인디언 핑크다. 저 사진의 핑크보다는 훨씬 예쁘다.
새 시집 소식 듣자마자 주문. 간만에 시집을 샀다. 좋다.
근데 저 판형과 글자와 종이는 아직도 낯설다. 새로운 것 좋아하는 사람인데 참, 적응이 안 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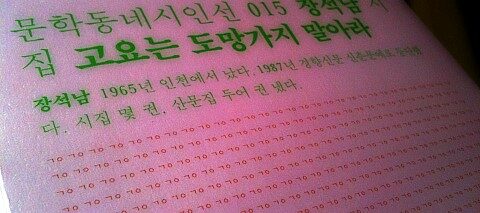
찍는 위치에 따라 색이 다 다르군(-.-) 이건 그래도 조금 비슷한 색, 이보다 더 옅음;
시인의 소개가 매우 짧은 뒷표지. 근데 저 'ㄱㅇ'은 뭔 뜻이지??
장석남 시인 시집 꽤 많이 냈다. 산문집은 두어 권밖에 안 되나? 추천시들 엮은 책도 있던데..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제목이 나오는 시는 〈저물녘_모과의 일〉이다.
저물면 아무도 없는 데로 가자
가도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
고요의 눈망울 속에 묻어둔
보석의 살들 ㅡ 이마 눈 코
깨물던 어깨,
점이 번진 젖, 따뜻한 꽃까지 다 어루어서
잠시 골라 앉은 바윗돌아 좀 무겁느냐?
그렇게 청매빛으로다가 저문다
결국 모과는 상해버렸다
아우, 시 좋다! 뭘 아는 것도 없으면서 괜히 좋다!^^;

시인의 말,
"마침 몸살이 와서 발은 만져보니 차디찬데 이마는 뜨겁다.
(…)
뭐니 뭐니 해도 내 생에서 시경(詩境)으로 출타한 것이 인생의 큰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뭉뚱그려
제쳐 놓는다. 하, 그게 스물다섯 해가 되었다니! 뭐 밥그릇 수를 밝혀서 미담 제조 하려는 말은 추호도 없으나
그간 건너온 징검돌들의 면모가 떠오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다.
(…)
다 몸뚱어리 쑥떡거리는 내용들이다.
나는 아직 어는 경계 안으로도 들어서지 못했다.
하긴, 출타는 들어서는 게 아니니까.
다행이다. 아프다.
(…)
그의 이번 시집은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유독 '물'이 많다.
왜 '물'이 눈에 들어왔는지 모르겠으나 이전에 그가 낸 산문집의 제목들 때문인가?
그걸 의식해서인지 그냥 괜히
어, 바다도 물, 꽁꽁 언 호수도 물, 눈도 녹으면 물, 폭우, 흙탕물, 장마,
먹던 물, 밥물, 한 모금 넘긴 술, 울음, 우물 등등(아, 그만해야겠다, 괜한 엉뚱소리 ㅋ)
암튼, 나도 갖다붙이긴 잘한다마는;;;
순전히 첫 시로 등장하는 〈의미심장(意味深長)〉이라는 시 때문!
돌 위에도 물을 부으면
그대로 의미심장
내게 온 소용돌이들이
코스모스로 피어 흔들리는
병후(炳後) 문밖에
말뚝이 서넛 와 있다
오늘 밤 내 머리맡에는
티눈 같은 웃음들이 모일 것 같다
길 잃은 웃음들이, 막차 놓친 웃음들이
갈데없이 모일 것 같다
찔레 넝쿨도 바람 불면
그대로 의미심장
이 시를 따라 한다면
'물'이라고 우기는 것도 '그대로 의미심장'한 것이라고^^;;;

시들 훑어보다가 반가운 이름 발견. 김도연 작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 아니, 두 번 봤던가? 암튼, 괜히 반가운^^(의미심장)
시인들은 동료 작가나 시인들에게 오마주 형식으로 시를 잘 쓰는 것 같아.
지난번에 읽은 강정 시인의 시에도 동료를 위한 시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은데...
암튼, 핑크 표지를 보니(움 장석남 시인과는 전혀 안 어울리듯 하지만 시들은 잘 어울린다)
봄이 오려나 보다, 봄인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든다.
《고요는 도망가지 말아라》시집 들고 봄바람 한번 나도 좋겠다.
한동안 이 좋은 시들과 즐거울 시간들!!!
바람과 더불어
ㅡ하나
동구 귀퉁이에 이빨이 빠져 물러난 접시 하나
접시 속에 다급한 사랑으로 괴어 있는데
나무라지 않고
달 지네
달 지는 언덕
드렁칡 위에
달리아 꽃 절창이네
관광버스에서 울긋불긋 내리는 가을
노을 속에서
붉게 짖는 사과들
이빨 빠져 물러난 접시 속에
다급한 사랑으로 괴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