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을 앞두고 있어 일요일에 배송된 책, 김경주의 산문집 <밀어>
산문집이 왜 이케 비싼거야, 구매를 하면서도 투덜거렸는데 책을 받고 보니
그 투덜거림이 싹~ 사라지고 말았다.

양장에 꽤나 있어(!) 보이는 책, 왠지 소장해야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책을 펼쳤다.
강정 시인의 발문, 도 좋다.
"아픈 자는 떠난 사랑의 실체를 뒤늦게 깨닫듯, 상실과 파괴의 뒤끝에서 전력을 다해
자신의 몸을(다시!) 사랑하게 되는 자이다. 아픈 자는, 그리하여 몸의 어둠을
통찰하는 자는, 우주를 판독하는 눈을 하나 더 갖게 된다.
김경주는 그런 걸 '시차時差'라 일컫는다. <밀어>는 인간의 몸속에 억겁으로 뒤엉킨
'시차의 눈을 달래'며 엄혹하고도 정밀하게 써내려간 육체의 서사시다.
그는 어디가 그토록 아팠던 걸까."
"시는 육체의 극점에서 한 개인의 기억, 그리고 세계의 기원 또 그리고 우주의 도상들을
한데 엮어 공명하는 언어 바깥의 신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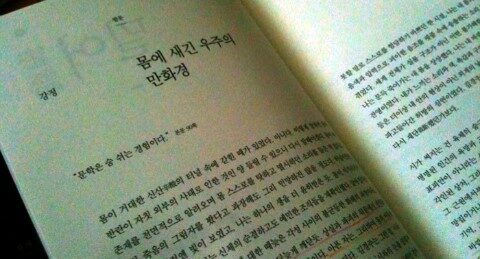
시안(詩眼)이라는 말을 이정록 시인이 말했다고 하는데
시인이 바라보는 우주, 육체.
시인의 눈은 아무래도 다른 평범한 사람들과는 다른 눈을 가진 듯하다.
계속해서 강정 시인의 발문,
"정말 당신이 외롭고 아프고 고독하다면 오래전 일기장을 들추듯 당신의 몸을 가만히 들여다보라.
마음이 미처 판독하지 못했던 세계의 숨은 질서를 몸이 알아서 대필해줄지 모른다.
당신이 가장 그리워하는 건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의 광활한 육페일 뿐이다."
먼저, 내가 가장 궁금해했던 몸의 일부분 _귓불에 대한 글을 읽었다,
내가 귓불을 좋아하는 건 부드러움이다. 김경주는
"사람은 상대가 좋아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귀를 만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난 그저 단순했다. 상대의 귓불(물론 아무의 귓불을 만지지는 않는다)을 만지면 기분이 좋다.
내 마음이 그곳을 통해 상대에게 전해지기라도 하듯, 미소가 저절로 지어진다.
"만지면 서러워지는 귓불을 만져보는 습관은 혼자 사는 사람의 쓸쓸한 기상을 남기기도 한다.
슬퍼질 땐 차라리 나 홀로 눈을 감고 싶어지고, 슬퍼질 때 차라리 가장 먼저 귓불을 만져보는
귓불의 서러운 기상들을 자신의 시라고 불러주고 싶은 위장胃腸이 있다."
그리고 눈망울,
내가 외꺼풀이어서인지 쌍꺼풀진 눈을 좋아하진 않는다. 특히 남자의 쌍꺼풀.
한데 기억에 남는 눈이 있다. 그 쌍꺼풀 속에 들어있던 젖은 눈망울.
"눈망울은 몸 안의 천문대天文臺이다. 눈망울은 몸이 운행하는 천문대의 비밀이다.
시차를 갖기 위해 태어난 언어의 비밀들은 우리가 사는 동안 눈망울 안에서 희미한 곡예를 한다.
'당신의 몸으로 들어간 내 눈이 어지러워......' 사랑을 고백해야 할 때 이런 표현은 적확하다.
사람이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눈망울은 운행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 속에서 색을
희미하게 바꾸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눈을 바꿀 때
눈망울은 가장 먼저 목이 마르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은 편집이었다. 독특했다.
아랫부분 1/3을 여백으로 두는 편집은 고급스러워보인다. 물론 그곳은 각주가 들어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여백이다. 철학을 전공한 시인답게 글이 쉽지는 않지만
그 여백으로 인해 글을 대하는 마음이 편안했다.
그곳에 나도 뭔가를 적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비슷한 편집으로 떠오르는 책이 있는데
다니자키 준이치로의 <그늘에 대하여>이다. 왠지 소장하고 싶은 맘을 갖게 한다.
그리고 사진,
몸에 관한 시적 몽상이랬다. 두 군데에 걸쳐 모아놓은 흑백의 여성 몸 사진은 '아름답다!!!'
<가만히 거닐다>라는 여행책을 펴냈던 전소연의 사진이다.
사진을 보면서 같은 여자로서 충동을 느꼈다. 외설이 아닌 예술. 찍혀보고 싶은(하핫-.-;)


한꺼번에 다 읽어버리면 재미가 없을 것 같다.
한 부분씩, 내가 맘에 들어하는 몸의 차례를 작성하여 좋아하는 부분부터 하나씩
음미하며 천천히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멋지다.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