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에 출판편집자코스를 다닌 적이 있다. 책을 좋아하긴 했어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책하고 관련된 공부를 배우리라곤 상상조차 한 일이 없던 때였다. 스스로도 어리둥절하면서 다녔다. 한번도 출판 관련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 아니, 구경조차도 하지 않았으니 배우는 과정 내내 열심히 헤맨 기억 또한 난다. 겨우 참고로 읽을 만한 책은 <편집자 분투기>가 다였고 나머지 추천해주는 책도 일본 책들이었다. 아무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 나처럼 뜬금없이 편집자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다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배웠겠지만 혼자 독학을 해야 하는 나에겐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럴 때 이런 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 책이 나온 것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부터 했다. 휴머니스트의 김학원 대표가 낸 이 책은 부제처럼 책 만드는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책이다. 편집과정을 이수했으나 편집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사실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목차를 보니 살짝 호기심이 도졌다. 그래,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책을 받고 일단 훑어보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실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편집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특히 베테랑 편집자들은 콧방귀를 뀔 수도 있고. 하지만 나처럼 왕초보들은 우와! 이 책 한 권만 마스터하면 책 한 권 낼 수 있겠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으로 대책없이 긍정적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책이 오늘 내 손으로 들어왔다. 관심이 가는 책이었기에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 간절!
몇 년 전에 출판편집자코스를 다닌 적이 있다. 책을 좋아하긴 했어도 다른 일을 하고 있었으므로 책하고 관련된 공부를 배우리라곤 상상조차 한 일이 없던 때였다. 스스로도 어리둥절하면서 다녔다. 한번도 출판 관련 일을 해보지 않았으니 아니, 구경조차도 하지 않았으니 배우는 과정 내내 열심히 헤맨 기억 또한 난다. 겨우 참고로 읽을 만한 책은 <편집자 분투기>가 다였고 나머지 추천해주는 책도 일본 책들이었다. 아무리 일본과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상황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는 없었다. 나처럼 뜬금없이 편집자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기에 다들 나름대로 이해를 하면서 배웠겠지만 혼자 독학을 해야 하는 나에겐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럴 때 이런 책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 책이 나온 것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부터 했다. 휴머니스트의 김학원 대표가 낸 이 책은 부제처럼 책 만드는 사람의 거의 모든 것이 들어 있는 책이다. 편집과정을 이수했으나 편집하고는 다른 일을 하고 있는 터라 사실 구입할 생각이 없었는데 목차를 보니 살짝 호기심이 도졌다. 그래, 언젠가는 필요하게 될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기도 하다. 책을 받고 일단 훑어보니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이 되어 있다. 이게 과연 실전에서 일을 하고 있는 편집자들에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특히 베테랑 편집자들은 콧방귀를 뀔 수도 있고. 하지만 나처럼 왕초보들은 우와! 이 책 한 권만 마스터하면 책 한 권 낼 수 있겠다!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참으로 대책없이 긍정적 반응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책이 오늘 내 손으로 들어왔다. 관심이 가는 책이었기에 빨리 읽어보고 싶은 마음 간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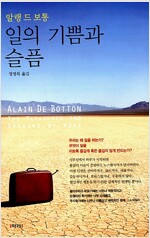 보통의 책이 드디어 도착했다. 읽은 책은 별로 없으면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사고보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알랭 드 보통, 그가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을 한단다. 책을 펼쳐보니 막, 읽어보고 싶어 읽어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헤엄치고 다닌다. 표지도 맘에 들고 본문 속의 사진들도 마음에 든다. 이젠 문체와 글이 내 맘에 들면 성공작이다. 아직은 그의 소설밖에 읽은 책이 없어 에세이 형식의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내게 와서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디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다. 문득 든 생각은 이런 거다.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들은 감성적인(!) 면이 없다. 물론 그의 소설도 읽어보면 좀 그런 편이다. 근데도 그의 문체는 마음을 울릴 때가 있다. 밑줄을 그어야 할 문장들이 많고 공감가는 글들이 많다. 또 그의 책제목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이다. 옮긴이가 말을 했듯이 '기쁨과 슬픔'이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제일 적절한 것이다. 근데 '일'이란 지극히 인문사회적(?)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지은 것. 물론 옮긴이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겠지만 말이다. 그의 작품 <여행의 기술>도 그렇다. '여행'과 '기술'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묘한 느낌을 준다. 해서 김연수 작가의 <여행할 권리>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안 어울릴 듯하면서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도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란 제목이 떠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거나말거나, 완전 기대를 하는 작품 중에 하나되겠다.
보통의 책이 드디어 도착했다. 읽은 책은 별로 없으면서 책이 나오면 무조건적으로 사고보는 작가 중에 한 사람인 알랭 드 보통, 그가 일의 기쁨과 슬픔에 대해 말을 한단다. 책을 펼쳐보니 막, 읽어보고 싶어 읽어보고 싶어,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헤엄치고 다닌다. 표지도 맘에 들고 본문 속의 사진들도 마음에 든다. 이젠 문체와 글이 내 맘에 들면 성공작이다. 아직은 그의 소설밖에 읽은 책이 없어 에세이 형식의 이 글이 어떤 식으로 내게 와서 반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부디 마음에 들기를 바라고 있다. 문득 든 생각은 이런 거다. 알랭 드 보통의 에세이들은 감성적인(!) 면이 없다. 물론 그의 소설도 읽어보면 좀 그런 편이다. 근데도 그의 문체는 마음을 울릴 때가 있다. 밑줄을 그어야 할 문장들이 많고 공감가는 글들이 많다. 또 그의 책제목을 보면 굉장히 인문학적이다. 옮긴이가 말을 했듯이 '기쁨과 슬픔'이란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만났을 때 제일 적절한 것이다. 근데 '일'이란 지극히 인문사회적(?) 단어를 사용하여 제목을 지은 것. 물론 옮긴이의 생각이 들어간 것이겠지만 말이다. 그의 작품 <여행의 기술>도 그렇다. '여행'과 '기술'이라는 단어가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묘한 느낌을 준다. 해서 김연수 작가의 <여행할 권리>를 처음 봤을 때는 뭔가 안 어울릴 듯하면서 잘 어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던 것 도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의 기술>이란 제목이 떠오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렇거나말거나, 완전 기대를 하는 작품 중에 하나되겠다.
 지난 번에 <순례자의 책>이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소설 중 한 이야기가 바로 '사람 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 이야길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사람을 빌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고 그런 이야길 쓰게 된 동기도 나오지만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다. 그런던 차에 이 책에 관한 이야길 어렴풋이 들었다. <순례자의 책>에 나오던 '살아 있는 도서관'이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난 주 책이 도착했다. 책을 훑어보니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다. 이 책은 진짜 '사람 책'이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을 없애 줄 책(사람)인 셈이다. 내가 만나볼 수 없었던 편견 저 너머의 사람들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다. 책이나 신문 사설에서나 접하든 사람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그들을 대출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얻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 책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은 편견을 가지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동성애자, 싱글맘, 우울증 환자, 아주 심한 채식주의자 등등.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를 읽다보면 공감이 가면서 이해하게 된다. 살아 있는 도서관, 사람 책을 빌리는 도서관, 꽤 흥미롭다!! 또 문득 떠오른 생각!! 남의 이야기 잘 들어준다고 소문난 나는, 그곳에 가면 빌려야 할 책이 무진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편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한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만큼의 황홀함이다."이란 편집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
지난 번에 <순례자의 책>이란 소설을 읽은 적이 있다. 그 소설 중 한 이야기가 바로 '사람 책'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때는 그 이야길 읽으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사람을 빌리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뒷부분에 설명이 나오고 그런 이야길 쓰게 된 동기도 나오지만 자세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던 거다. 그런던 차에 이 책에 관한 이야길 어렴풋이 들었다. <순례자의 책>에 나오던 '살아 있는 도서관'이 떠오른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지난 주 책이 도착했다. 책을 훑어보니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완전하게 이해가 되었다. 이 책은 진짜 '사람 책'이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편견을 없애 줄 책(사람)인 셈이다. 내가 만나볼 수 없었던 편견 저 너머의 사람들을 빌릴 수 있다는 것은 아주 매력적이다. 책이나 신문 사설에서나 접하든 사람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가졌던 편견들을 그들을 대출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 우리가 몰랐던 지식을 얻듯이 그렇게.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 책들은 우리가 평소에 많은 편견을 가지는 부류의 사람들이다. 동성애자, 싱글맘, 우울증 환자, 아주 심한 채식주의자 등등. 그들이 그렇게 살게 된 이야기를 읽다보면 공감이 가면서 이해하게 된다. 살아 있는 도서관, 사람 책을 빌리는 도서관, 꽤 흥미롭다!! 또 문득 떠오른 생각!! 남의 이야기 잘 들어준다고 소문난 나는, 그곳에 가면 빌려야 할 책이 무진장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편견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줌으로써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도 있을 테니 말이다. "한 사람의 속 깊은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몇 권의 책을 읽는 것만큼의 황홀함이다."이란 편집자의 말이 마음에 와 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