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란 쿤데라 파헤치기 <소설의 기술 - 밀란 쿤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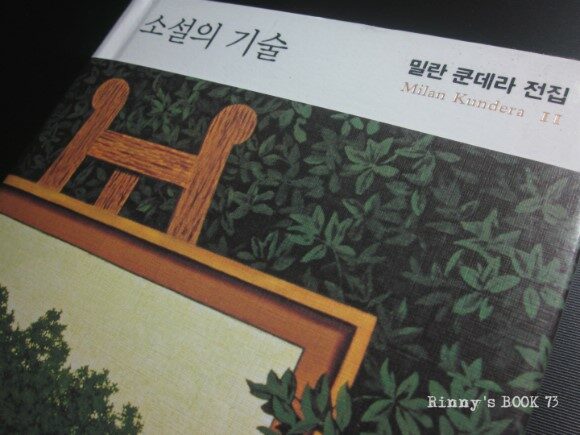

소설의 기술이라는 제목과 작가인 밀란 쿤데라를 매치해보았을 때 떠올랐던 것은 이 책이 그가 소설을 어떻게 구성해나가는지, 즉 어떻게 써야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다 . 하지만 이 에세이는 어떻게 쓰는가보다도 어떻게 읽어야하는가에 초점을 깊숙이 맞추고 있는 듯 보인다. 아마도 이런 착각에 있어서는 제목의 '기술'이란 단어에 내가 얽매여 상상의 나래를 펼친것일지도.
<소설의 기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은 문학작품이나 이 시대의 소설들에 대한 그의 견해와 쿤데라의 어시스턴트이자 평론가인 살몽과의 대담, 그리고 소설에 관한 쿤데라의 미학의 열쇠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 속에는 쿤데라 자신의 작품의 언급뿐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의 문학작품들도 줄곧 등장하는데 그것들을 통해 쿤데라가 중시하는 가치에 대해 알 수 있게 해준다. 그가 선호하는 작가들이 뚜렷하게 드러나있으며 카프카, 제임스 조이스, 헤르만 브로흐 이 세 작가에 대해서는 거의 광적일 정도로 몰두해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이 책 속에는 헤르만 브로흐의 <몽유병자들>에 대한 단상의 챕터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책의 후반부에는 쿤데라 마니아라면 그의 소설을 다시금 하나씩 떠올려 행복을 맛볼 정도로 중요한 그의 키워드가 나열되어있다. 가벼움, 소설, 소설가, 키치, 젊음.. 등.
이 책을 읽으면서 아직 쿤데라의 문학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나는 책에서 다뤄지는 작품들을 읽지 못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사전지식이 없는데도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다. 단지 많지 않았을뿐.... ^^; 만약 그의 작품을 기억속에 진하게 남겨둔 독자라면 그의 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아주 감사한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예술에 있어서 그 작가의 작품에의 언급은 독자들에게는 통쾌한 즐거움이 되는 법이니까.) 책 소개에 의하면 '쿤데라의 소설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이 책을 정의하고 있지만, 나는 이 책이 쿤데라의 소설을 모두 읽고 마지막에 펼쳐볼 '쿤데라 문학의 결정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지식을 먼저 얻길 원하는 독자라면 이 책을 먼저 읽어도 좋겠다.) 그러나 만약 소설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작가의 견해가 궁금하다면, 혹은 밀란 쿤데라의 소설을 더욱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을 읽는 기술'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굳이 상관없을지도 모르겠다.

소설의 정신은 복잡함의 정신이다. 모든 소설은 독자들에게 "사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말한다. 소설의 영원한 진실은 이것이지만, 묻기도 전에 존재하면서 물음 자체를 없애 버리는 단순하고 성급한 대답들의 시끄러움때문에 점점 들리지 않는다. 우리 시대의 정신에서 옳은 것은 안나나 카레리나 중 한 사람 뿐이다. 앎의 어려움과 잡을 수 없는 진실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세르반테스의 원숙한 지혜는 거추장스럽거나 쓸데없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4p)
모든 시대의 모든 소설은 자아의 수수께끼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상상의 존재, 인물을 창조해내는 순간부터 당신은 저절로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에 의해 포착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직면하게 되죠. 소설 자체가 지닌 근본적인 물음 가운데 하나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소설의 역사에서 상이한 경향과 상이한 시대가 구분될 수 있는 것도 이 물음에 대한 상이한 대답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p)
소설의 인물은 살아 있는 존재의 모방이 아니에요. 상상적 존재지요. 실험적 자아고요. 이렇게 하여 소설은 그 시작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돈키호테를 실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는 무척 어렵지요. 그러나 우리 기억에서 그보다 더 생생한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제 말뜻을 잘 이해하세요. 저는 독자와 그들이 지닌 욕망, 즉 소설의 상상적 세계에 실려 간혹 그것을 실제와 혼동하고 싶은, 소박한 만큼이나 정당한 욕망을 비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것에 심리적 리얼리즘의 기법이 필수불가결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54p)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즉 소설의 몸으로 들어오면 성찰의 본질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소설 바깥에서 사람들은 확인의 영역에 있죠.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 확신합니다. 경찰이건 철학자건 수위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소설의 영역에서는 확인하지 않습니다. 놀이와 가설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적 성찰이란 본질적이고 의문적이고 가설적인 겁니다. (116p)
저는 항상 소설을 두가지 차원에서 구성합니다. 첫 번째 차원에서는 소설적 이야기를 구성하죠. 저는 그 위에다 주제를 전개합니다. 주제는 소설적 이야기 속에서, 이야기에 의해 끊임없이 가공됩니다. 소설이 주제를 버리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 만족해 버리면 싱거워지고 맙니다. 반대로 어떤 주제는 이야기 바깥에서 독자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주제의 취급 방식을 저는 일탈이라고 부릅니다. 이 일탈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는 잠깐 동안 소설의 이야기를 포기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 키치에 대한 생각은 모두 일탈이죠. 소설의 이야기를 버리고 주제(키치)를 직접 공략하는 겁니다. (123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