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루지 [klooji]
* 서투른 또는 세련되지 않은 해결책
* 고장 나기 쉬운 애물단지 컴퓨터
'클루지'란 낯선 단어를 제목으로 달고 있는 책을 설명하기 위해선 표지에 적힌 위와 같은 말뜻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더 공정하게 말한다면 '서투르거나 세련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노력한 해결책', '고장 나기 쉽지만 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 컴퓨터' 정도가 적절할듯.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23세의 나이에 MIT에서 스티븐 핀커의 지도 하에 뇌와 인지과학 박사 학위를 땄다는(...) 저자 개리 마커스의 주장에 따르면 '클루지'한 것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 단적인 예로, 수많은 사람들이 요통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한 개의 척추가 몸의 무게를 지탱하기 때문인데, 이것이 바로 네발에서 직립을 하게 되면서 선택된 진화의 '임시변통(클루지)'이라는 것이다. 충분히 공감 되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저자는 우리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의 마음 역시 '클루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써의 합리적 이성 따위는, 말그대로 믿음에 불과하다는 뜻. 저자는 기억, 신념, 선택, 언어, 행복 등 인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역들을 탐구하며 그처럼 도발적인 주장을 증명해 낸다.
물론 이것은 '인간이라는 종'에 대한 비판은 아니며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 진정으로 멋진 일들은 '클루지'에서 시작하기도 하니까.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 위기상황에서 멋지게 탈출하는 맥가이버처럼!) 제목, 표지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즐겁고 유쾌하면서도 새로운 통찰이 가득한 멋진 책이다.
"나는 개리 마커스의 놀라운 업적 덕분에 인간의 정신 활동을 가능하게 한 생물학적 토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다." - 노암 촘스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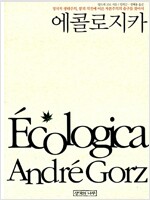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은 '민족'이라는 '만들어진 전통'을 탐구하는 책이다. 민족 정체성이란 '원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풍경이나 음식을 먹는 습관에서부터 관광, 영화, 음악에 이르기까지" 우리 일상과 대중문화를 통해 표현되며 그렇게 강화된 그것은 다시 우리에게 학습, 내면화 된다는 것. 하여 민족 정체성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또한 세계화를 통해 소멸되지도 않는다. 우리가 그 어느 '민족'보다 '민족'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 '민족'임을 감안하면, 재미를 넘어 '필요'한 책이라 하겠다.
앙드레 고르는 우리에게 아내와의 동반 자살이라는 '스캔들'과 <D에게 쓰는 편지>라는 책을 통해 알려진 이름이다. 하지만 '사상가이자 언론인'이라는 이력으로 볼 때, 그의 '전공'에 관련된 책으로는 <에콜로지카> 첫 책이라고 해야하겠다. "정치적 생태주의, 붕괴 직전에 이른 자본주의의 출구를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보이는 문제 의식을 담은 7개의 글을 가려 담은 고르 입문서. (고르의 <프롤레타리아여 안녕!>이 내년 초에 출간될 예정이라고)
<맥마피아>는 출판평론가 조성일 선생의 말에 의하면 올 4월 출간 되었던 <나쁜 기업>과 짝을 이루는 책이다. "합법적인 기업들의 양지에서의 악행을 그린 책이 <나쁜기업>이라면, 음지의 기업(=마피아)들의 악행을 그린 책이 바로 <맥마피아>"라는 것. 꽤나 적절한 설명이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자유화 되며 지하경제 또한 급성장, 전세계 GDP의 약 20퍼센트가 정부의 묵인하에 '그들'의 손안에 있다는 저자의 고발은 꽤나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맥'도날드 이상이다) 자극적일 수도 있는 책의 내용이 단순한 '선정주의'에 그치지 않는 것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300여 명의 갱스터들을 인터뷰하며 '목숨을 걸고' 책을 쓴 저자의 노력 덕분. 파이낸셜 타임스, 골드만삭스 2008년 올해의 비즈니스 북으로 선정 되기도.
"뛰어난 탐구정신을 보여주는 이 매력적인 이야기 속에서 글레니는 발칸 반도를 분석했던 그 정열로 범죄의 세계를 파헤치고 있다. 그는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운영하는 국제 범죄조직을 해부하고, 지하 범죄 세계가 글로벌리제이션으로부터 이득을 보고 또 그것에 기여하는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 조지프 스티글리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일찍이 발자크는 말했다. "커다란 재산 뒤에는 커다란 범죄가 있다." 미샤 글레니는 우리 현대인들을 위하여 이 잠언의 타당성을 새롭게 조명했다." - 크리스토퍼 히친스 (<신은 위대하지 않다>의 저자)




지난 5월에 출간 되었던 <벨 훅스, 계급에 대해 말하지 않기>에 이어 <벨 훅스, 경계 넘기를 가르치기>가 출간 되었다. 전자가 "미국의 흑인 페미니스트 사상가이자, 젠더·인종·계급·문화의 정치학에 관한 다수의 비평서를 집필한 문화비평가, 교육가, 영문학자"(알라딘 저자소개 중)인 벨훅스의 '문화비평가'로서의 저작이라면, 제목에서도 드러나듯 이번 책은 '교육가'로서의 책이라고 하겠다.
기존 제도권 교육을 혁신하고 좀 더 능동적이고 자유로운 교육을 고민하는 벨 훅스는 그 방법으로서 '흥excitement'을 제시한다. 흥은 경계를 넘어가자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교육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요즘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점이 많은 책이다.
<체 게바라 파울르 프레이리 혁명의 교육학> 역시 교육에 관련된 책이지만 조금 낯설다. '체 게바라'와 '교육학'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탓이다. 하지만 피터 맥라렌은 그들이 공유한 신념을 주목한다. 인간은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공부를 통해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신념이 '교육학'과 연결되는 것이다. 책은 그들의 삶을 통해 그 신념을 풀어내며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짚는다. (개인적으로는 차고 넘치는 '교육 혁명'이 아니라, '혁명의 교육학'이라는 제목이 좋다)
사실 <공산당 선언>에 대해 첨언할 것은 별로 없다. 강유원 번역이라는 것 외엔. 다만 알라딘 DB에 11월 7일에 등록되어 현재는 절판이라고 표기된 정가 9000원의 책과, 11월 24일에 등록되어 판매중인 정가 8000원의 책이 함께 있는 이유는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전자에는 '홉스봄, 1998년 Modern Edition 서문'이 있고 후자에는 없다. 1천원의 가격은 딱 그 페이지 수 만큼이다. (저작권 문제로 빠지게 되었다고)
<과학이 나를 부른다>는 김연수, 고병권, 정진홍, 김용석, 정영목, 정재승 등 각계의 지식인 30인이 "우리에게 과학이란 무엇인가?"라는 화두에 답한 글을 모은 책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장 과학적인 것이 문학적이다'라는 제목의 김연수 작가의 글을 재미있게 읽었다. 우연이겠지만, 얼마 전에 나온 김훈 선생의 <바다의 기별> 중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온다. 요즘 젊은이들은 세상을 과학적으로 볼 줄 모른다는. 소설도 역시 주변을 '과학적'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그 말에는 적극 공감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과학/정서의 이분법이 떠오르거나 괜한 거부감이 든다면, 이 책을 보시라)
* 원래 오늘은 '표지와 제목이 책에 있어서 갖는 존재적 지위에 대한 고찰'을 쓰려 했으나(…) 다음 기회에 써야 겠네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물론 개인적 취향으로, <클루지> 표지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요;)
* 눈이 잔뜩 온다는 예보가 있던데 과연 아침부터 흐리네요. 눈이 와도, 책들을 싣고 배는 출발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주도 만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