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는 내 책장에서 책을 찾는 일이 버겁다. 전에 살던 집 책장은 책의 위치를 내비게이션처럼 간단하게 추적할 수 있었다. 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다시 그 자리에 꽂으라는 놀이가 있었다면 94%는 성공할 수 있을만큼. 다섯칸이 있는 60cm 폭의 책장이었다. 책장 하나가 더 늘어난 건 1년 만에 일이었고 그 후로는 주체할 수 없는 책들이 쌓였다. 책들은 차례 차례 내게 와 자리를 배정받았다. 그리하여 책의 위치를 기억할 수 있었다. 그후, 지금은 벽 한 면을 책장님이 차지하고 있고 수시로 책정리 기간을 거행하는 터라 책의 위치는 자주 바뀐다. 새로운 책이 도착하면 자리를 찾아주던 일은 옛날 버릇으로나 남았다. 웬만하면 같은 종이 있는 곳에 자리를 찾아주지만 만석일 경우엔 엇비슷한 곳에 임시로 꽂혀있기도 하다. 책장에서 책을 찾는 일이 버거운 이유 중에 하나는 책장을 자주 감상하지 않는 이유도 있다. 내 시선은 노트북, 노트북 너머 창 밖으로 고정됐다. 책장에는 다 읽지 못한 책들도 많다. 위협마저 느낀다. 지난 가을엔 한 칸에 여덟권 정도의 안 읽은 책을 발견하고는 날 잡아 다 읽어버렸다. 이제는 흐뭇하게 쳐다보고 뿌듯해하는 칸이 되버렸다. 올해 내 책장을 많이 차지한 책은 소설, 시, 인문학과 여행기, 회화 교재 순이다. 소설은 거의 외국소설이고 고전 명작들이다. 적어도 이 책들만큼은 어디 꽂혀있는지 다 안다. 책이 도착하면 바로 자리를 배정하지 않고 읽은 후에야 배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다 읽힌 책이 꽂혀있는 책장을 보고 있으면 또다시 전화를 걸어올 것만 같은 어린 시절의 연인들이 떠오른다. 연인들이 전화할 일은 전무하므로 내가 전화를 거는 형태가 될테지만 어쨌거나 다시 읽고 싶은 책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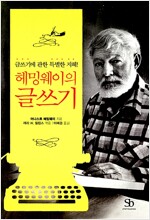
정말 너무하다 싶게 속지 디자인이 최악인
헤밍웨이의 책. 그렇다고 표지디자인이 속지 디자인을
커버해줄 만한 것도 아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표지는 그렇다치고
속지는 그냥 건조하게, 다른 책들처럼 글자만 나열해도
50점은 받았을텐데 과하게 장식하고 테두리 만들어 유치하다.
결국 -500점이 되버렸다.
디자인은 생각하지 말고
헤밍웨이의 글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불쑥 화가 나기도 한다.
진지한 헤밍웨이 어르신의 주옥같은 멜로디가
신문지 여백에 꾸질꾸질하게 써놓은 메모처럼 읽히기도 하니까.

어젯밤엔 김경주의 시를 읽었다.
사이, mp3로 <카메모 식당>을 봤다.
미도리상과 사치에상이 만드는 시나몬롤,
때로는 코 끝에서 진한 계피향이 풍긴다.
자주 보고, 듣고 있지만 볼 때마다 참 좋은 영화다.
외롭다고 느끼는 것은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 음악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 비정성시 >
한 줄 때문이었다.
목소리가 멋진 시인. 얼음빙수를 갈아 뿌린 눈, 같은 목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