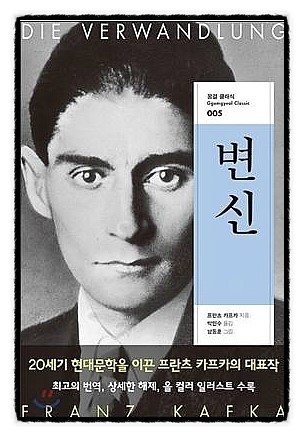
‘변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현재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있어 그레고르의 변신은 충격 그 자체의 것일 수 밖에 없었다. 사람에서 곤충으로 변신이라니. 그의 갑작스런 변신에 무언가 전조 현상이라도 있었더라면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 조금이나마 가벼웠겠지만 가벼운 감기를 앓는 것처럼 너무 쉽게 다가온 그의 갑작스런 변화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기에는 무겁게만 다가왔다. 그레고르는 머뭇거리는 사람을 어떻게든 들어오게 하려고, 혹은 적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거실을 통하는 문 옆에 바짝 다가섰다. 하지만 문이 더는 열리지 않았기에 그의 기다림도 허사로 끝났다. 아침에 문이 잠겨 있을 때는 모두 그렇게 들어오려고 성화더니, 이제는 자기가 한쪽 문을 열어 놓았고 다른 문도 낮 동안 분명 열어 두었을 텐데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는 열쇠도 바깥에서 꽂혀 있었다. –본문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위해 일어난 그레고르가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들이 알게 되었을 때, 초반에는 갑자기 변한 그의 모습에 대해 당혹감과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가족들에게 있어 그레고르는 인간 그레고르가 아닌 곤충 그레고르로만 남게 된다. 서로의 소통 따윈 없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은 점차 서로의 모습을 외면하며 그들만의 세계에 자리하고 있고 경제적인 부담만을 더하는 그레고르는 결국 그들 사이에 필요치 않은, 사라져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자아, 이제 하느님께 감사드려야겠구나.” 잠자 씨가 말했다. 잠자 씨가 성호를 긋자 세 여자도 그가 하는 대로 따라했다. 그레테가 시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다. “좀 보세요. 얼마나 말랐는지. 벌써 오래전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음식은 들여 놓은 그대로 다시 나왔죠.” 실제로 그레고르의 몸통은 아주 납작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본문 <변신>이라는 작품이 장편인줄만 알았는데 이 안에는 다양한 단편 소설이 담겨 있다. 그다지 길이가 길지 않지만 읽고 나서는 계속 되뇌게 되는데 <법 안에서>의 한 남자는 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지기 곁에서 수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지만 결국 쓸쓸하게 죽음을 마주하게 된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채 말이다. 왠지 모르게 나의 일상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기에 처연해지는데 <팽이>를 넘어 <포세이돈> 역시도 짧지만 그 안의 이야기를 계속 곱씹어보게 한다. 전체서평보기 : http://blog.yes24.com/document/8058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