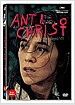이자벨 위페르에 대해 김혜리가 쓴 글을 봤다. 그녀의 얼굴 클로즈업만으로도 인물이 이해된다거나 자신이 맡은 역을 동정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는 이자벨 위페르의 얘기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식으로든 설명할 수 없는 경지를 상상하게 한다. 고현정의 맑은 얼굴빛을 볼 때면 ‘어떤 포즈’의 불편함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그게 어디가 그리 불편한지는 잘 모르겠는 답답함도 한몫. 나로선 영혼이나 기운 대신 ‘연기하는 방법’이라든가 뭔가에 대해 알려주는게 더 이해하기 쉽다. 이해하기 쉬운 방식은 종종 상투적이고 평이한 영화를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그 중간은 없을까.
안티 크라이스트의 첫 장을 보며 토막 난 대화 대신 라스 폰 트리에가 보여주는 영상, 영화에 푹 빠져들었다.
풀밭에 누워 숲에 녹아들어가라고 상상해보라는 주문에 따라 여자의 몸이 녹색으로 바뀌는 장면, 고속 카메라로 촬영한 첫 장면의 섬짓한 아름다움. 이동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창밖의 녹색컷. 남자가 보는 환상까지. 대사와 줄거리 위주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시선은 탐욕스럽다.
정신병은 각각의 문화가 지닌 문제현상과 치료법을 갖고 있다. 안티크라이스트의 등장인물은 아이를 잃은걸 자책하며 정신분석을 진행한다. 서양식 방법이다. 그런 방식이 무의미하다기보다는 무의식 속의 정신을 분석하고 최면을 유도하는게 왠지 얄팍하게 느껴진다. 확고함,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자신만만함은 때때로 ‘그 감정’을 느끼는 것조차 방해하고 분석하는건 아닐까.
화가 나는 이유를 자신에게 묻고, 성찰할 수 있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많지 않을까.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늘 불통이 되는건 분석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타협을 할 줄 몰라서는 아닐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다 본의 아니게 턴하고 돌아오는 사람의 흐름을 끊었다. 멈추면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 했는데 물 밖으로 나온 사람이 대뜸 ‘이건 뭐야’ 한다. 뻘쭘하게 있는데 옆에 있던 a가 출동, ‘이건 뭐야’에게 가서 수영하는걸 제지하고 따지려 든다. ‘이건 뭐야’는 아랑곳하지 않고 부지런히 수영만 한다. 보다 못해 a에게 그만두라고, 어쩌겠냐고 했더니, a는 잔뜩 화가 나서 뛰쳐나갔다. 남고생도 아닌데 말이다.
생활의 서사에서 영혼을 마주하기는 힘들다. 이자벨 위페르의 위대함, 독창성은 영화 속 스크린만을 주의 깊게 들여봐야만 하는 종류의 것이다. 무명배우의 연기였다면 어땠을까. 아우라 없는 배우가 기운이나 독특한 감각을 표현하는 연기를 한다면 어떨까. 이자벨 위페르의 A와 Z를 포함한 연기를 접해보진 못했지만 이자벨 위페르인줄 모르고 봤다면? 이런 생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몰랐는데 구조주의 입문서를 보니 좀 알 것 같다. 위대한 영화의 위대한 배우, ‘와’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정말 위대할까, 위대하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걸까. 그쪽 업계 사람의 입을 통한 말들의 홍수는 어떻게 봐야할까 등등.
취향은 이렇게 탄생하는걸까. 나는 줄곧 취향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니 나는 자신감도 없었다. 남들이 내 취향을 촌스럽다고 할까봐 미리 내 취향을 촌스럽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없었던거다.
일을 하면서 책을 읽는데 돌이켜보니 무슨 글을 읽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쓰기 시작했는데 역시 문맥이며 말뜻이 전달되지 않는다. 문장은 번역투다.
오늘 간식으로 라면을 같이 먹은 l이 나를 지긋이 바라보며 ‘며칠만에 보니 밉상이네’라고 말한 즉시 자신은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말을 했다. 그 순간, 살짝 흔들린 l의 눈동자를 보고 말았다. 두루뭉술한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l이 느껴졌다. 어쩌면 영화적인 순간은 말의 홍수가 아니라 관찰력과 무의식적인 어긋남에서 나오는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