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휴 간 추려놓은 위시리스트를 방출한다. 연휴에 오프라인 서점 몇 군데를 둘러보고 직접 실물로 넘겨본 책이 많아 금방 목록을 추릴 수 있었다. <지식의 미래>와 같은 책은 내 관심사에서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책인데 몇 군데를 읽어보고 나니 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꼭 읽어볼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았다. 개인적으로 '전문가의 영역이 파괴되다' 챕터를 가장 눈여겨 봤다. <세상의 붕괴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나와서 지나칠 뻔 했던 '철학자의 서재' 세 번째 책이다. 서평집 본연의 기능을 가장 잘 하는 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건축, 인문의 집을 짓다>는 작년에 나온 <경제학, 인문의 경계를 넘나들다>의 후속편이다. 인문과 건축의 오묘한 선을 넘나들며 아주 쉽게 풀어내고 있다.



<고대 희랍 로마의 분노론>은 양장으로 나왔다가 이번에 다시 반양장이 나왔다. 무거운 내용과 비싼 가격탓에 인기가 없었던 탓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여튼 양장보다는 저렴하게 반양장이 나왔다. 개인적으로 반양장이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천병희 옹께서 플라톤의 <고르기아스 프로타고라스>를 번역했다. 정암학당의 플라톤 전집도 계속되고 있겠지. <내 귀에 바벨 피시>도 모르고 지나칠 뻔한 책이다. 번역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데 꼭 내가 번역을 하지 않더라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많다. 재미있다.




카를 야스퍼스의 주저인 <정신병리학 총론>이 네 권으로 번역됐다. 찾아보니 워낙 방대한 저서에 내용도 비전공자가 읽기에는 부담스러울만하다. 그래도 욕심이 나는것은 어쩔 수 없는 지적허영일까.




은행나무에서는 마이크로 인문학 시리즈로 1차분 네 권을 냈다. <생각, 의식의 소음>, <죽음, 지속의 사라짐>, <선택, 선택의 재발견>, <효율성, 문명의 편견> 이렇게 네 권이다. 기획의 바탕에는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몇 권의 책을 펴내 소개 된 바 있는 연구소라 한 번 더 들여다 보게 된다.



이진경의 <맑스주의와 근대성>이 18년만에 개정돼 나왔다. 1997년에 초판이 나왔으니 생명력이 꽤 오래 지속된 책이라 할 수 있다. 그때는 이 책의 존재를 몰랐으니 그랬겠지만 존재를 안 지금은 굉장히 잘 짜여진 마르크스주의와 근대성을 연구한 책 같다. 유진 런의 <마르크시즘과 모더니즘>이 생각나기도 한다. <인문라이더를 위한 상상력 사전>은 쉽게 읽을 수 있는 인문교양서다. 인문개념어 140가지를 선정해 설명하는 책이다. 비슷한 책으로는 <인문학 개념정원>이나 남경태의 <개념어 사전>이 생각난다. <심리학에 속지마라>는 인간의 불안심리를 팔아 장사하는 심리학의 '이면'을 다룬 책이다. 역시 또 이런 책이 나는 마음에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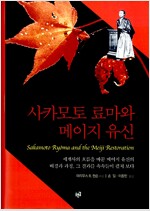
<50개의 키워드로 읽는 북유럽 이야기>는 '이케아' '바이킹' 등 단편적으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에 관한 얘기를 키워드 50개로 풀어낸다. <책과 혁명>은 로버트 단턴의 책인데 길에서 나온 책을 알마에서 다시 펴냈다. (물론 값은 조금올랐다.) 번역자는 같고 약간의 수정은 가한 듯.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은 일본근현대사 연구의 권위자인 마리우스 B. 잰슨의 책을 번역한 것이라고 한다. (처음 알게됨.) 사카모토 료마를 잘 몰라도 그냥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경제성장과 사회보장 사이에서>는 스웨덴 태생의 학자 옌뉘 안데르손이 쓴 북유럽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책이다. 물론 스웨덴에 대한 예를 가장 많이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적용가능한 모델이 무엇인지도 생각할 수 있게 해준다. <왜 정치는 우리를 배신하는가>는 지난 대선에서 문제가 많았던 선거제도의 모순을 파헤치고 과연 선거가 민의를 오롯이 대변하고 있는가에 물음표를 던진 책이다. 일독해야겠다.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는 알마의 이슈북 시리즈인데 말로만 접했던 국민참여재판의 허와실을 알 수 있을 듯 하다.



경제분야에선 광고의 아버지라 불리는 클로드 홉킨스의 <못 파는 광고는 쓰레기다>와 한국기업들을 분석한 <좋은기업 나쁜기업 이상한기업>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자도 풀지 못한 조직의 비밀>은 '조직경제학'의 한 분야로 나온 책인데 경제학전공이 아니라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솔로몬 노섭의 <노예12년>이 펭귄클래식판으로 나온다. 이미 다른 출판사에서 다른 번역자의 책이 나와있다. <세계아닌 세계>는 멕시코 작가 호르헤 볼피의 작품이고, <멀어지는 빛>은 콜롬비아 작가 토마스 곤살레스의 작품이다. 자주 접할 수 없는 나라의 작가들인만큼 희소성이 있는 작품이기에 추가해 둔다. 호르헤 볼피는 볼라뇨 해설서를 써 이미 소개 된 바 있다.



예술분야에는 그다지 끌리는 책이 없었다. <당신에게 뉴욕은 어떤 곳입니까>는 뉴욕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저자가 뉴욕에서 쓴 체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나는 클림트를 보면 베토벤이 들린다>는 피아니스트 권순훤이 쓴 그림과 음악의 콜라보레이션이다. 어울리는 그림과 음악을 한 데 엮어본다. <레너드 번스타인의 음악의 즐거움>은 "젊은 시절의 번스타인이 원고를 쓰고 방송을 진행한 [옴니버스] 시리즈의 방송 대본과 기고 글을 모아 펴낸 책"이라고 한다. 거장의 숨결을 느껴보자.



에세이 분야에서는 여성지 '마리끌레르'의 창간인인 마르셀 오클레르의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와 각 분야 덕후들의 얘기를 엮은 <마니아씨, 즐겁습니까?> 그리고 식물연구가이자 수필가인 오병훈씨가 쓴 <서울의 나무, 이야기를 새기다>가 주목 할 만 하다. 서울의 나무 이야기라.. 당연하게만 생각했던 서울의 나무들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