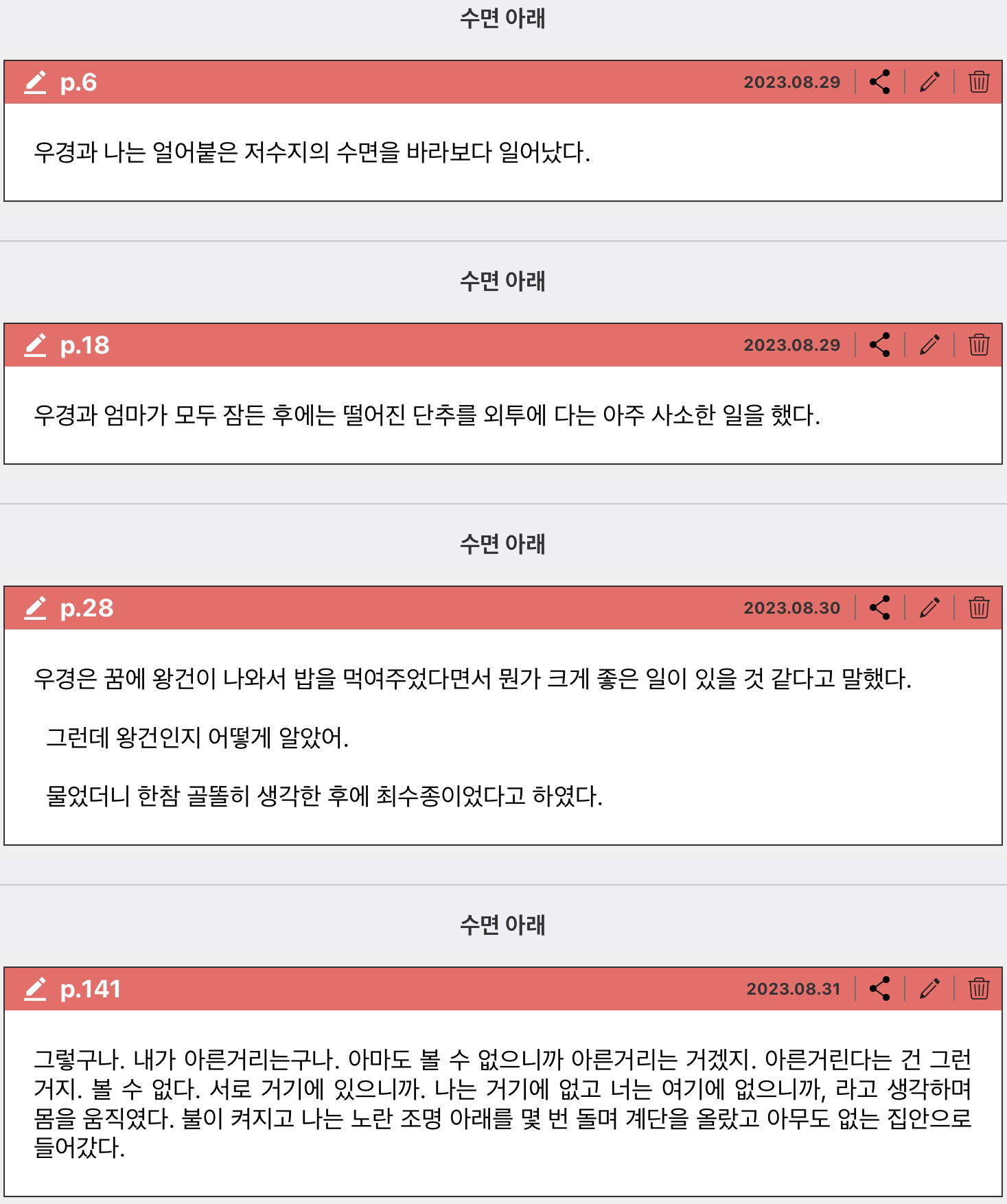-

-
[전자책] 수면 아래
이주란 지음 / 문학동네 / 2022년 8월
평점 :



-20230831 이주란.
이주란의 단편집 두 권을 보았고, 작년 수능 끝나고 이 책을 빌렸다가 못 보고 반납했다. 왠지 장편소설도 봐야 할 것 같은 의무감을 느끼다가 다시 빌려서 아, 별로 안 두껍잖아, 하고 읽었다.
대도시의 삶이 아닌 좀 작은 동네에 깨 털고 콩 털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다니고 뭘 먹는 모습이 나온다. 새삼스럽게 오...사람은 저렇게 뭘 먹고 아는 사람 만나고 일하다 어디도 갔다가 하면서 사는 거지… 했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고, 덤덤하게 덤덤한 이야기만 했다. 그렇다고 다들 인생 내내 평온하지는 않았고,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이 죄 있다. 어머니가, 아이가, 아버지가, 강아지가 죽었다. 가끔은 그걸 떠올리면서 슬픔에 잠기지만, 나머지 시간은 덤덤하게 산다. 옛날 이야기도 가끔하고. 진짜 뭘 많이 먹는다. 저렇게 집요하게 먹는 이야기를 자꾸만 쓰는 거 보면 먹는 거 좋아하나 봐 주란이는… 먹는 걸 안 좋아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다. 먹는 걸 읽는 일은 확실히 별로 안 좋아하긴 하다.
갈등과 불행과 재난과 그런걸 극복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게 서사 읽는 재미라고 여겨왔던 나한테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고 서로가 감사하고 많이 친하든 적당히 안면 익힌 정도이든 처음 보든 서로 돕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히려 그게 일상인데 이걸 읽는 게 더 판타지 같았다. 지나가다 패딩 걸치는 사람 옷소매 잡고 거들어주거나, 들른 사람에게 국수를 말아 먹이거나, 그 보답으로 제주에서 온 귤을 가져다 주고 또 계란말이를 얻어 먹거나, 앉았던 돗자리를 지나가는 다음 사람에게 넘겨주거나, 쓰던 물건들을 거둬 씻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오천원 더 깎아주고 파는 일들, 그런 작은 일들이 사람들이 생존하는 걸 돕고 덜 외롭게 하고 아픈 일도 견디고 계속 살아나가게 한다는 걸 새삼 느끼게 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이런 소설을 또 읽겠냐 하면 망설여진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아프게 살살 주물러주는 마사지를 받는 기분이어서. 그걸 이렇게 길게 받으라고 하면 잠이 오잖아...그러면서도 좀 시원해지는 순간이 오려나? 하고 끝까지 기다렸는데 끝내 살살 하다 끝나는 거야… 그럴 거면 왜 소설을 읽냐 스스로 마사지를 하지… 팔 안 아플 정도로 마냥마냥 살살… 재미없다. 자극 중독자라 미안… 빛만 받아도 쇼크로 죽을 것 같이 힘든데 뭐 읽기라도 해야겠네 하는 사람은 암죽 먹듯 읽으면 시간은 가겠다. 김연수보다 최은영보다 더 심하게 착한 소설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