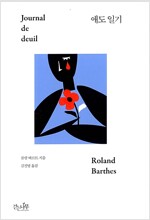육체
-나는 병들어서 죽어가는 내 어머니의 육체를 알고 있습니다.
롤랑 바르트의 『애도일기』(걷는나무, 2018)에 있는 구절이야. 이 구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라고 울컥해. ‘육체’라는 단어에 눈이 멈춰. 그 단어가 언제부터 내게 슬픔이 되었는지, 나의 애도는 아직 끝나지 않았는지... 아니면 원래 끝낼 수 없는 건지.
작고 말랑말랑하지만 폭발할 듯 울음을 터트리는 아기를 생각해. 크고 딱딱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학, 학, 숨을 내쉬는 것뿐인 노인을 생각해. 달라 보이는 이 두 육체가 실은 한 육체였다는 걸 쉽게 잊게 되지. 좀 더 가까이 가서 바라보면 그 육체가 다름 아닌 자신이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리고 언젠가는 육체가 시체가 되겠지. 시체가 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우리라고 여기지. 실종자 가족들이 시체가 된 육체를 찾겠다고 울부짖는 모습을 생각해 봐. 초탈한 사람처럼 육체를 껍데기라고 함부로 말할 순 없을 거야. 그렇지만 시체는 이미 우리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만 하지.
죽은 것들은 이미 죽은 것.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생각해도 내가 알았던 육체가 혹은 시체가 간혹 내 안을 어지러이 돌아다녀. 여긴 비 와. 서늘하고. 내가 알던 여름이 아니야. 내가 아는 것은 모두 과거에 있지. 지금은 이렇게 다른데. 내가 알았던 육체 혹은 시체는 이제 다 다른 존재가 되고 말았을 텐데.
그냥 ‘육체’라는 말이 목에 걸려서 잠시 빼내고 싶었어.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
_문태준
당신은 나조차 알아보지 못하네
요를 깔고 아주 가벼운 이불을 덮고 있네
한층의 재가 당신의 몸을 덮은 듯하네
눈도 입도 코도 가늘어지고 작아지고 낮아졌네
당신은 아무런 표정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네
서리가 빛에 차차 마르듯이 숨결이 마르고 있네
당신은 평범해지고 희미해지네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의 몸이 된 당신을 보네
오래 잊지 말자는 말은 못하겠네
당신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네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을 보네
-문태준, 『우리들의 마지막 얼굴』(창비, 2015), p.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