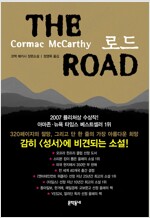
온 도시가 불길에 휩싸였다.
모든 것은 재가 되었고 바람과 햇볕마저도 잿빛이었다.
죽어서 누워있는 이들이 부럽다는, 사내라 불리는 아버지와 어린 아들은 늘 춥고, 배고프고, 무섭고.... 선과 악에 대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 묻고, 대답하는 것으로 부자간의 애정을 주고받는다.
세상이 사그러들 때, 종말의 시각이 ‘이런 모습일거다’라고 사내는 생각한다.
따라다니는, 준비된 죽음이 몸 안에 찾아들 때까지 살아내야하는 의미 없고, 이름 없는 날들을 길(ROAD) 위에서 헤맨다.
아주 드물게나마 인기척을 느끼긴 하나 서로가 적이어서 서로 몸을 숨겼고, 살아남은 자들끼리는 인육을 약탈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칼날같이 곤두세웠다.
죽음, 고요, 암흑, 공포, 널브러진 시체, 영혼 없는 영혼, 사라진 미래가 떠도는 길 위에서 행운의 여신에게 어린 아들을 맞기고, 사내는 각혈을 하며 익숙해진 죽음에 합류한다.
죽음의 광야에서조차 선과 인간에 대한 애정을 품으려 했던 어린 아들은 멸망한 대지 위의 맥을 이어나갈 선의 무리를 만나 죽음을 면한다.
한권의 소설을 읽으면서 기적 같은 만남의 3줄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인 따스한 장면이었다.
휴식때는 과학자들과 어울린다는 외로움, 어둠, 불신, 존재할 것 같지 않은 희망과 고뇌하는 은둔의 작가. 코멕 메카시는 70이 넘은 나이에 10살 된 아들을 호텔에 재워두고 산책하던 중 마을과 온 산이 화염에 휩싸이는 상상을 하며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하니 소설의 동기와 핵심은 ‘부성애’에 있는 것 같다.
생존자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과거의 파괴된 흔적과 고통스런 현실을 작가는 길 위의 아수라장이 된 상황으로 묘사하고 있다.
소설 속의 어린 아들이 꾸준히 질문하는 착한 사람의 존재 여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이 소설의 출발이 된 평화롭게 자고 잇는 아들의 모습과 그 아들이 성장하며 견뎌내야 하는 비인간적인 세상을 연상시킨다.
딸이 재미있다고 성대 도서관에서 빌려다 준 책, 어린 두 딸의 재롱을 늘어놓으며, 시아버지가 용돈을 주셨다는 흥겨움, 시아주버님이 준 고가의 그 무엇(난 이름도 모르는)을 자랑하며.... 그래도 내면엔 채워지지 않는 삶의 무거운 무게를 느꼈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