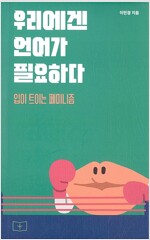내일 청소년 모임 강의 신청이 들어왔다. 2주 전에 들어왔지만 담당자의 미숙으로 어제서야 겨우 연락이 닿았다. 독서법에 대한 강의인데 한 시간만 해 달라는 것이다. 난처한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원래 신청한 분이 친한 분이라 거절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중.고등학생이란 다양한 층의 어린 학생들에게 독서법은 안 어울린다. 거절하고 싶은데 도무지 안 될 것 같다. 이런 경우 그날 학생들의 상태가 강의를 크게 좌우한다. 특성상 대학생이나 글과 책읽기를 갈망하는 직장인들에게 어울리는 강의인데 ㄱ가 무리하게 욕심이 낸듯하다. 어제가 되서야 겨우 출판사에 원고를 넘기고 오늘 아침부터 강의 준비 중이다. 한 시간 강의는 그냥 입으로 때워도 되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는 PPT를 준비해야 한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생각나는대로 적으려니 마음이 편치 않아 창고에서 두 권의 책을 꺼냈다. 알베르토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와 스티븐 로저 피셔의 <읽기의 역사>다. 애들러의 <독서법>도 두 권 모두 있지만 보지 않았다. 애들러의 책은 좀더 깊이있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거라. 개인적으로 망구엘의 책보다 스티븐 로저 피셔의 책이 훨씬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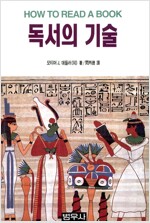
초반부에 들어갈 문자의 역사를 살펴가는 중에 재미난 사실 몇개를 발견했는데, 초기의 문자는 그림이었고, 점점 상징화 되면서 문자가 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어느 지역, 어느 문명을 막론하고 비슷했다. 심지어 이집트나 중국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 개령형 문자가 나오면서 이전 복잡하고 불편했던 문자들은 사장되는 현상까지 비슷했다. 곱트어는 이집트의 문자혁명이고, 중국 진시황 때 역시 문자개혁을 통해 개량형의 한자로 통일 시킨 것이다. 지금은 한자가 아닌 간자를 쓰고 있지 않는가. 결국 문자는 더욱 간소화되고 개량된다는 점이다.
한글 하나만 봐도 처음 세종대왕 반포시의 한글과 지금인 한글은 얼마나 다른가. 심지어 발음법까지 다르니 이전 한글은 읽기도 힘들 지경이다. 불과 몇 백년 사이에 말이다. 그러나 수만년을 이어 발전해온 문자들은 어쩌겠는가. 앞으로도 문자는 계속 발전할 것이고 변형될 것이 분명하다.






<언어의 민족적 특성에 대하여>란 신간이 보인다. 언어가 가지는 특성이 민족성까지 좌우하는 걸까? <우리에게 언어가 필요하다>는 언어를 통해 보는 페미니즘을 들어다 본다.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는 글쟁이가 소중히 여기는 언어들을 추려낸 것들이다.
언어는 역사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온도가 있고, 성격까지 만들어 낸다. 단지 문자와 언어일뿐인데 말이다. 자꾸 사고 싶은 책만 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