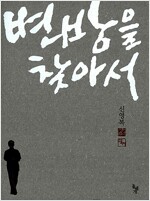이 책은 무릎꿇고 읽어야 합니다.
얼마전 북토크에 참가한 적이 있다. 자신의 쓴 책을 소개하며 청중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었다. 그렇게 2시간 반이 훌쩍 지나갔다. 그분에게나 그분의 책에대해서는 그닥 호감이 가지 않았다. 잘 쓴 책 같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분이 자신의 독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책은 무끓고 읽었습니다.'고 고백한 책 한 권이 귀에 쏘~옥 들어왔다. 그 책은 나도 10여년 전에 사서 읽었고, 종종 꺼내 읽는 책이었기 때문에 더욱 귀에 박혔다. 신영복교수의 옥중서간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그 주인공이다.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와 당장 책꼿이에서 그 책을 꺼내 들도 다시 읽어 보았다. 과연 놀라운 책이었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책 내용에 있지 않았다. 20대에 쓴 책이라는 사실에 더욱 놀랐다. 신영복교수는 1941년 경남 밀양에서 출생했다. 1963년 서울대에 입학하여 졸업후 바로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후 숙명여대 강사로 활동하다 66-68년까지 육군사관학교 경제학과 교관으로 교수생활을 했다. 그러나 그는 68년 일어난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무기징형을 선고 받는다. 무려 20년 20일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썩게(?)된다. 이 책은 그가 감옥에서 쓴 사색과 편지들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27세 때이다. 물론 그 후로 나이가 들어가지만 말이다. 아직 풋내가 벗겨지지 않는 젊은 나이에 그는 옥중에서 마흔이 넘은 필자도 따라가기 힘든 글을 지어낸 것이다. 처음 이 책을 접했을 때는 그분의 명성에 눌려 그 때의 나이를 계산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문득 신영복 교수의 나이를 계산하면서 놀란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되뇌였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런 축축한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기 때문에 나는 어서 기온이 싸늘히 내려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방안 가득히 반짝이는 그 총명한 빙광을, 그 넓은 성좌를 보고 싶다. 그 번뜩이는 빛 속에서 예지의 날을 세우고 싶다. 21
더 많은 사람, 더 고된 생활은 마치 더 넓은 토지에 더 깊은 뿌리로 서 있는 침통한 슬픔에 함몰되어 있더라도, 참으로 신비로운 것은 그처럼 침통한 슬픔이 지극히 사소한 기쁨에 의하여 위로된다는 사실이다. 47
둘째는 아버님이 보내주신 편지의 대부분은 '집안 걱정 말고 몸조심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 저는 아버님으로부터 좀 다른 내용의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 예하면 근간에 읽으신 서문에 관한 소견이라든가 최근에 격으신 생활 주변의 이야기라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염려의 편지'가 '대화의 편지'로 바뀌어진다면 저는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아버님의 편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3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다. 가슴을 저며오는 아픔과 고독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실존적 관점에서 승화하려는 몸부림이 느껴진다. 문장을 보면 가볍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무게가 담겨져 있다. 정말이지 이분의 책을 읽는 순간, 감동과 부러움이 교차한다. 문장의 중후함만이 전부가 아니다. 문장에서 인지되는 성찰의 고백은 더욱 진지하게 만들어 준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결코 많은 책을 읽으려 하지 않습니다. 일체의 실천이 배제된 조건하에서는 책을 읽는 시간보다 차라리 책을 덮고 읽는 바를 되새기듯 생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지식을 넓히기보다는 생각을 높이려 함은 사침하여야 사무사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85
몸으로 지식을 체득하고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려하는 신교수의 성찰적 고뇌가 보인다. 빨리 읽고, 많이 읽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가려는 피상적인 현대인들에게 주는 경종이다. 몸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결코 진정한 배움이 될 수 없다는 신교수의 주장에는 삶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담겨 있다.
오늘 문득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살며시 무끓을 꿇어 본다.
그냥 내 생각이지만, 난 신영복 교수의 모든 책은 읽고 소장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