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렸던 마지막 한 권이 도착했다.
노용무가 쓴 <시로 보는 함민복 읽기>로 함민복 평론집이라할 수 있겠다. 저자 자신은 자신글에 오점투성이 많을 테니 미안하다는 말을 연신한다. 하지만 그건 겸손탓이겠고, 나머지는 독자에게 맡길 일이다. 하여튼 다섯 권 모두 도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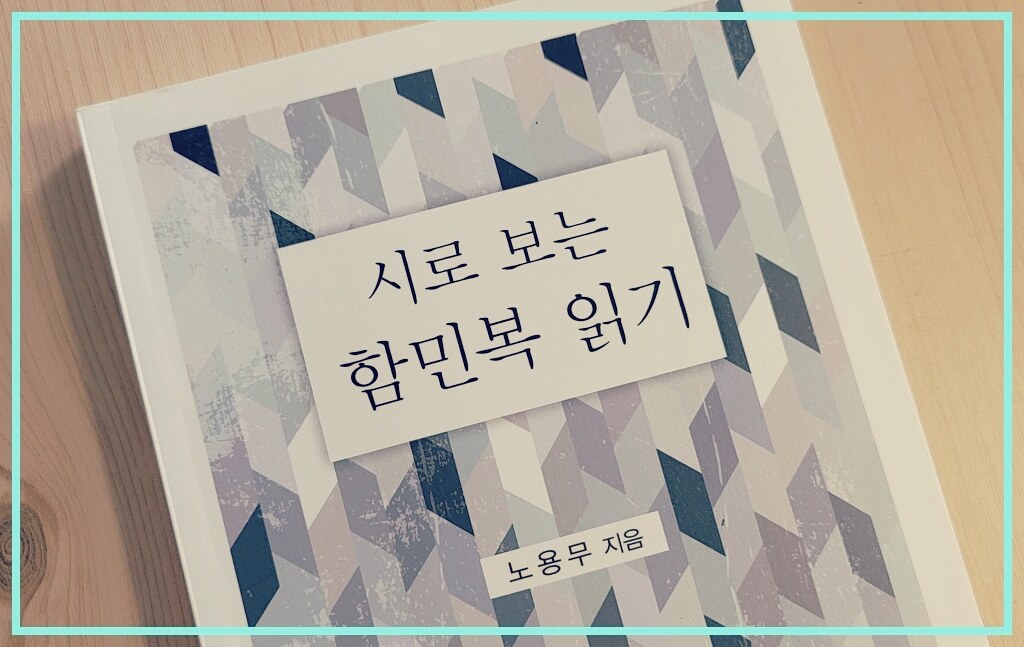
한 권은 평론집
한 권은 에세지
나머지 세 권은 시집이다.

난 시를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뇌 구조 때문인지 몰라도 시를 읽기가 너무 힘들다. 물론 비약은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 시는 온통 비약천지다. 도무지 이해하김 힘든 단어가 산만하게 흩어져 있다. 아내가 천재시인이라며 칭찬한 시를 읽고 당근 마켓에 빨리 팔아야 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이런 글을 어떻게 읽는다는 것인지? 기괴한 논리와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시는 논리 없는 잡글의 집합체요 산만하기 그지 없는 난삽한 단어 놀이 같았다. 하여튼 시가 싫다. 시가 싫다기 보다는 과도하게 상징언어로 이루어진 시는 힘들기가 보통 어려운게 아니다. 읽으면 술술 읽여야할 글을 머리 싸매며 읽기 싫은 것이라 해야 옳겠다.
그런데 왜 갑자기 시집을? 물론 이건 순전히 우연이다. 아니 운명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잠깐 함민복의 시를 읽을 터이지만 앞으로 다시 시집을 읽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함민복은 유독 나의 마음을 끈다. 시에 끌렸다기 보다는 그의 에세이 <섬이 쓰고 바다가 그려주다> 때문일지도 모른다.
물때는 이곳 사람들의 뭍 생활에도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우울씨의 일일>에 이런 글이 있다.
-방-
오늘을 살아내기 위하여
창신동의 좁고 긴 방
머리와 디리를 남북으로 갈라놓아야
누울 수 있는 방
잠을 뒤척였네
삶은 언제나 처철하다. 경험되지 않고는 적을 수 없는 글. 경험이 사실은 아니다. 사실이 진실도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아파하기에 공감하고, 공감하기에 위로가 되는 것이다. 시란 모름지기 경험과 사실 위에 실존을 엎는 것이리라.
<흔들린다>는 시는 시 한 편에 그림을 담았다. 그러니까 시한 편이1,100원인 셈이다. 물론 그림값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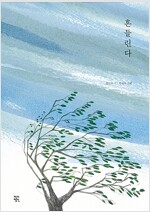
그림을 그린 한성옥은 시를 몇 번이나 읽었을까. 착 달라 붙는다. 어둡고 칙칙한 그림은 아픈 시어처럼 어둡다. 그래서 좋다.
유독 우울감이 심해 몇 달을 고생하고 있다. 나에게 내일이 있을까? 나도 모르게 묻는다. 대답할 이 없는 물음.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져 간다.
오늘 새벽 1시가 반이 되서야 집에 도착한 딸은 하루 종일 자더니 이제 일어나 여기저기 정리한다. 재미있는가 보다. 집에오면 늘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