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능주의자 ㅣ 문학동네 시인선 167
나희덕 지음 / 문학동네 / 2021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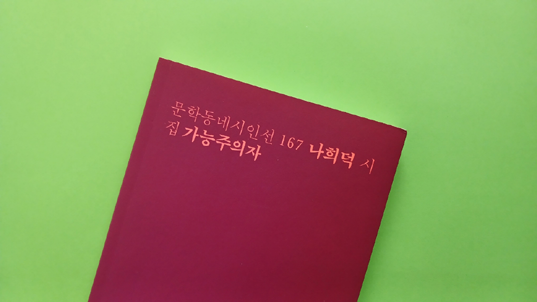
예전에 나희덕 시인 시집을 만나기는 했는데, 시가 어려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도 시집을 여러 권 봤다니 신기하구나. 분명하게 본 건 《사라진 손바닥》과 《어두워진다는 것》이다. 《뿌리에게》 《그 말이 잎을 물들였다》 《그곳이 멀지 않다》는 봤는지 안 봤는지 잘 모르겠다. 제목이 익숙한데. 어쩌면 다른 데서 시집 제목만 본 걸지도. 이밖에 다른 시집도 있다. 지금도 시 잘 모르기는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더 모르고 봤다. 그저 느낌으로 본 것 같다. 이건 지금도 다르지 않던가. 예전 내가 더 나았을지도. 시를 말하지 못해도 그냥 봤으니까. 지금은 시집 보기 전에 망설인다. 내가 알 만한 시가 담겼을지 걱정이 돼서. 시는 잘 모르고 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 시집 《가능주의자》에 실린 시도 쉽지 않다. 다행하게도 알아들은 것도 많다. 그게 쉽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나도 아는 게 조금 있어설지도 모르겠다. 개인의 일뿐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역사도 담겼다. 톨스토이나 소크라테스도 나오는구나. 한국 사람은 김수영, 정약용. 버지니아 울프와 레너드 울프가 살던 곳과 브론테 자매가 살던 곳에도 가 본 적 있는 듯하다. 지금 아주 사라진 건 아니지만 몇 해 동안 세계 사람을 힘들게 한 코로나19 이야기도 있다. 전쟁도. 이 시집은 2021년 12월에 나왔다. 코로나 일을 시로 썼구나. 코로나를 소설에 쓴 작가도 많겠다. 광주 5·18 <묻다>, 제주 4·3 <이덕구 산전>과 2009년 용산에서 일어난 일 <너무 늦게 죽은 사람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어떤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한해가 가고 다시 그날이 오면 죽은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일도 있을 거다. 나희덕 시인이 그걸 시로 써서 잊히지 않겠다. 이 시집이 널리 많이 읽혀야 할 텐데.
무슨 냄새일까
무언가 덜 익은 냄새와 물러터진 과육의 냄새
햇빛이 잘 들지 않는 방에서 나는 냄새
다른 세계에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는 냄새
어제의 피로와 오늘의 불안이 공기 속에서 몸을 섞는 냄새
책상에 머리를 묻고 있는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한다
묵은 종이처럼 자신에게
습기와 곰팡내가 스며 있다는 것을
길고 좁은 방 옆에는
똑같은 크기의 길고 좁은 방들이 있지만
옆방 사람과 마주친 적은 없다
기침 소리나 의자 끌리는 소리로 기척을 느낄 뿐
이 방에 머물렀다 떠난 사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페인트칠로 덮인 못자국들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길고 좁은 방은
표정을 지우고 서서히 사라지기에 좋은 구조다
먼지가 쌓여가는 책들과
바닥 위에 조금씩 늘어나는 얼룩들,
단단한 바닥재는
늪의 수면처럼 어룽거리는 무늬를 지녔다
각자의 흔들림을 감수하며
사람들은 늪에서 굳이 빠져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러나 흔들림에 쉽게 익숙해지면 안 된다
흰 벽 위에
대여섯 개의 못을 박으려 한다
그림을 걸고 달력을 걸고 수건을 걸고 얼굴을 걸고 마음을 걸고
뭐라도 걸어야 뿌리내릴 수 있다는 듯이
매일 메일로 전송되는 공문들,
출력물이 길고 좁은 방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고
공기청정기는 쉴새없이 돌아간다
제가 빨아들이는 먼지와 냄새의 정체는 알지 못한 채
이따금 깜박거리며 위험 신호를 보낸다
삶은 조금씩 얇아져가지만
그렇다고 쉽게 사라질 것 같지는 않다
이 방에서 익혀가야 할 것은
사라짐의 기술
밖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길고 좁은 방>, 38쪽~40쪽
이 건 어떤 사건을 보고 쓴 걸까. 난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다. 제목에서 말하는 ‘길고 좁은 방’은 고시원이 아닐까 싶은데. 고시원에서 사는 삶. 청소를 하는 사람 이야기도 담겼다. 그 시는 <유령들처럼>이다. 세상엔 가난한 사람도 많지. 그런 사람은 잘 보이지 않는다. 위화 소설 《허삼과 매혈기》에 피를 파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건 지금도 있는 일인가 보다. 실험 같은 걸로 피를 빼는 것 같다. 그건 누구한테서 들은 걸까. 장기수 이야기 <선 위에 선>도 기억에 남는다.
하나씩 사라졌다
정수기가 사라졌다
전기 콘센트가 사라졌다
벽에 걸린 티브이가 사라졌다
보이지 않게 소리도 없이 사라졌다
방역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무엇이든
자정 넘으면
쉼터도 문을 닫고
방문자센터도 폐쇄되고
공공화장실도 잠겨 있고
급식소도 당분간 열리지 않는다
역에서 잘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천막을 칠 수 있는 곳을 찾아냈다
날이 추워지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
여자들은 천막도 칠 수 없다
한밤중에 누가 덮칠지 알 수 없기에
그나마 여자화장실이 안전하다
똥 묻은 휴지가 넘쳐나고
오줌 섞인 물이 바닥에 흥건해도 어쩔 수 없지만
길에서 자는 사람들이 실제로
바이러스의 숙주가 된 적은 많지 않다
도시의 섬처럼 각자 떠다니니까
그런데도 왜 하나씩 사라지는 것일까
우리를 사라지게 하려고?
멸종저항운동이라도 벌여야 할까?
그들이 사라지게 하고 싶은 것은
정수기나 전기 콘센트나 티브이가 아니라
거기 줄을 대고 있는 존재들,
가장 확실한 시각의 방역을 위해 사라져야 할 존재들
사라지는 것들은
어느새 사라진 것들이 되었다
-<사라지는 것들>, 72쪽~73쪽
코로나 뒤로 많은 게 바뀌었다. 정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걸 없앤 곳도 있었나 보다. 커피는 마시기 어려워졌다. 지금도 여전히 커피 마시지 못하는 곳이 있고 이제는 마시게 해준 곳도 있다. 약국 말이다. 약국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하다니. 자주는 아니고 한달에 한번 정도다.
지난 2019년에 나타나고 2020년에 세계로 퍼지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바이러스 코로나19. 그건 사람이 지구를 내버려두지 않아서겠지. 여기엔 기후 위기를 말하는 시도 담겼다. 빙하가 녹아서 빙하 장례식을 치르기도 했나 보다. 지금도 빙하는 녹고 있겠다. 북극에 사는 이누이트 이야기도 있구나. 나희덕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뿐 아니라 세계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시로 썼다. 여러 가지 일에 관심을 가져서겠다. 그건 사람 이야기다. 소설에만 사람 이야기가 담기는 건 아니다.
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