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9 제10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박상영 외 지음 / 문학동네 / 2019년 4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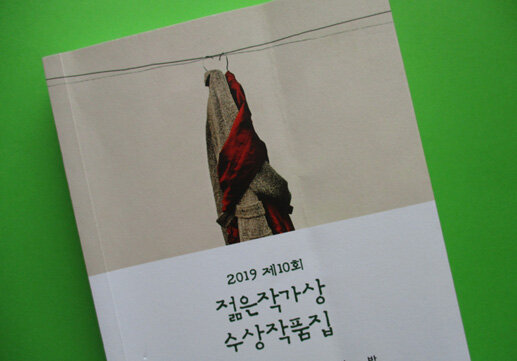
문학동네에서 만든 젊은작가상이 벌써 열번째를 맞았어. 난 여섯번째부터 봤는데 다섯번째에 상 받은 소설을 보니 한편 빼고 다 봤더군. 그렇다는 건 내가 그동안 한국소설을 조금 봤다는 게 되겠지. 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소설 한동안 안 보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이 말 전에도 했군), 여전히 잘 모르겠어. 시도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다는 말 안 써야지 했는데 또 썼군. 실험하는 소설을 빼고는 어떤 이야긴지 대충 알기는 해. 내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건 소설가가 하려는 말이야. 소설가가 하려는 말을 잘 짚어내면 좋겠지만 꼭 그게 아니어도 괜찮을 거야. 소설을 볼 때는 ‘뭐지’ 해도 이렇게 쓰면서 소설을 생각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기도 해. 읽으면서 조금 생각하고 쓰면서 조금 생각하는 거 괜찮겠지. 잘 하지 못해도 내가 책을 읽고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낫다고 믿고 싶은가 봐.
시간이 흐르고 세상이 조금 바뀌면 소설도 달라지겠지. 바뀌지 않는 건 ‘사랑’일까. 사랑은 언제나 사람한테 중요한 주제지.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여기 실린 소설을 보다보니 끝나버린 사랑을 말하는구나 싶기도 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 편이 그랬어. 여자와 남자 사이뿐 아니라 남자와 남자, 친구, 두 사람과 한 사람, 부모와 자식. 예전과 다르게 이젠 소설에 동성애가 나오기도 해. 아니 예전에도 있었을까. 예전에는 바로 드러내지 않았을 것 같아.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니 동성을 좋아한다고 그걸 잘못이라 말할 수는 없지.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안 사람도 자신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생각에 빠지기도 할 거야. 세상은 남자와 여자가 좋아해야 한다고 말하니 말이야.
이번에 대상을 받은 박상영 소설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는 동성애를 다뤘어. 김봉곤 소설 <데이 포 나이트>에서도. 이런 것을 먼저 말하다니. 꼭 그것만 말한 건 아닌데. 박상영 소설에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쳤다고 여긴 엄마도 나와. 이건 ‘나’가 고등학생일 때 그랬어. ‘나’는 자신보다 열두살 많은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게 됐는데, 그 사람은 운동권 마지막 세대로 자기 자신이 동생애자인 데 죄책감을 느끼는 듯했어. 내가 볼 때는 그랬는데. ‘나’와 형은 서로가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서로를 그저 선배와 후배로 소개해. 남한테 그렇게 말한다 해도 두 사람 마음이 괜찮다면 낫겠지만 형은 좀 달랐어. 그리고 둘은 헤어져. 첫번째 소설을 보면서 소설을 쓰는 건 상처받았다고 여기는 쪽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어. 이 소설만 그런 건 아니기도 해.
동성애가 나오기는 해도 김봉곤 소설은 또 달라. 그건 별로 좋지 않은 일이었어. 사랑이 아닌데 사랑이다 믿었다고 할까. 이런 건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낮을 밤으로 바꾸는 영화 기법 ‘데이 포 나이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 밝은 곳에서 보면 폭력인데 어두운 곳에서 보면 사랑 같은. 어둠은 모든 걸 제대로 못 보게 하기도 하지. 다행한 일은 그건 지나간 일이라는 거야. 그렇다 해도 어느 날 그걸 생각할 수도 있겠지. <우럭 한 점 우주의 맛>에서 ‘나’는 엄마나 자신이 좋아한 형한테 사과받고 싶다고 해. 어쩐지 그건 어려울 듯해. 엄마한테 남은 삶이 얼마 안 된다 해도. 기독교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기도 해. 정말 종교에서는 동성애를 죄라고 여길까. 모든 종교가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르겠군. 오래전 고대 그리스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던데. 동성애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본래 있었던 건 아닐까 싶기도 해.
두번째 소설 <공의 기원>(김희선)은 역사와 거짓을 섞은 듯해. 한때는 아이한테도 일을 시키기도 했는데 이제는 값싼 일손이 아닌 기계가 일을 대신하는 모습이 보여. 공 이야기도 나와. 공을 만드는 이야기랄까. 영국 사람과 조선 사람. 얼마전에 문학과지성사에서 나온 《소설 보다 : 겨울 2018》을 보다가 여기 실린 소설 다른 데는 없겠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젊은작가상 받은 소설에 백수린이 쓴 <시간의 궤적>이 있지 뭐야. 예전에는 젊은작가상에서 본 소설을 한 작가 소설집에서 만났는데. 언젠가 이 소설이 들어간 백수린 소설집을 만나게 될지. 서른이 넘고 서른 중반이었던 ‘나’와 언니는 새로운 삶을 찾아 프랑스로 갔어. 같은 어학원에서 두 사람은 만나고 친해졌는데, ‘나’는 프랑스 사람과 결혼하고 언니는 한국으로 돌아가서 사이가 멀어져. 친했는데 그렇게 멀어지기도 하는군. 한 사람은 프랑스에 남고 한 사람은 한국으로 떠난다 해도 사이를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나’는 자신이 실패했다 여긴 걸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
이주란 소설 <넌 쉽게 말했지만>에서 ‘나’가 말하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건 어떤 건지. 바쁘게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건가. ‘나’는 서울에 살다가 고향 엄마 집으로 돌아와. ‘나’는 뭐든 천천히 열심히 한다고 해. 난 이 말 보면서 천천히 하는 건 괜찮지만 ‘열심히’는 빼도 되지 않을까 했어. ‘나’가 예전에는 바쁘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 ‘나’가 말하는 천천히 열심히는 일상을 소중하게 여기고 별거 아닌 일도 집중하겠다는 것일지도. 정영수 소설 <우리들>은 제목처럼 우리들 이야기야. 한 사람이 한번에 두 사람을 좋아하는. 그러면서 ‘나’는 예전에 헤어진 연경 이야기를 쓰려고 해. 헤어졌다기보다 ‘나’가 그렇게 만들었군. 연경한테는 ‘나’가 잘못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서로 가정이 있는 두 사람 정은과 현수는 ‘나’를 떠난 듯해. ‘나’만 남은 건가. 정은과 현수 사이는 언젠가 그렇게 됐겠지. ‘나’가 두 사람 사이를 받아들인다 해도.
앞에서 동성애자인 아들을 엄마가 받아들이지 못했다고 했잖아. 이미상 소설 <하긴>에서도 부모(아빠가 더)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김보미나래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보미나래가 어떤 아이인지 잘 모르겠어. 아빠인 ‘나’는 보미나래가 공부를 잘 못하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지능이 높으면 공부를 잘하기는 하겠지만, 지능과 공부가 비례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 난 ‘나’가 보미나래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닌 다른 걸 본다면 좋을 텐데 했어. ‘나’는 다른 사람 아이를 부러워 해. 공부 잘하고 부모한테 반항하는. ‘나’는 아이를 자기 뜻대로 기르지 않겠다고 생각했으면서 보미나래를 대학에 넣으려고 미국에 보내기도 해. 부모가 되면 그렇게 자식한테 기대할까. 자식은 늘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 보미나래도 그랬어. 보미나래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고 싶기도 해.
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