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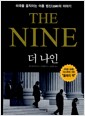
-
더 나인 - 미국을 움직이는 아홉 법신(法神)의 이야기
제프리 투빈 지음, 강건우 옮김, 안경환 감수 / 라이프맵 / 2010년 3월
평점 : 
절판

1970년대 중반이후부터 현재까지의 미 연방 대법원을 해부한 책이다. 보수주의와 진보주의로 대별되는 대법원 판사들의 면면들과 그들의 이념 대립, 그리고 그들의 판결이 불러온 파장들을 이해하기 쉽게 서술한 것이 특징. 연방 대법원은 미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가진 기관이다. 더군다나 그들의 힘이 판결이라는 논리와 이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존경과 지지를 받게 된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모든 것이 이성적으로 돌아갈 것 같은 곳에서도 비이성적인 것들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판사 역시 인간이고, 인간이란 자신의 한계에서 벗어나기 힘든 존재이니 말이다.
이 책을 보면서 비교적 독립적이라는 연방 대법원이 요즘엔 대통령의 입김에 많이 좌지우지 하게 된다는걸 알고는 조금 실망했다.--이럴때 보면 난 아직도 순진하다.--법에 의한 판결이라고는 하나, 법이라는게 귀에 걸며 귀걸이, 목에 걸면 목걸이 식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게 당연하니 말이다. 공정하고 공평한 법 해석이 아니라, 자신의 당파와 이념에 의해 결론을 만들어 내는 판사들을 보면서 , 미국이 이러할진대 우리는...이라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아직까진 보수와 진보 진영이 4:4로 1명의 중도파에 의해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는다고 하던데, 과연 그 대립이 깨져 보수 진영이 대법원을 장악한다면 미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게 될지 섬뜩하기만 했다.
길게 써도 되는 책이나, 그럴 생각이 나지 않는 관계로 줄여 본다면...
그간 관심이 가던 판사들에 대해 한꺼번에 알수 있어 좋았는데, 그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판사를 들라면 수터와 오코너 판사였다. 그들의 매력은 오래도록 인상에 남을 듯...
반대 의미에서 인상적이었던 판사는 당연히 토마스판사. 임명때 그렇게 요란하게 등장하더니, 지금도 역시 그다지 좋은 판결을 내놓고 있지는 못한 듯해 마음이 안 좋았다. 언젠가 시사 주간지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 기억이 난다. 토마스 대법관은 자신이 백인인줄 아는 흑인이라고. 동감한다. 자신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업는 판결만 속속들이 하는 보수권력의 개. 사생활적인 면에서는 친근한 분이라고 하나, 대법관으로써, 과연 그의 판결이 미래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안 봐도 뻔하다. 참, 대대로 욕을 먹을 짓을 꾸준히 해대는 그대는 고집불통쟁이 우후훗~~~~! 어쩜 연방 대법원 판사의 최대 자질은 세상에 대한 유연한 사고여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그를 보면서 했다.
연방 대법원의 속내가 궁금하신 분들은 보셔도 좋을 듯. 칭찬 일색의 미화가 아닌, 있는 그대로 서술하려는 작가의 통찰력과 대범함이 읽는 재미를 더하고 있었다. 다만 간간히 번역이 그다지 매끄럽지 않다는 인상이었고, 법 전공자가 아니라면 다소 지루할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