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동 피아노 ㅣ 소설Q
천희란 지음 / 창비 / 2019년 12월
평점 :



자동 피아노, 죽음과 삶에 대한 환상적 딜레마를 독백하다

길잡이이자 이정표이며 차라리 그 길 자체인 죽음에 대하여, 너는 기적 같았지

죽음, 그렇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
여기에서는 하나의 길에 집중해 걷기 시작하면
곧 길을 잃어버린다.
모든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고,
모든 생각이 동시에 나타났다 사라지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중략)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여기에서는 자꾸만 길을 잃는다.
길을 따라가면 길이 지워지기 때문이다.
그래. 죽음, 죽음이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불가능한 상태로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
(중략)
오직 죽음만이
내가 말하지 않은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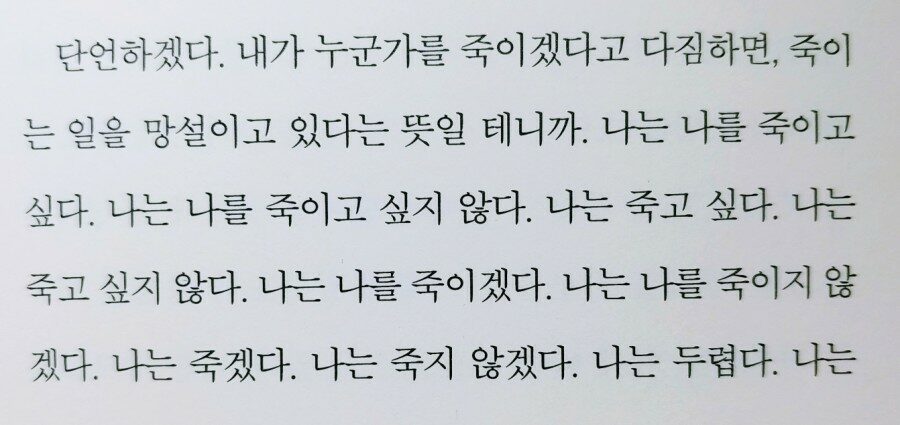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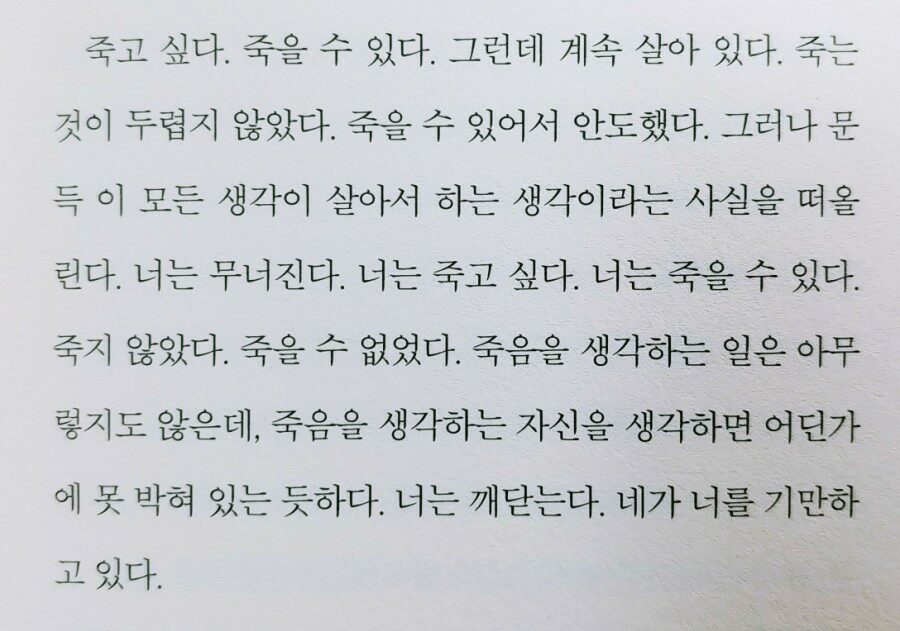
시작부터 내면의 혼란을 고스란히 드러낸 나는
죽음을 마치 예찬이라도 하듯 굴더니
갑작스레 죽일 수 있는 대상을 자신으로 한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 아니기에 대상을 다시 너로, 그녀로 바꾸고
허구였다가 허구가 아니기에 찢어도 좋은 대상으로
끝내 다시 너를 향하고는 이내 누군가로 바꾼다.
마치 결론 없는 꿈을 꾸듯,
어쩌면 어렸을 적 꿈속에서 첩보원이 되어 사람들을 지켜보았듯
이 혼란은 끊임없이 재생되고 반복된다.
마치 자동 피아노로 계속해서 연주되고 변주되고 끝이었다가 금방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나는 진실을 말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진실을 말할 수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진실은 깜빡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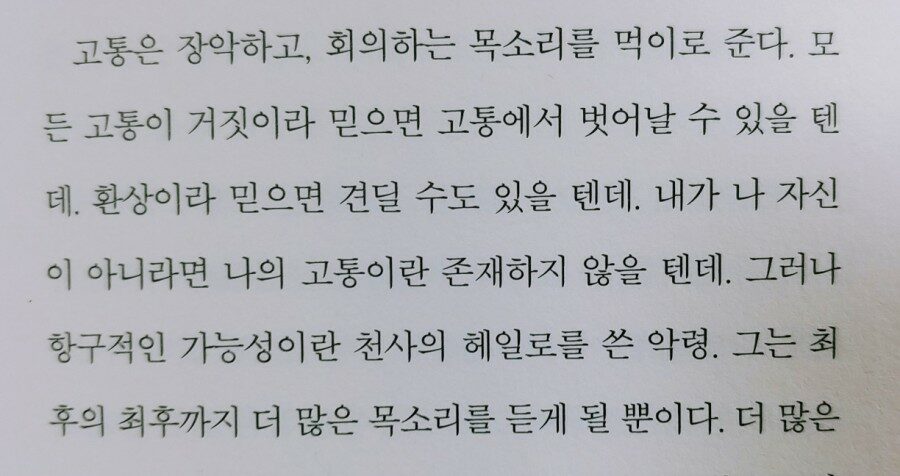
나의 고민은 답이 없다.
그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풀어내야 하듯 끊임없이 방식을 바꿀 뿐이다.
이것은 치열한 싸움이다.
승부를 가릴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과의 싸움이기에.
아, 이 고통은 아마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이기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너는 나를 없애기 위해 여전히 기회를 엿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말 고통 같은 연주는, 아니 연주를 빙자한 고통은 끝나지 않을까?
내가 나를 너라고 부르며 죽이고 나면,
죽은 나는 죽어서 다시 사랑을 가르친다.
나는 묻는다
"연주가 끝난 건가요?"
너는 대답한다.
"지금 달리는 중입니다."
소설은 끝났지만, 그래서 자동 피아노는 연주를 멈추었지만
죽음과 고통에 대한 작가의 갈망은 여전히 선율로 흐르고 있다.
그리고 작가는 '당신이 살아 있기를 바란다'.
스물한 곡의 음악에 죽음을 반주 삼아 노래하고 적고 찢은 이야기,
그래서 소설책 한 권을 통째로 베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소설 Q 시리즈 천희란의 "자동 피아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