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디디의 우산 - 황정은 연작소설
황정은 지음 / 창비 / 2019년 1월
평점 :



디디의 우산, 그게 언제 필요할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은 왜 함께 오지 않았나."
이 질문 아닌 질문은 왜 단편의 끝에야 나왔을까?
끝내 간직하고 싶어서였을까, 버리지 못해서였을까.
답은 d만이 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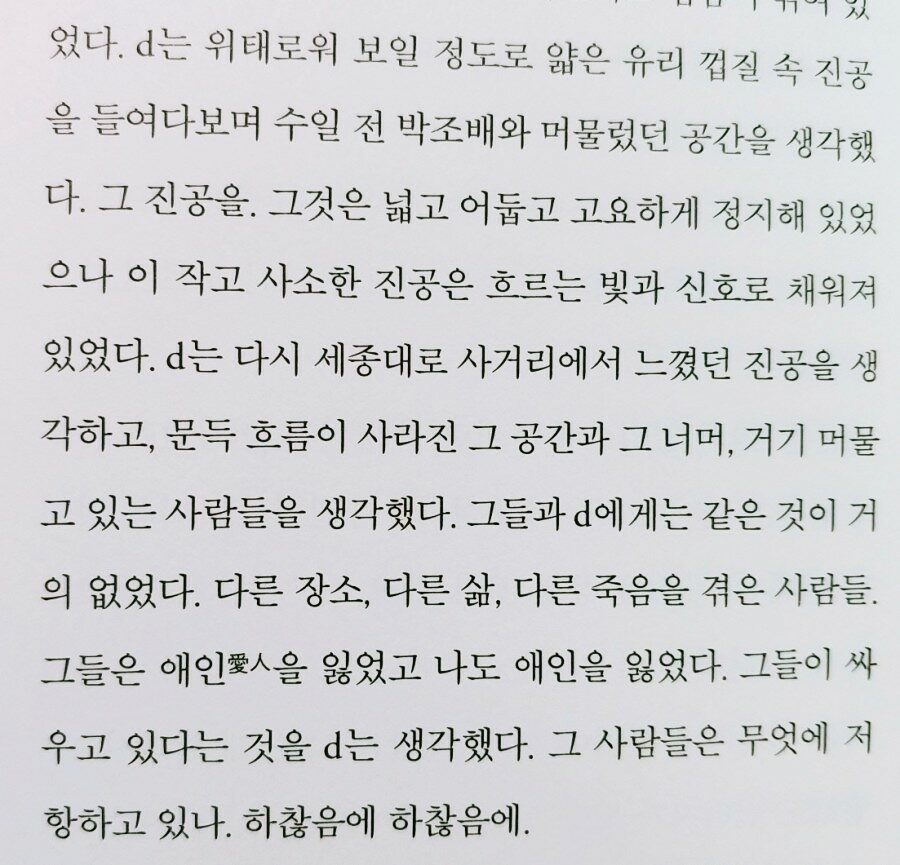
dd의 죽음 이후 자신 또한 죽음과도 같은 날들을 보내던 d는
이제 청계천 세운상가에서 고된 노동을 성실히 해낸다.
세운상가에서 수십 년간 음향기기 수리를 해온 여소녀.
그는 d를 아주 조금씩 다시 세상 속으로 발을 딛게 한다.
그 와중에 여소녀 역시 근대화의 영욕이 담긴 상가의 풍경 속에서
자신과 주변의 삶을 돌아본다.
dd의 물건을 모두 돌려보내는 행위로 세상과 단절하고자 했던 d는
그것들을 되찾아옴으로써 사회 복귀를 알린다.
여소녀의 사무실 구석에서 앰프를 연결해 음악을 들음으로써
여소녀의 의도에 맞게, 침잠하기를 끝내고 싶었던 자신의 무의식에 동조해
서서히 수면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비로소 혁명을 본다.
혁명
d는 dd의 유품 중 혁명이라는 제목이 적힌 책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려 종로에 나갔다가
광장의 목소리와 그 반대편의 차벽을 마주한다.
넓고 어둡고 고요하게 정지했던 그 혁명의 밤에
d는 자신도 모르게 감지했던 그 열기를
여소녀의 오디오 속 진공관에서 발견하고는 쓰라려한다.
이 혁명은 어디로 흐르는 걸까?
지금도 그들에게 디디의 우산이 필요할까?

다시 시작되는 단편은 접어둔다.
세월호를 비롯한 각종 사회적 문제를 지켜보는 눈길,
그 안에서는 누가 우산을 펼쳐줄까!
모두가 돌아갈 무렵엔 우산이 필요하다.
답답하기 그지없는 생활을 이어가는 d,
그의 멱살이라도 잡아 끌어올리고 싶던 그 순간을
깨끗이 지워낸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에... 그렇다고 믿기에... 그렇기에...